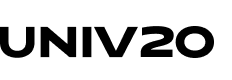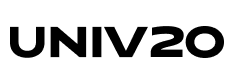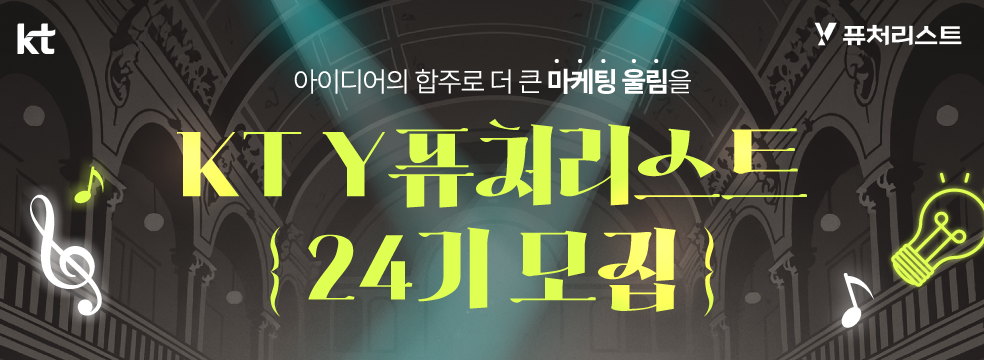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무엇이든 쉽게 그만두는 이들에게 심리학이 전합니다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이들
뭘 하든 쉽게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달리기 시작했다가 포기, 기타 연습을 했으나 포기. 이들은 자책하며 의지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열심히 잘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쉽게 포기하는 성향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뭐든 조금만 힘들어지면 관두곤 했다. 피아노를 배웠을 때 금방 피아니스트처럼 멋지게 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만뒀다.
몇 년 전엔 물레를 돌려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TV에서 보던 것처럼 손만 살짝 갖다 대면 도자기가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흙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중심을 조금만 흩트리면 금세 엉망진창이 되었다. ‘에 이 안 해!’ 또 그만두고 말았다.
자꾸 그만두는 게 끈기 탓일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히 끈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해서 잘 되는 경우는 그래도 꽤 꾸준히 했던 걸 보면. 내게는 ‘좋아해서 계속하는’ 프로세스보 다는 ‘잘하면 계속하고’ ‘못 하면 바로 그만두는’ 프로세스가 더 크게 작용했다.
반드시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다. 피아노도 도자기도 나보다 잘하는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도망치곤 했다. 왜 그랬을까?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과정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결과를 중시하는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1].
첫 번째는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로 수행의 결과와 실패하지 않는 것에 큰 포커스를 두는 것이다. 성과목표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지보다 일단 ‘실패만 하지 않는 것’이 큰 목표가 된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적어도 겉보기에는 괜찮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한다.
실제론 별로 아는 게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상태여도 ‘치팅’을 해서라도 자신이 실패자가 아님을 보이고 싶어 한다.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면 계속한다.
두 번째는 숙련목표(mastery goal)다. ‘숙련’이란 명칭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또 결과가 어떻든 그 일을 통해 내가 즐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경우다. 숙련목표를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즐거움을 느끼는 한 그 일을 계속한다.
나의 경우 내가 했던 일들에서 성과목표가 더 큰 편이었다. 못 한다고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취미 생활에서도 과정을 순수하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결과’에 크게 신경 쓰고 말았다. 엄청 하고 싶었던 일도 조금만 잘 안 되거나 혹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들으면 흥미를 잃곤 했다.
‘못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알고는 있었음에도 최근에야 체험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요즘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창피하지 않도록 하는 걸 중시하는 나와 달리 서툴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됐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꼬마아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내가 요가를 시작한 이유는 즐겁게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지 경쟁하거나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이 시간은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므로 그 외의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덕분에 요가를 엉망진창으로 하지만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 조금이나마 성과를 떠나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실제로 성과목표가 강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성취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잘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과목에 있어 숙련목표가 강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더 좋진 않았지만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를 더 크게 느끼고 다음 학기에도 관련 수업을 수강할 의향을 보였다. 반면 성과목표가 강한 학생들은 성적은 더 좋았는데 그 과목에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2].
따라서 연구자들은 장기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거기에 마음을 다 바쳐 깊은 전문성을 갖게 되는 사람은 성과목표보다 숙련목표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숙련목표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과가 나쁘다고 ‘으이구 이 멍청아’, ‘넌 이래서 안 돼’ 등 자신을 비난해 버릇하는 모습도 비교적 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줄 알고, 자신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인식하며 뿌듯함을 느낄 줄 알기 때문이다.
결과는 짧지만 과정은 길다. 삶은 결국 시간이고 이 시간의 대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아닌 거기로 가는 과정들이다. 따라서 매 순간 나름의 기쁨을 추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직 결과의 좋음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대체로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4]. 만약 그럭저럭 잘하는 일은 많은데 딱히 좋아하는 일은 없다면, 성과에만 과하게 초점을 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나의 즐거움, 배움과 성장에도 관심을 주자.
─각주[1] Eccles, J. S.,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09-132. [2] Harackiewicz, J. M., Barron, K. E., Tauer, J. M., Carter, S. M., & Elliot, A. J. (2000). Shortterm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achievement goals: Predicting interest and performance over tim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316-330. [3] Neff, K., Hsieh, Y., &Dejitterat, K. (2005). Selfcompassion, achievementgoals, and coping with academic failure. Self and Identity, 4, 263–287.[4] Diener, E.,Sandvik, E., &Pavot. W. (1991). Happiness is the frequency,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F. Strack& M.Argyle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Vol. 21, pp. 119-139).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Writer 박진영 imaum0217@naver.com 연세대 심리학 석사.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블로그(jinpark.egloos.com)’를 운영하며, 책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를 썼다.
#공돌이를 위한 심리학#심리학#공돌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