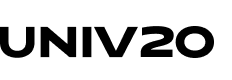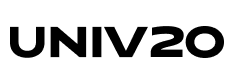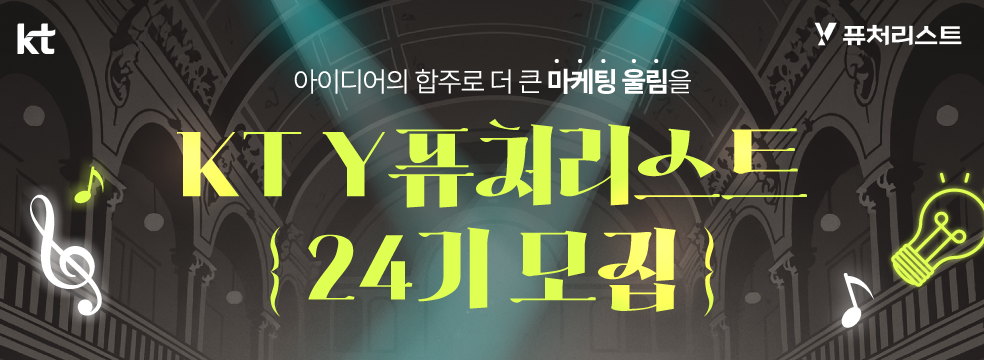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봉준호 정주행] #1. 봉준호가 말하는 봉준호.zip
그의 유년 시절부터 작품 세계까지.
노력하는 천재. 같이 일하면 여지없이 팬이 되는 마성의 인간미. 데뷔작 빼고 다 대표작. 조물주의 실수로 태어난 완벽한 영화감독…! 봉준호의 6번째 영화 <옥자>가 이달 말 개봉한다.
<살인의 추억>부터 <괴물>, <마더>, <설국열차>까지. 봉준호 덕후인 에디터들은 그의 영화가 언제나 예상을 빗겨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번엔 뭘 만들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 미칠 지경!
봉준호 덕후들이 <옥자>를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지금부터 봉준호를 정주행해보자.
<살인의 추억>부터 <괴물>, <마더>, <설국열차>까지. 봉준호 덕후인 에디터들은 그의 영화가 언제나 예상을 빗겨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번엔 뭘 만들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 미칠 지경!
봉준호 덕후들이 <옥자>를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지금부터 봉준호를 정주행해보자.
불타는 프라이팬 위에 올라간 기분이다.
<옥자> 기자간담회 중, 한 기자가 칸 영화제에 초청된 소감을 묻자 봉 감독이 한 답변. 칸 영화제에서 봉 감독의 여유 있는 웃음 속에는 사실 흥분만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어렸을 때, 뭐… 변태 학생이었어요. 바퀴벌레를 키워본 적 있었어요. 봉준호의 유년 시절을 변태로 만든 건 뭘까? 그가 살았던 아파트에는 바퀴벌레가 많았다. 벌레를 으깨 죽이는 게 싫었던 봉준호는 바퀴벌레를 유리병에 잡아 넣었다. 그리고 관찰했다. (…?)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피조물이 생겼을까, 와!’라고 생각하며(ㄷㄷ). <설국열차>에 등장하는 단백질 블록은 봉준호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긴 것은 아닐까?
봉준호 : "쏭쏘로송송송"
송강호 : "뽕뽀로봉봉봉"
이 무슨 외계어인가 싶지만, 봉준호와 송강호가 만나서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법이다. 목소리도 상당히 하이톤. 하지만 곧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하고 근엄하게 말한다. 태세 전환이 수준급.
<설국 열차> 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암담하다. 시나리오 쓰기가 제일 싫은 것 같다. 누가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했던가? 매번 칸 영화제에 초청 받는 영화 감독도, 시나리오 쓰기 싫은 마음은 매한가지. 마치 우리가 과제 제출 하루 전에 벼락치기로 리포트를 쓰면서 ‘아, 진짜 쓰기 싫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 감독들은 전부 지옥 갈거다.
<살인의 추억> 촬영 당시, 논두렁에서 계속 뒹굴며 촬영하는 배우들을 보며 봉 감독이 했던 생각. 진흙에서 뒹굴어 엉망진창이 된 배우들을 보면 안쓰러움이 커지다가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는다’는 확고한 자세 덕분에 촬영은 쭈욱… 계속되었다.
저는 유달리 비정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제가 멋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꽃미남의 대명사인 원빈이 <마더>에서는 동네 바보로 나온다. <살인의 추억>에도, <괴물>에도 바보 같은 인물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봉준호 감독이 시종일관 멋지기만 한 캐릭터를 싫어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정상’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지는 영화 속 세상과 달리 현실의 우리는 너무 자주 벽에 막히고 미끄러지니까.
한강에서 더 이상 영화를 못 찍게 해 주겠다. <괴물>을 찍을 때 봉준호 감독의 마음가짐.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다른 감독들이 비슷한 영화를 찍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하게 만들 것 이라는 각오였다고. 다짐은 <설국열차>를 찍을 때도 계속 되었다. 무섭다 무서워.
한마디로 X같은 시대였죠.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살인범과 국가 공권력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완패. 영화에서처럼 범인을 잡기는 커녕 형편없는 수사로 애꿎은 용의자들만 잡는다. 한마디로 ‘뭐 같은’ 시대였던 것이다. 그래서 봉 감독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신 ‘5공 말기 연쇄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싶었다고 한다. 화성이라는 특정 동네가 아니라, 그 시대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건 창작을 하는 것은 시험 성적처럼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2013년 봉준호 감독이 한 포럼에서 대학생들에게 전한 말. 그는 “자기 스스로 첫 번째 관객으로서 확신이 들 때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라며 “주변에서 축복해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봉준호 감독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본투비 엘리트 같지만, 사실 그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살인의 추억>과 <괴물>을 제작 할 당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괴물> 제작 초반에 ‘병원에 가봐라’, ‘전작 <살인의 추억>이 성공하더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그는 묵묵히 결과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천만명이 본 영화를 만들었다.
봉준호 장르, 가장 큰 찬사다.
봉 감독은 “장르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답한다.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옥자> 역시 기존 봉준호 영화와는 또 다른 색채를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칸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어떤 분들은 내 영화의 장르 구분을 포기하고, ‘봉준호 장르’라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찬사” 라고 말했다.
<옥자> 기자간담회 중, 한 기자가 칸 영화제에 초청된 소감을 묻자 봉 감독이 한 답변. 칸 영화제에서 봉 감독의 여유 있는 웃음 속에는 사실 흥분만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어렸을 때, 뭐… 변태 학생이었어요. 바퀴벌레를 키워본 적 있었어요. 봉준호의 유년 시절을 변태로 만든 건 뭘까? 그가 살았던 아파트에는 바퀴벌레가 많았다. 벌레를 으깨 죽이는 게 싫었던 봉준호는 바퀴벌레를 유리병에 잡아 넣었다. 그리고 관찰했다. (…?)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피조물이 생겼을까, 와!’라고 생각하며(ㄷㄷ). <설국열차>에 등장하는 단백질 블록은 봉준호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긴 것은 아닐까?
봉준호 : "쏭쏘로송송송"
송강호 : "뽕뽀로봉봉봉"
이 무슨 외계어인가 싶지만, 봉준호와 송강호가 만나서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법이다. 목소리도 상당히 하이톤. 하지만 곧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하고 근엄하게 말한다. 태세 전환이 수준급.
<설국 열차> 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암담하다. 시나리오 쓰기가 제일 싫은 것 같다. 누가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했던가? 매번 칸 영화제에 초청 받는 영화 감독도, 시나리오 쓰기 싫은 마음은 매한가지. 마치 우리가 과제 제출 하루 전에 벼락치기로 리포트를 쓰면서 ‘아, 진짜 쓰기 싫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 감독들은 전부 지옥 갈거다.
<살인의 추억> 촬영 당시, 논두렁에서 계속 뒹굴며 촬영하는 배우들을 보며 봉 감독이 했던 생각. 진흙에서 뒹굴어 엉망진창이 된 배우들을 보면 안쓰러움이 커지다가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는다’는 확고한 자세 덕분에 촬영은 쭈욱… 계속되었다.
저는 유달리 비정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제가 멋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꽃미남의 대명사인 원빈이 <마더>에서는 동네 바보로 나온다. <살인의 추억>에도, <괴물>에도 바보 같은 인물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봉준호 감독이 시종일관 멋지기만 한 캐릭터를 싫어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정상’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지는 영화 속 세상과 달리 현실의 우리는 너무 자주 벽에 막히고 미끄러지니까.
한강에서 더 이상 영화를 못 찍게 해 주겠다. <괴물>을 찍을 때 봉준호 감독의 마음가짐.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다른 감독들이 비슷한 영화를 찍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하게 만들 것 이라는 각오였다고. 다짐은 <설국열차>를 찍을 때도 계속 되었다. 무섭다 무서워.
한마디로 X같은 시대였죠.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살인범과 국가 공권력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완패. 영화에서처럼 범인을 잡기는 커녕 형편없는 수사로 애꿎은 용의자들만 잡는다. 한마디로 ‘뭐 같은’ 시대였던 것이다. 그래서 봉 감독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신 ‘5공 말기 연쇄 살인사건’으로 부르고 싶었다고 한다. 화성이라는 특정 동네가 아니라, 그 시대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건 창작을 하는 것은 시험 성적처럼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2013년 봉준호 감독이 한 포럼에서 대학생들에게 전한 말. 그는 “자기 스스로 첫 번째 관객으로서 확신이 들 때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다”라며 “주변에서 축복해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 봉준호 감독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본투비 엘리트 같지만, 사실 그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살인의 추억>과 <괴물>을 제작 할 당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괴물> 제작 초반에 ‘병원에 가봐라’, ‘전작 <살인의 추억>이 성공하더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그는 묵묵히 결과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천만명이 본 영화를 만들었다.
봉준호 장르, 가장 큰 찬사다.
봉 감독은 “장르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답한다.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옥자> 역시 기존 봉준호 영화와는 또 다른 색채를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칸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어떤 분들은 내 영화의 장르 구분을 포기하고, ‘봉준호 장르’라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찬사” 라고 말했다.
[821호 - issue]
#821호#봉준호#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