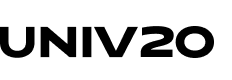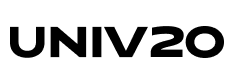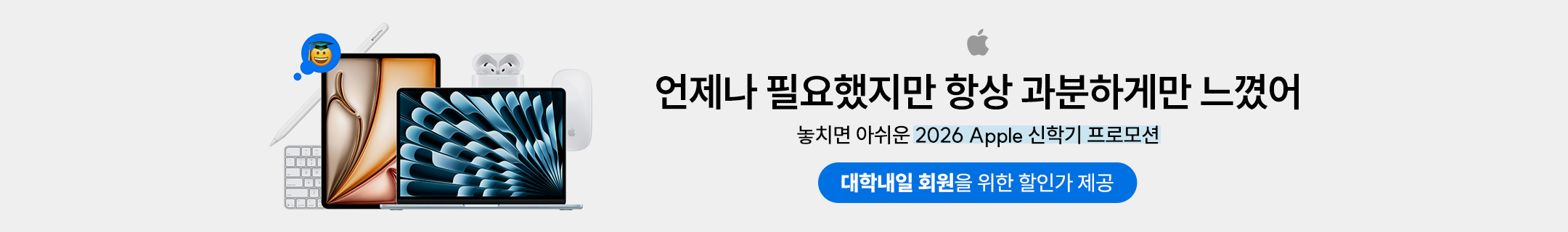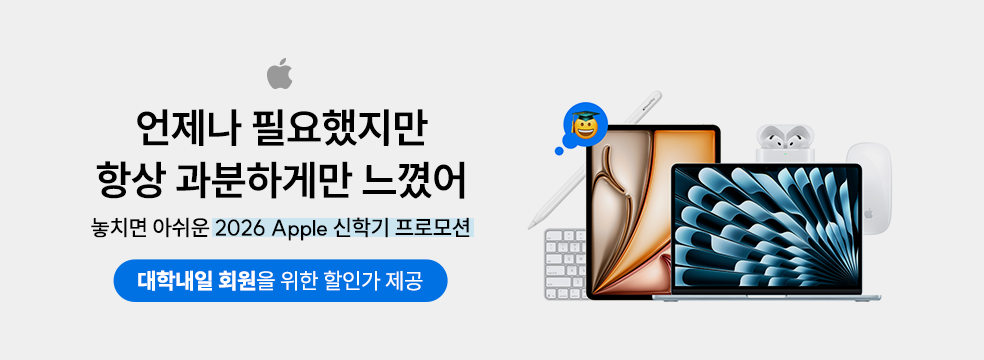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정규직이 뭐라고
과거의 신분이 ‘계약직’이었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
나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 2년이 흐른 얼마 전, 정규직이라는 노란선 안에 가까스로 들어오게 됐다.
어렵다는 취업이지만, 나만은 다를 줄 알았다. 취업이라는 잡히지 않는 목표를 향해 1년 반 시간을 허비하고 남은 건 나약함뿐이던 때, 대기업 ‘계약직’이라는 조건에 그만 안착해버리고 싶었 다. 엄마에게 “죽고 싶다”는 나쁜 말까지 서슴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존재였으니.
계약직의 불평등한 처우,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통계치가 매스컴에 쏟아져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잘만 하면’, ‘나는 잘할 거니까’ 따위의 희망 고문을 퍼부어대며 그렇게 계약직 인생을 시작했다.
패기는 사라지고 우울만 남았다. 계약직 2년이라는 시간, 단 하루도 ‘나는 계약직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갔다. 취업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취준생, 스펙을 쌓아보고자 적은 돈에도 출퇴근하는 인턴들이 부러웠다. 적어도 그들에겐 미래가 있어 보였고, 나에게선 희망이 모조리 멀어지는 것 같았으니까.
가까운 지인 몇을 제외하곤 나의 신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굳이 동정을 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 친구 여럿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회사 뒷담화가 시작되고 “우리 팀 계약직 직원은~” 따위의 주제가 입에 오르면 나는 몇 번이나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내 심장을 패대기친 것은, 오히려 내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등 뒤로 몰래 잡아준 손이었다. 그 손은 친절했지만 잔인했다. 나를 위로하려고 했겠지만 내 자존감을 날카롭게 쑤셔댈 뿐이었다.
회사 게시판 공지에 ‘계약직 포함’이라는 텍스트는 늘 나를 열등감에 떨게 했다. 계약직이 주류가 아닌 것을 번번이 깨닫게 해줬으니 말이다.
가장 못났던 것은 정규직 직원들을 깔보는 내 모습이었다. ‘나보다 대학도 구린데’ ‘나는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데 저 인간은 정규직이면서 왜 칼퇴야?’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디서 으스대?’라는 덜떨어진 생각뿐이었다.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줄 때면 드라마 <미생>처럼 행여나 나에게만 다른 선물을 주지는 않을까 싶었고, 어쩌다 딴짓이라도 하다 회사 임원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엔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였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도리밖에 없었다. 나는 계약직이었니까. 분노, 절망, 초라함뿐인 시간이 계속됐다.
회사는 1년이 지나면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자 슬그머니 재계약 서류를 내게 들이밀었고 부지런히 바닥을 친 자존감은 1년 더 다녀보자는 마음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늘 허세를 부렸다. “나 곧 그만둘거야. 이딴 쓰레기 회사 더 다닐 필요도 없어.” 하지만 실은 회사로부터 버려질까 봐 먼저 선수를 치고 싶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났고, 그렇게 씹어댔던 그 회사에 정규직 직원이 됐다. 당장이라도 퇴사하겠다고 으르렁대던 나는 2년간 익숙해진 출퇴근 길을 벌써 3년째 걷고 있다.
정규직이 되면 어떨까? 궁금했었다. 계약직 신분에서 느꼈던 그 불안, 우울은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2년간 써 내려간 일기장도 정규직이 되면 나의 지난 우울의 한 낱 추억쯤으로 여기며 한 페이지씩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아직도 난 지난 과거의 신분이 ‘계약직’이었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 지난 일기장은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채 책장 구석에서 먼지만 잔뜩 마시고 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눈치 보일 때는 회사가 나와의 계약서를 무르자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이없는 상상을 하며 불안에 동공이 떨리기도 한다. 방치된 상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상처의 치료가 너무 늦어진 것은 아닐까?
어렵다는 취업이지만, 나만은 다를 줄 알았다. 취업이라는 잡히지 않는 목표를 향해 1년 반 시간을 허비하고 남은 건 나약함뿐이던 때, 대기업 ‘계약직’이라는 조건에 그만 안착해버리고 싶었 다. 엄마에게 “죽고 싶다”는 나쁜 말까지 서슴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존재였으니.
계약직의 불평등한 처우,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통계치가 매스컴에 쏟아져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잘만 하면’, ‘나는 잘할 거니까’ 따위의 희망 고문을 퍼부어대며 그렇게 계약직 인생을 시작했다.
패기는 사라지고 우울만 남았다. 계약직 2년이라는 시간, 단 하루도 ‘나는 계약직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갔다. 취업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취준생, 스펙을 쌓아보고자 적은 돈에도 출퇴근하는 인턴들이 부러웠다. 적어도 그들에겐 미래가 있어 보였고, 나에게선 희망이 모조리 멀어지는 것 같았으니까.
가까운 지인 몇을 제외하곤 나의 신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굳이 동정을 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 친구 여럿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회사 뒷담화가 시작되고 “우리 팀 계약직 직원은~” 따위의 주제가 입에 오르면 나는 몇 번이나 쿵, 하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내 심장을 패대기친 것은, 오히려 내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등 뒤로 몰래 잡아준 손이었다. 그 손은 친절했지만 잔인했다. 나를 위로하려고 했겠지만 내 자존감을 날카롭게 쑤셔댈 뿐이었다.
회사 게시판 공지에 ‘계약직 포함’이라는 텍스트는 늘 나를 열등감에 떨게 했다. 계약직이 주류가 아닌 것을 번번이 깨닫게 해줬으니 말이다.
가장 못났던 것은 정규직 직원들을 깔보는 내 모습이었다. ‘나보다 대학도 구린데’ ‘나는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데 저 인간은 정규직이면서 왜 칼퇴야?’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디서 으스대?’라는 덜떨어진 생각뿐이었다.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줄 때면 드라마 <미생>처럼 행여나 나에게만 다른 선물을 주지는 않을까 싶었고, 어쩌다 딴짓이라도 하다 회사 임원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엔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였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도리밖에 없었다. 나는 계약직이었니까. 분노, 절망, 초라함뿐인 시간이 계속됐다.
회사는 1년이 지나면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자 슬그머니 재계약 서류를 내게 들이밀었고 부지런히 바닥을 친 자존감은 1년 더 다녀보자는 마음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늘 허세를 부렸다. “나 곧 그만둘거야. 이딴 쓰레기 회사 더 다닐 필요도 없어.” 하지만 실은 회사로부터 버려질까 봐 먼저 선수를 치고 싶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났고, 그렇게 씹어댔던 그 회사에 정규직 직원이 됐다. 당장이라도 퇴사하겠다고 으르렁대던 나는 2년간 익숙해진 출퇴근 길을 벌써 3년째 걷고 있다.
정규직이 되면 어떨까? 궁금했었다. 계약직 신분에서 느꼈던 그 불안, 우울은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2년간 써 내려간 일기장도 정규직이 되면 나의 지난 우울의 한 낱 추억쯤으로 여기며 한 페이지씩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아직도 난 지난 과거의 신분이 ‘계약직’이었음을 들키고 싶지 않다. 지난 일기장은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채 책장 구석에서 먼지만 잔뜩 마시고 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눈치 보일 때는 회사가 나와의 계약서를 무르자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이없는 상상을 하며 불안에 동공이 떨리기도 한다. 방치된 상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상처의 치료가 너무 늦어진 것은 아닐까?
Writer 임혜진(가명)인생의 쓴맛을 가불해서 맛본 자
#에세이#20's 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