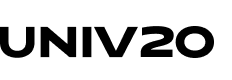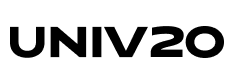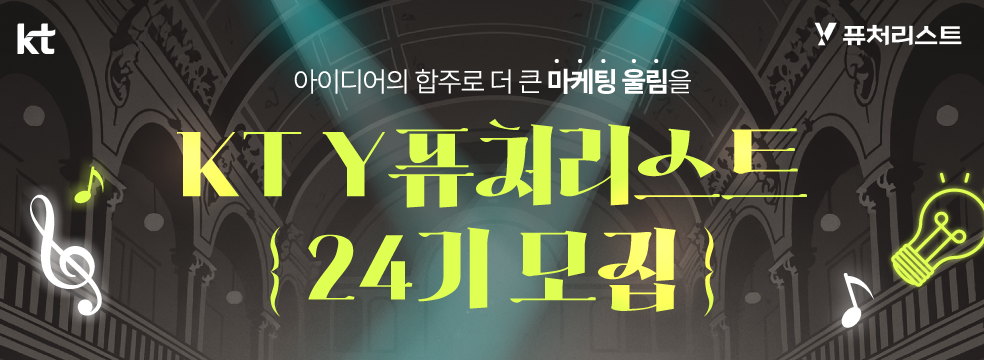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좋은 집을 못 찾겠군요
“지금 예산으로 그런 거 다 바라면 안 돼요.”
“지금 예산으로 그런 거 다 바라면 안 돼요.”
얼마 전 새로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나는 괜히 부아가 치밀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던 지난 집들은 매번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저 다섯 평 남짓한 방이 줄 안락함, 그것을 찾아 5년여의 세월을 헤맸으나 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집은 1000/50의 신축 오피스텔 원룸. 비싼 월세는 나에게 ‘안심 비용’ 같은 것이었는데, 방범 장치가 잘 마련돼 있어 불안에 떨 일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삐삐삐삐- 무작위로 누른 번호가 뱉어낸 도어락 오류음이 갑작스럽게 내 방을 침입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의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순간, 쿵쿵쿵- 현관문을 흔드는 낯선 소리를 마주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그는 이상하고 무서운 설명을 늘어놓았다. 문을 열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 나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저 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절망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온 신경으로 절감했다.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 각조차 하지 못했다. 집을 옮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뿐.
두 번째 집은 학교 앞 500/35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 습했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와 가까웠고, 무엇보다 저렴했기에 참을 만했다(참아야 했다). 장마철이면 벽을 타고 오르는 거무튀튀한 곰팡이들의 습격.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공포에 온 몸이 떨렸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났다.
세탁기가 연결된 수도꼭지가 오래돼 노즐이 빠져버렸고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새 세탁기로 들어가야 할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화장실을 넘어 내 방으로 넘쳐 흘렀고 그렇게 물바다가 됐다. 장마철도 아닌데 홍수라니…. 나는 발목까지 찬 물을 휴지통으로 쉴 새 없이 퍼내고 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버리면서 생각했다. 이건 내 잘못일까, 내 운일까. 아니면 싼 가격에 딸려오는 ‘위험 비용’을 응당 치르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집은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있을 때 살았던 50/50 정도의 셰어하우스. 이 집의 문제는 집주인이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나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그가 이내 연락이 두절돼버린 것이다. 귀국하기 전까지 수십 통의 연락을 하고, 직접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한국에 와서 현지 친구를 통해 법률 소송의 문턱까지 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나처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주로 오래 거주하지 않을,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최근 나는 살던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다. 이번엔 전대차 문제였다. 집주인에게 방을 빌린 임차인이 또 다른 세입자 에게 세를 놓은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세입자였는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전세를 빼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내가 박복한 운명의 소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내가 좀 더 잘 알아봤더라면…’ 하는 자책의 심연으로 금세 빠져버린다.
이것은 어느 유난 떠는 자취생의 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거 공간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조건에 맞는 매물을 고른 것이라고. 그러니 애초에 잘 알아보지 못한 네 탓이 아니냐고. 하지만 누군들 곰팡이가 스미고, 벌레가 들끓으며, 치안이 불안한 집을 바랐겠나. 나는 그저 상식적인 집을 원할 뿐이다. 아침이면 햇볕이 내리쬐어 창가에 널어둔 빨래가 금방 마르고, 여자 혼자 산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나를 배신해도 나를 보호해줄 제도와 장치가 있는 곳.
숱한 주거 문제들을 겪으며 나는 일상이 불안해지고, 자괴감에 빠졌으며 한 켠에서 무력감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주거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평균 50만원의 돈을 내고도 평범한 삶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니.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을 지키는 데도 각자도생의 논리가 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삶은 계속해서 ‘박복한 운명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연히 본 트위터 인권선언봇의 트윗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얼마 전 새로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나는 괜히 부아가 치밀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던 지난 집들은 매번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저 다섯 평 남짓한 방이 줄 안락함, 그것을 찾아 5년여의 세월을 헤맸으나 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집은 1000/50의 신축 오피스텔 원룸. 비싼 월세는 나에게 ‘안심 비용’ 같은 것이었는데, 방범 장치가 잘 마련돼 있어 불안에 떨 일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삐삐삐삐- 무작위로 누른 번호가 뱉어낸 도어락 오류음이 갑작스럽게 내 방을 침입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의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순간, 쿵쿵쿵- 현관문을 흔드는 낯선 소리를 마주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그는 이상하고 무서운 설명을 늘어놓았다. 문을 열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걸까. 나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저 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절망 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온 신경으로 절감했다.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 각조차 하지 못했다. 집을 옮기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뿐.
두 번째 집은 학교 앞 500/35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 습했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와 가까웠고, 무엇보다 저렴했기에 참을 만했다(참아야 했다). 장마철이면 벽을 타고 오르는 거무튀튀한 곰팡이들의 습격.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공포에 온 몸이 떨렸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났다.
세탁기가 연결된 수도꼭지가 오래돼 노즐이 빠져버렸고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새 세탁기로 들어가야 할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화장실을 넘어 내 방으로 넘쳐 흘렀고 그렇게 물바다가 됐다. 장마철도 아닌데 홍수라니…. 나는 발목까지 찬 물을 휴지통으로 쉴 새 없이 퍼내고 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버리면서 생각했다. 이건 내 잘못일까, 내 운일까. 아니면 싼 가격에 딸려오는 ‘위험 비용’을 응당 치르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집은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있을 때 살았던 50/50 정도의 셰어하우스. 이 집의 문제는 집주인이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나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그가 이내 연락이 두절돼버린 것이다. 귀국하기 전까지 수십 통의 연락을 하고, 직접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한국에 와서 현지 친구를 통해 법률 소송의 문턱까지 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나처럼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주로 오래 거주하지 않을,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최근 나는 살던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렸다. 이번엔 전대차 문제였다. 집주인에게 방을 빌린 임차인이 또 다른 세입자 에게 세를 놓은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세입자였는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전세를 빼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내가 박복한 운명의 소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내가 좀 더 잘 알아봤더라면…’ 하는 자책의 심연으로 금세 빠져버린다.
이것은 어느 유난 떠는 자취생의 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거 공간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조건에 맞는 매물을 고른 것이라고. 그러니 애초에 잘 알아보지 못한 네 탓이 아니냐고. 하지만 누군들 곰팡이가 스미고, 벌레가 들끓으며, 치안이 불안한 집을 바랐겠나. 나는 그저 상식적인 집을 원할 뿐이다. 아침이면 햇볕이 내리쬐어 창가에 널어둔 빨래가 금방 마르고, 여자 혼자 산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나를 배신해도 나를 보호해줄 제도와 장치가 있는 곳.
숱한 주거 문제들을 겪으며 나는 일상이 불안해지고, 자괴감에 빠졌으며 한 켠에서 무력감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주거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평균 50만원의 돈을 내고도 평범한 삶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니.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을 지키는 데도 각자도생의 논리가 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삶은 계속해서 ‘박복한 운명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연히 본 트위터 인권선언봇의 트윗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825호 - 20's voice]
writer 김영화 movie@univ.me 생각해보니 표류중인 것은 집 뿐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새 집은 제발 좀 무탈하길!
#20's voice#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