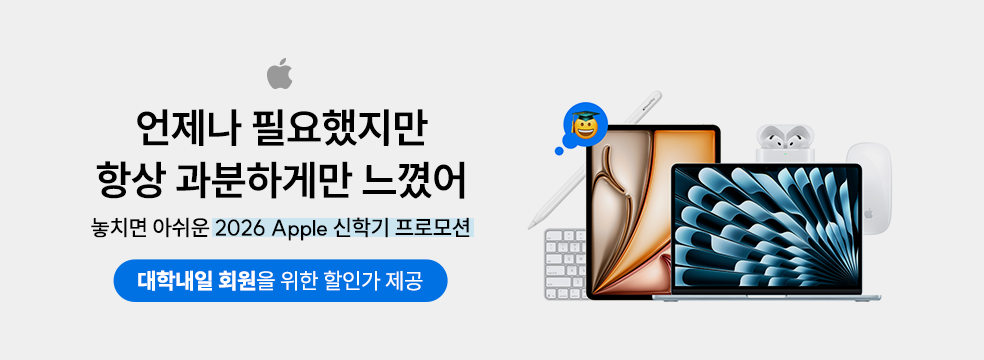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똥강아지와 할머니
할머니 바보!
‘똥강아지’, 할머니가 날 부르는 애칭이다. 길에 돌아다니는 철없고 지저분한 강아지를 경상도에선 흔히 ‘똥개’라고 한다. 할머니는 코흘리개 손자를 보니 그 ‘똥개’가 떠오르신 모양이다. 내 나이가 어느덧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새로운 별명을 찾지 못하셨다.
산만 한 덩치에 수염이 까끌까끌하게 나는데도 여전히 똥강아지로 보이시나 보다. 종종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장면 속에는 할머니가 자주 등장한다. 내가 6살이 될 때까지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살았던 울산의 아파트에는 조그만 방 세 개가 있었다.
안방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머지 방 두 개는 누나와 나, 엄마와 아빠가 나눠 썼다. 안방엔 상자 같이 뭉뚝한 TV가 놓여 있었는데, 날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켜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깨어 안방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곤 했다. 6살 때 아빠, 엄마, 누나와 함께 도심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으셨다.
예를 들면 초, 중, 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특히 졸업식 땐 두꺼운 사전과 꽃다발을 품에 안고 걸어오셔서 “우리 똥강아지~”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안아주셨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뒤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다. 가족보다 내 생활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할머니를 볼 시간 역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 학기에 한 번꼴로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천장이 울릴 정도의 데시벨로 “우리 똥강아지~~~!”를 외치며 내 허리가 터져라 끌어안으시는 할머니를 볼 때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죄송스러움이 밀려들어 어쩔 줄 몰랐다.
얼마 전, 독일로 떠나는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할머니 댁을 찾았다.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부르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어두워진 귀 탓에 할머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설거지에 몰두하고 계셨다. 한 톤 올린 목소리로 “할머니~! 저 왔어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반가운 표정으로 돌아보시며 “우리 똥강아지 왔나!” 하며 내 품에 쏙 안기셨다.
반가움도 잠시, 듬성듬성한 머리숱에 부스스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손자의 연락이 뜸했던 지난 몇 달이 할머니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할머니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짜증 났다.
고장 나서 버튼이 잘 눌리지 않는 선풍기, 눈이 침침한 할머니가 건전지를 갈아 끼우기 힘든 보청기, 마지막으로 언제 바꾼 건가 싶은 폴더폰,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의 발이었다. 발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앉고 일어설 때마다 할머니는 앓는 소리를 내셨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할머니는 날 배웅하려 절뚝거리며 집 밖을 나오셨다. 아파트가 15층이라 나오시지 말라고 극구 말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큰고모는 “우리 엄마 습관”이라며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발이 편찮은데 굳이 따라 나오는 할머니가 못내 신경 쓰였다. 왜 매번 집 앞까지 날 배웅해주시는 걸까. 마음이 불편해 머뭇거리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다
“똥강아지! 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오면 안 되나?” 그제야 왜 여태 할머니가 집 앞까지 따라 나와 날 배웅하는지 알아챘다. 올 때마다 일찍 휙 떠나버리는 손자가 너무 서운해서. 자고 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앞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걸 어찌할 도리 없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득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내내 할머니는 손자의 외국 생활이 걱정돼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걱정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바보!
산만 한 덩치에 수염이 까끌까끌하게 나는데도 여전히 똥강아지로 보이시나 보다. 종종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장면 속에는 할머니가 자주 등장한다. 내가 6살이 될 때까지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살았던 울산의 아파트에는 조그만 방 세 개가 있었다.
안방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머지 방 두 개는 누나와 나, 엄마와 아빠가 나눠 썼다. 안방엔 상자 같이 뭉뚝한 TV가 놓여 있었는데, 날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켜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깨어 안방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곤 했다. 6살 때 아빠, 엄마, 누나와 함께 도심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으셨다.
예를 들면 초, 중, 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특히 졸업식 땐 두꺼운 사전과 꽃다발을 품에 안고 걸어오셔서 “우리 똥강아지~”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안아주셨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뒤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다. 가족보다 내 생활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할머니를 볼 시간 역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 학기에 한 번꼴로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천장이 울릴 정도의 데시벨로 “우리 똥강아지~~~!”를 외치며 내 허리가 터져라 끌어안으시는 할머니를 볼 때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죄송스러움이 밀려들어 어쩔 줄 몰랐다.
얼마 전, 독일로 떠나는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할머니 댁을 찾았다.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부르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어두워진 귀 탓에 할머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설거지에 몰두하고 계셨다. 한 톤 올린 목소리로 “할머니~! 저 왔어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반가운 표정으로 돌아보시며 “우리 똥강아지 왔나!” 하며 내 품에 쏙 안기셨다.
반가움도 잠시, 듬성듬성한 머리숱에 부스스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손자의 연락이 뜸했던 지난 몇 달이 할머니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할머니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짜증 났다.
고장 나서 버튼이 잘 눌리지 않는 선풍기, 눈이 침침한 할머니가 건전지를 갈아 끼우기 힘든 보청기, 마지막으로 언제 바꾼 건가 싶은 폴더폰,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머니의 발이었다. 발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앉고 일어설 때마다 할머니는 앓는 소리를 내셨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할머니는 날 배웅하려 절뚝거리며 집 밖을 나오셨다. 아파트가 15층이라 나오시지 말라고 극구 말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큰고모는 “우리 엄마 습관”이라며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발이 편찮은데 굳이 따라 나오는 할머니가 못내 신경 쓰였다. 왜 매번 집 앞까지 날 배웅해주시는 걸까. 마음이 불편해 머뭇거리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다
“똥강아지! 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오면 안 되나?” 그제야 왜 여태 할머니가 집 앞까지 따라 나와 날 배웅하는지 알아챘다. 올 때마다 일찍 휙 떠나버리는 손자가 너무 서운해서. 자고 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앞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걸 어찌할 도리 없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득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내내 할머니는 손자의 외국 생활이 걱정돼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걱정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바보!
[828호 - 20's voice]
writer 권용범 ksi9152@gmail.com
피터팬증후군 환자
#20대 칼럼#828호#828호 20대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