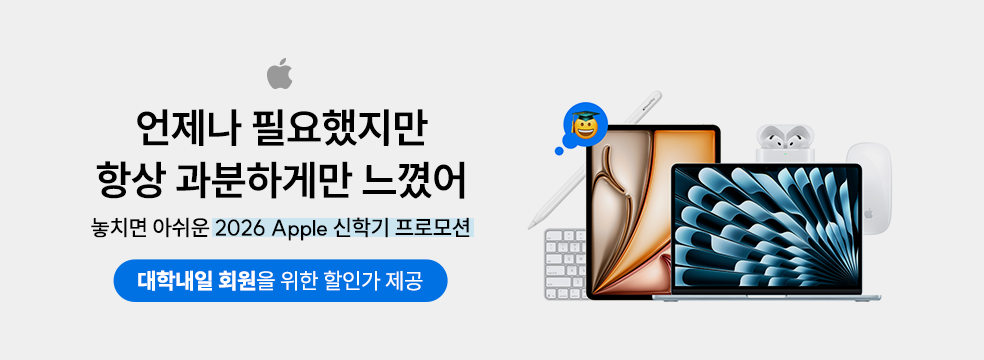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기억의 베를린
작년 가을에는 베를린에 두 달간 머물렀다.

보고 싶은 친구를 찾아서
뉴욕, 브레이, 더블린, 헬싱키, 스톡홀름, 파리, 바르셀로나, 쾰른, 도쿄, 카트만두, 다딩,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쿠스코, 울란바토르, 교토, 오사카, 암스테르담, 런던, 에든버러, 베를린……. 20대에 다녀온 도시의 이름들이다. 몇 번이나 떠나고 돌아오길 반복했다.
여행의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있었고 이내 짐을 싸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있던 자리를 벗어나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돌아올 때는 ‘지금’과 다른 내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고. 그런 기대로 비행기에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몇 차례 반복한 뒤로는 그런 이유에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 있던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건 멀리 가도 알기 어렵다.

물론, 더러 뭔가 느낄 때가 있긴 하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하며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집이 아닌 곳에서 순간적으로 느낀 일은, 또 그만큼 쉽게 사라지곤 했다.
작년, 그러니까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는 다른 이유로 여행을 시작해봤다. 20대 마지막 여행의 이유는 ‘친구’였다. 베를린에 사는 한 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친구를 보기 위해 짐을 쌌다.

욕심이 없는 여행
친구의 베를린 집에 두 달간 머물렀다.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긴 시간 한 도시에 머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세상에는 아직도 가보지 못한 도시가 많고, 이왕이면 새로운 것을 더 보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행이 목적이 아닌 여행에서는 별다른 욕심이 생기질 않는다는 걸, 베를린을 떠날 때 알았다.
뭔가를 꼭 보겠다거나 어딘가에 가려는 의욕 같은 것이 도통 생기질 않았고, 가끔 마음을 먹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주로 있던 장소는 친구의 집과 카페였다. 카페조차도 그리 많이 가지 않았고, 거의 집에 있었다. 가장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은 요리와 대화였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한 사람이 요리하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테이블을 준비하고, 음악을 고르고, 커피를 내렸다.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남은 음식이 그릇에 말라붙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렇게 아침을 먹으려고 앉은 자리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어젯밤에 함께 본 영화, 읽었던 책에서 좋았던 페이지, 듣고 있던 음악에 얽힌 기억이나 미처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같은 것들. 이런 주제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튀어나왔다.

해가 지면 어슬렁거리며 마트에 갔고, 장을 가득 봐 와서 또 식사를 준비했다. 밤늦도록 떠들다 보면 금방 잠잘 시간이 되었다. 하루는 근처 공원에 가서 잔디에 누웠다.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다 한 손을 심장 언저리에 갖다 댔다. 왜 그랬는지는 잘 기억나질 않는다.
혼자 팔짱도 껴보고 깍지를 껴서 머리 뒤로 가져다보기도 하다가 어색했는지, 어쩌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자세로 누워 있게 되었다. 심장이 뛰는 게 손바닥 아래에 느껴지는데, 그게 얼마나 낯설고 신기하던지. 살아 있음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신비롭게 보였다. 여행하다 보면 좀처럼 오지 않는 시간이 올 때도 있다. 언제부턴가 그럴 때, 비장한 표정을 짓거나 각오를 다지기보다는 그 순간을 솔직하게 기록해둔다. 최대한 들뜨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럴 때 쓴 일기나 찍어둔 사진을 시간이 흐른 뒤에 꺼내본다.
그 기억이 나의 오늘을 천천히 둘러보게 해주곤 한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
우리는 종종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다. 사람의 몸을 구겨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테라스였는데, 거기에 의자를 뒀다. 슬리퍼를 벗고 바깥으로 다리를 내밀고 앉았다. 발바닥이 시원했다.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하늘을 봤다. 별이 제법 뜬 날이어서 별자리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는 이름이 몇 없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자리……. 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름 모를 별을 보다보니 또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 친구가 한 남자애를 좋아하게 됐거든. 그 남자가 별자리를 많이 알고 있대.
친구는 그와 산책을 하면서 별자리 이름을 하나둘씩 알게 됐나봐. 그걸 내게 알려주기도 하고. 별자리 앱이라는 게 있다네? 그런 걸 받아서 같이 별자리 이름을 찾아보기도 한대. 그렇게 별자리 이름을 많이 알게 되는 거, 사랑스럽고 멋진 일인 것 같아.” 또 다른 날엔 근처 식물원에 갔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뻗었다. 발바닥이 시원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하늘을 봤다. 잎사귀가 특이한 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가까이 가서 푯말의 이름을 확인했다. 독일어로 쓰인 이름이라 봐도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별자리 이름을 알고 싶어 하던 마음을 떠올리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는 이름이 없을까. 별도 식물도 늘 근처에 머무는 것들인데……. 반대로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을 떠올려봤다. 연예인, 브랜드, 가게 같은 것의 이름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을 거다. 부지런히 찾아보고 반복하다 보니 잘 아는 이름이 된 것이다.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게 되어 슬픈데, 점점 기억력이 나빠진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전보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오늘의 세세한 시간조차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보내다 보면 어린 시절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게 되는 거라고. 요즘은 그 말을 체감한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눈가나 입가에 주름이 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그렇게 늙어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 걸까. 베를린에서는 식물이나 별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억지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겠지만, 하나둘씩 그들의 이름을 알아가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별자리를 찾고, 함께 걸으며 발견한 어느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이런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얼마 전에는 지리산에 가서 ‘배롱나무’에 피는 꽃이 ‘백일홍’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물이나 별자리,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반복해서 영영 기억하고 싶다. 그런 이름을 많이 알고 이름에 얽힌 기억을 가진 할머니는 어쩐지, 근사하지 않을까.
오늘은 ‘여행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또 변할 거다. 겪어가는 일들에 따라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레 바뀐다. 비단 여행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겠지. 30대의 첫 여행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기에 앉은 자리에서 다가올 여행의 모양을 그려본다.
[830호 - Travel]
Traveller 박선아 pacusona@naver.com
#830호#830호 travel#830호 대학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