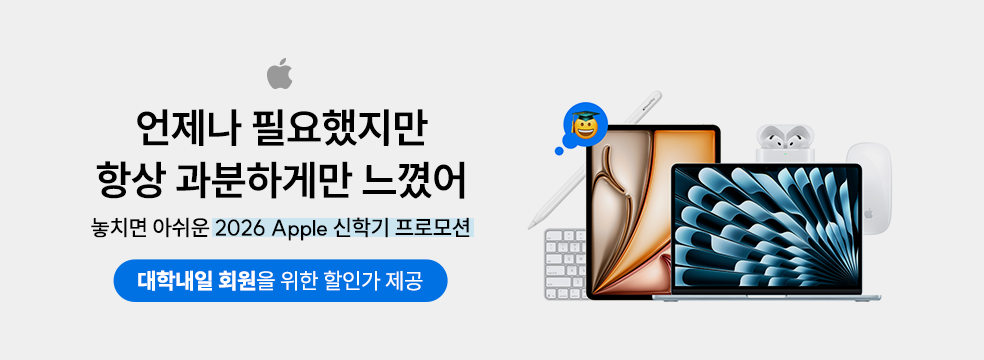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복통과 축하
“X발 X나 부럽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자주 박수를 요구하곤 했다. 누군가가 뭘 잘 했을 때에나 앞에 나와서 정답을 말할 때에나 상장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말했다. “자, 박수!” 애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일찍이 감사와 사과를 학습했던 것처럼 축하를 훈련했다. 청중의 태도를 연습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워하는 애가 상을 받을 때면 나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를 치고 싶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때 내 입가를 스친 짧은 경련을 부디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기를 바라지만, 눈치챈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특정 순간에 약간씩 치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치사함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정말이지 치사하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치사해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초등학교 이후에도 축하와 격려와 칭찬 등을 연습해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도 종종 축하에 실패하곤 한다.
그런 소인배가 나뿐인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때도 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작은 경사가 있었다. 나는 서점에 가서 그의 사진들이 실린 잡지를 산 뒤, 메시지로 그에게 박수를 몇십 번이나 쳐서 전송했다. 그 무렵 또 다른 친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남의 크고 작은 성과 앞에서 그저 함께 기뻐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인생이 똑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구름 한 점 없이 마냥 기쁘게 축하를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누군가 환한 조명을 받을 때 내 어둠이 더 강조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애매한 재능들이 지나가다 뽑은 인형처럼 볼품없이 느껴지곤 한댔다. 아쉬워하는 눈빛 말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이제는 받아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게도 열망 받지 못한 채로,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남긴 채로 자기 이야기가 끝날 것만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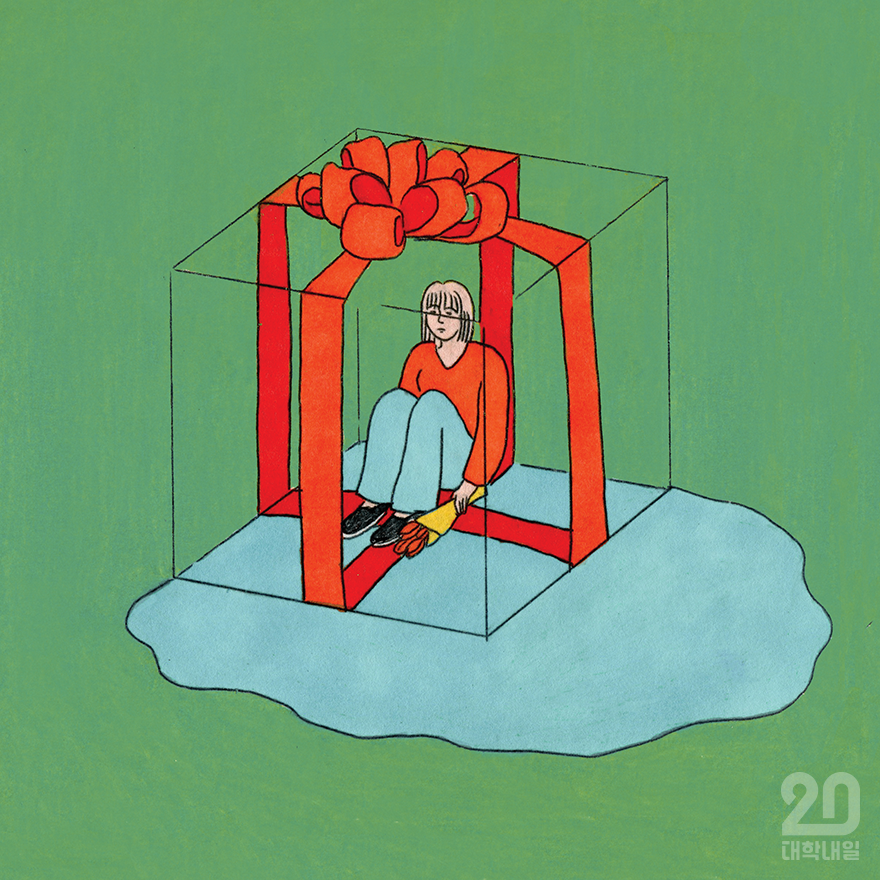
그녀가 별똥별처럼 언제 빛날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끝내 허탕을 쳤다며 자기들끼리 맥줏집으로 걸음을 돌릴 것 같댔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는 아마 끔찍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맥줏집에 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해보았다.
그녀 옆에 남아, 소인배들의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이다. 내가 목격한 그녀의 별똥별처럼 짧고 뜸한 재능에 대해 말해볼 수도 있겠다. 남들이 “뭐야, 방금 지나갔어?” 하며 놓쳤을 법한 순간들을 잘 상기하는 것이다. 습격처럼 다가오는, 남을 축하해야 하는 순간에 대비해 우리는 알아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그녀가 혼자서 마음을 진정하는 방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전투적으로 청소를 하려나. 차를 마시려나. 산에 오르려나. 나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쪽이다. 그리고 외친다. “X발 X나 부럽네!” 그 후 편의점 와인을 사서 마신 뒤 코 잔다.
감사와 사과를 미루지 않듯, 질투와 시샘도 즉각적으로 말해버린다. 큰 소리로 자주 말하면 더 좋다. 너무 여러 번 말한 내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남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이런저런 불행들도 어느 순간 남이 쓴 소설과 영화같이 멀어져버린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영웅담을 읽고 자란 건지도 모르겠다.
역시 『삼국지』는 읽지 않는 게 좋았을까. 유년기 내내 나와 함께, 이문열의 글이 실린 열 권짜리 만화 『삼국지』를 읽고 또 읽은 남동생은 자신의 초라한 날을 어떻게 견딜까. 온갖 종류의 뛰는 놈과 나는 놈과 대인배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탄생하는 그 긴 이야기를 읽으며 남동생은 주인공 혹은 영웅이 되어야만 한다는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동생은 말했다. 삼국지에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중 주연이나 주조연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고. 핀 조명을 받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내내 이어지지는 않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스스로가 다 발휘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늘에서도 무언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자리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된댔다.
영웅전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 나날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댔다. 그 얘기를 듣자, 나는 갑자기 주연도 조연도 아닌 조명 감독 같은 일을 하고 싶어졌다. 아주 많은 조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곳까지 조명을 쏴 구석구석 다 보이게 할 정도로 유능하다면 기쁠 것이다.
혹은 정면에 놓인 1번 카메라 말고 후면이나 측면에 설치된 5, 6번 카메라 뒤에 서고 싶어졌다. 그럼 나를 둘러싼 세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확장될 텐데. 이전에는 축하해보지 못한 것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생길 텐데.
보기 쉽게 드러나는 것들만 부러워하느라 배가 아팠던 걸지도 모른다. 이제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 치기를 그만두고 싶다. 여러 성공담과 실패담 앞에서 매번 시원한 박수를 짝짝짝 건네고 싶다. 소인배 말고 중인배 정도는 되어보고 싶다.
하지만 미워하는 애가 상을 받을 때면 나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를 치고 싶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때 내 입가를 스친 짧은 경련을 부디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기를 바라지만, 눈치챈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특정 순간에 약간씩 치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치사함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정말이지 치사하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치사해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초등학교 이후에도 축하와 격려와 칭찬 등을 연습해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도 종종 축하에 실패하곤 한다.
그런 소인배가 나뿐인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때도 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작은 경사가 있었다. 나는 서점에 가서 그의 사진들이 실린 잡지를 산 뒤, 메시지로 그에게 박수를 몇십 번이나 쳐서 전송했다. 그 무렵 또 다른 친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남의 크고 작은 성과 앞에서 그저 함께 기뻐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인생이 똑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구름 한 점 없이 마냥 기쁘게 축하를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누군가 환한 조명을 받을 때 내 어둠이 더 강조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애매한 재능들이 지나가다 뽑은 인형처럼 볼품없이 느껴지곤 한댔다. 아쉬워하는 눈빛 말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이제는 받아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게도 열망 받지 못한 채로,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남긴 채로 자기 이야기가 끝날 것만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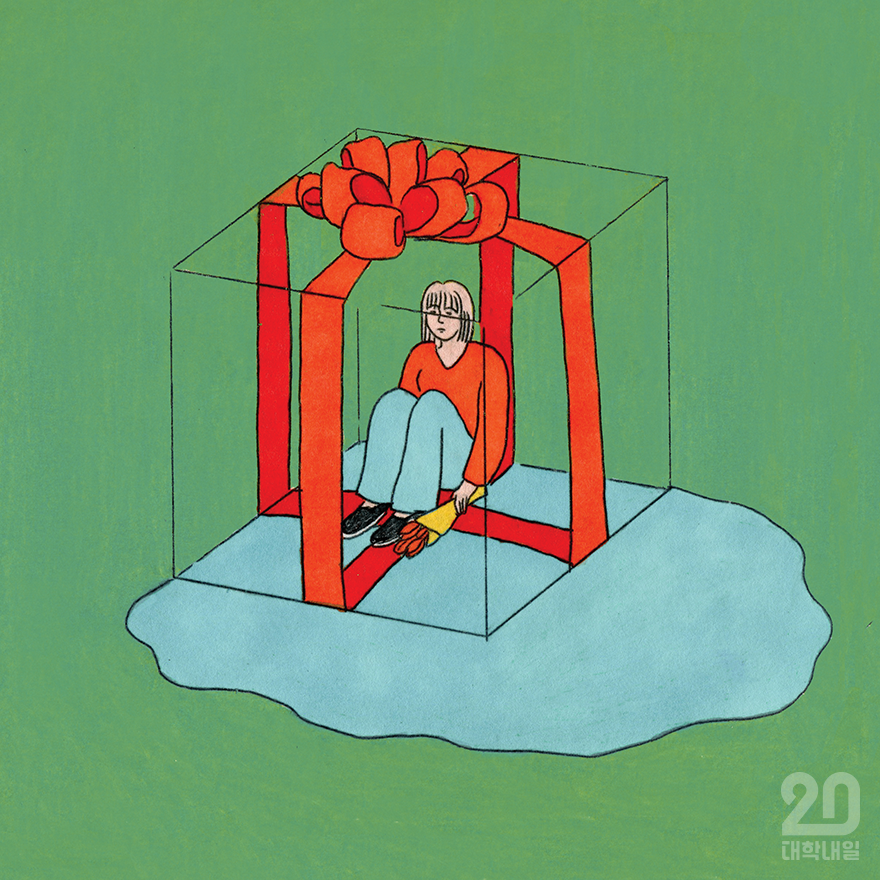
그녀가 별똥별처럼 언제 빛날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끝내 허탕을 쳤다며 자기들끼리 맥줏집으로 걸음을 돌릴 것 같댔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는 아마 끔찍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맥줏집에 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해보았다.
그녀 옆에 남아, 소인배들의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이다. 내가 목격한 그녀의 별똥별처럼 짧고 뜸한 재능에 대해 말해볼 수도 있겠다. 남들이 “뭐야, 방금 지나갔어?” 하며 놓쳤을 법한 순간들을 잘 상기하는 것이다. 습격처럼 다가오는, 남을 축하해야 하는 순간에 대비해 우리는 알아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그녀가 혼자서 마음을 진정하는 방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전투적으로 청소를 하려나. 차를 마시려나. 산에 오르려나. 나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쪽이다. 그리고 외친다. “X발 X나 부럽네!” 그 후 편의점 와인을 사서 마신 뒤 코 잔다.
감사와 사과를 미루지 않듯, 질투와 시샘도 즉각적으로 말해버린다. 큰 소리로 자주 말하면 더 좋다. 너무 여러 번 말한 내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남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이런저런 불행들도 어느 순간 남이 쓴 소설과 영화같이 멀어져버린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영웅담을 읽고 자란 건지도 모르겠다.
역시 『삼국지』는 읽지 않는 게 좋았을까. 유년기 내내 나와 함께, 이문열의 글이 실린 열 권짜리 만화 『삼국지』를 읽고 또 읽은 남동생은 자신의 초라한 날을 어떻게 견딜까. 온갖 종류의 뛰는 놈과 나는 놈과 대인배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탄생하는 그 긴 이야기를 읽으며 남동생은 주인공 혹은 영웅이 되어야만 한다는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동생은 말했다. 삼국지에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중 주연이나 주조연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고. 핀 조명을 받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내내 이어지지는 않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스스로가 다 발휘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늘에서도 무언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자리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된댔다.
영웅전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 나날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댔다. 그 얘기를 듣자, 나는 갑자기 주연도 조연도 아닌 조명 감독 같은 일을 하고 싶어졌다. 아주 많은 조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곳까지 조명을 쏴 구석구석 다 보이게 할 정도로 유능하다면 기쁠 것이다.
혹은 정면에 놓인 1번 카메라 말고 후면이나 측면에 설치된 5, 6번 카메라 뒤에 서고 싶어졌다. 그럼 나를 둘러싼 세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확장될 텐데. 이전에는 축하해보지 못한 것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생길 텐데.
보기 쉽게 드러나는 것들만 부러워하느라 배가 아팠던 걸지도 모른다. 이제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 치기를 그만두고 싶다. 여러 성공담과 실패담 앞에서 매번 시원한 박수를 짝짝짝 건네고 싶다. 소인배 말고 중인배 정도는 되어보고 싶다.
[830호 - think]
writer 이슬아 sullalee@naver.com 글과 만화를 연재한다. 「한겨레21」 칼럼 <연애인의 기쁨과 슬픔>, 레진코믹스 웹툰 <숏컷>, 케이코믹스 웹툰 <미미미마> 등을 연재했다. 현재 벅스뮤직에 웹툰 <슬짱의 말하기 듣기 쓰기>를 연재하고 있다.Illustrator 키미앤일이
#830호#830호 think#830호 대학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