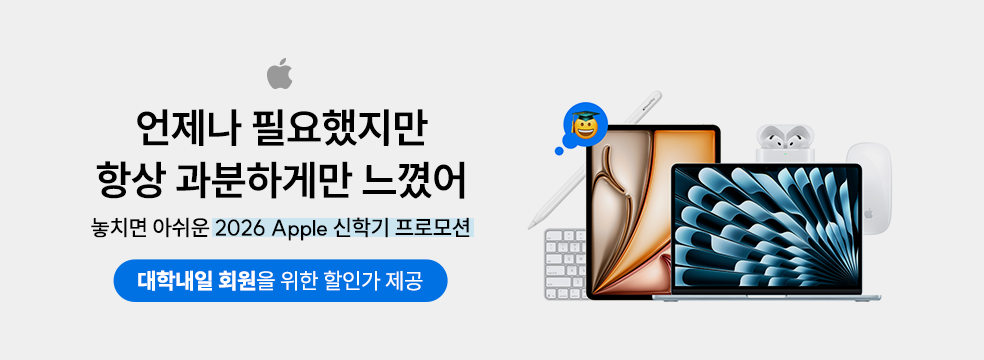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글의 소용
길지 않은 문장과 그걸 떠올리려는 나의 노력
어릴 때 할머니가 은행을 구워줬었다.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무 맛도 없고 구린내도 은은하게 났다. 씹으면 입안에서 밍그적거리면서 으깨졌기 때문에 동글동글 잘 빚은 똥을 씹는 느낌이었다. 몸에 좋다 좋다 먹어라 먹어라 하는 할머니의 성화에 알약 삼키듯이 ‘헙-’ 하고 삼켰었다.
마치 그때처럼 입속의 침과 공기를 숨이 꽉 막히게 헙 삼킬 때가 있다. 너와 관련된 것, 아니 관련까지도 아니고 ‘관’ 정도만 되는 게 떠올라도 그랬다. <생생정보통>에 너네 고향이 나와도 헙. 네가 은밀히 좋아하던 가수가 빵 떴을 때도 헙. 겨울에 계란빵을 볼 때도 헙. 홍대에서 헙. 사당에서 헙. 헙. 헙. 계속 헙. 호흡기에 무리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잘 때는 노래를 들었다. 귀에 뭐가 들리는 게 안 들릴 때보다 잡념이 덜했다. ‘좋은 노래다.’ ‘조용하고 따뜻하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자기가 부른 노래와 비슷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너랑 계속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끝엔 결국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며, 노래를 듣는 게 소용이 없어지던 밤들이었다.
하루는 내 앞에 나를 앉혀 놓고 뺨을 때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나름대로 나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로 때리진 못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철썩. 나는 이럴 자격도 없다. 철썩.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철썩. 상상 속의 나는 얼얼한 뺨을 잡고 대들었다.
나도 상처 받았다. 철썩. 상처 받는 데도 자격이 필요하냐. 철썩. 많은 거 안 바라고 한 번만 보고 싶다. 철썩. ……. 한 마디도 안 지는 스스로를 보며 생각했다. 나 자신을 벌하기란 이렇게 어렵구나. 대체로 그런 진부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글을 봤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길어야 한두 계절이었다. 사랑하지 못한 너를 탓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더 만났어야 한두 계절 더였을 거다.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침체된 피가 다시 흐르는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쓰다 버린 위로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이래서 글을 읽지.’ 나는 갈비뼈가 뻐근하도록 뿌듯해했다. 이후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헙-’ 했다가도 그 말만 생각하면 혈에 침을 놓은 것처럼 호흡이 돌아왔다. 이 문장만 있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그런 평안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긁으며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페북도 하고 인스타도 보고 하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드르르렁- 크르렁- 크흐르르릉- 흐르렁……’ . 이 무슨… 무슨 코 고는 소리지? 낮고 불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코를 안 곤다고 자꾸 우기던 너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네가 깨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끅끅 웃으며 녹음했었다. 결국 너에겐 못 들려줬으니 너는 아직도 네가 코를 안 고는 줄 알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알려줬을 지도. 나는 나의 주문을 생각해내야 했다.
‘길어야… 계절… 길어야…’ 발까지 쿵쿵 구르며 생각해보려 했다. 생각나라, 생각나. 그럴수록 무엇을 생각해내려는 것인지 가물가물해졌다. 길지 않은 문장과 그걸 떠올리려는 나의 노력은 큰 파도 같은 무언가에 멀리 떠내려갔다. 더러운 창으로 때가 탄 햇빛이 비췄다.
고등학생 때 많이 했던 것처럼 팔을 기역 자로 구부려 책상에 놓았다. 그 위로 얼굴을 숙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콧물 때문에 숨 막혀 하며 생각했다. ‘글은 참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마치 그때처럼 입속의 침과 공기를 숨이 꽉 막히게 헙 삼킬 때가 있다. 너와 관련된 것, 아니 관련까지도 아니고 ‘관’ 정도만 되는 게 떠올라도 그랬다. <생생정보통>에 너네 고향이 나와도 헙. 네가 은밀히 좋아하던 가수가 빵 떴을 때도 헙. 겨울에 계란빵을 볼 때도 헙. 홍대에서 헙. 사당에서 헙. 헙. 헙. 계속 헙. 호흡기에 무리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잘 때는 노래를 들었다. 귀에 뭐가 들리는 게 안 들릴 때보다 잡념이 덜했다. ‘좋은 노래다.’ ‘조용하고 따뜻하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자기가 부른 노래와 비슷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너랑 계속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끝엔 결국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며, 노래를 듣는 게 소용이 없어지던 밤들이었다.
하루는 내 앞에 나를 앉혀 놓고 뺨을 때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나름대로 나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로 때리진 못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철썩. 나는 이럴 자격도 없다. 철썩.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철썩. 상상 속의 나는 얼얼한 뺨을 잡고 대들었다.
나도 상처 받았다. 철썩. 상처 받는 데도 자격이 필요하냐. 철썩. 많은 거 안 바라고 한 번만 보고 싶다. 철썩. ……. 한 마디도 안 지는 스스로를 보며 생각했다. 나 자신을 벌하기란 이렇게 어렵구나. 대체로 그런 진부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글을 봤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길어야 한두 계절이었다. 사랑하지 못한 너를 탓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더 만났어야 한두 계절 더였을 거다.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침체된 피가 다시 흐르는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쓰다 버린 위로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이래서 글을 읽지.’ 나는 갈비뼈가 뻐근하도록 뿌듯해했다. 이후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헙-’ 했다가도 그 말만 생각하면 혈에 침을 놓은 것처럼 호흡이 돌아왔다. 이 문장만 있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그런 평안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긁으며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페북도 하고 인스타도 보고 하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드르르렁- 크르렁- 크흐르르릉- 흐르렁……’ . 이 무슨… 무슨 코 고는 소리지? 낮고 불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코를 안 곤다고 자꾸 우기던 너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네가 깨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끅끅 웃으며 녹음했었다. 결국 너에겐 못 들려줬으니 너는 아직도 네가 코를 안 고는 줄 알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알려줬을 지도. 나는 나의 주문을 생각해내야 했다.
‘길어야… 계절… 길어야…’ 발까지 쿵쿵 구르며 생각해보려 했다. 생각나라, 생각나. 그럴수록 무엇을 생각해내려는 것인지 가물가물해졌다. 길지 않은 문장과 그걸 떠올리려는 나의 노력은 큰 파도 같은 무언가에 멀리 떠내려갔다. 더러운 창으로 때가 탄 햇빛이 비췄다.
고등학생 때 많이 했던 것처럼 팔을 기역 자로 구부려 책상에 놓았다. 그 위로 얼굴을 숙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콧물 때문에 숨 막혀 하며 생각했다. ‘글은 참 아무 소용이 없구나.’
[830호 - 20's voice]
writer 빵떡씨 choihj906@naver.com
지금은 구운 은행 잘 먹어요.
#20's voice#20대 칼럼#8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