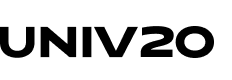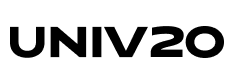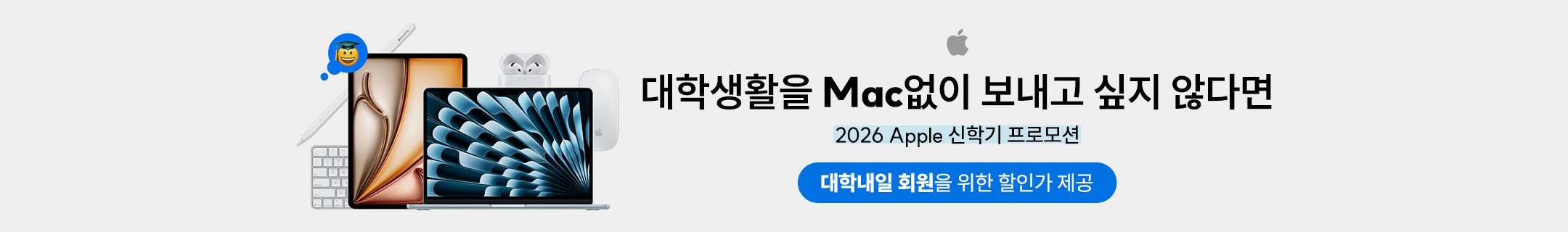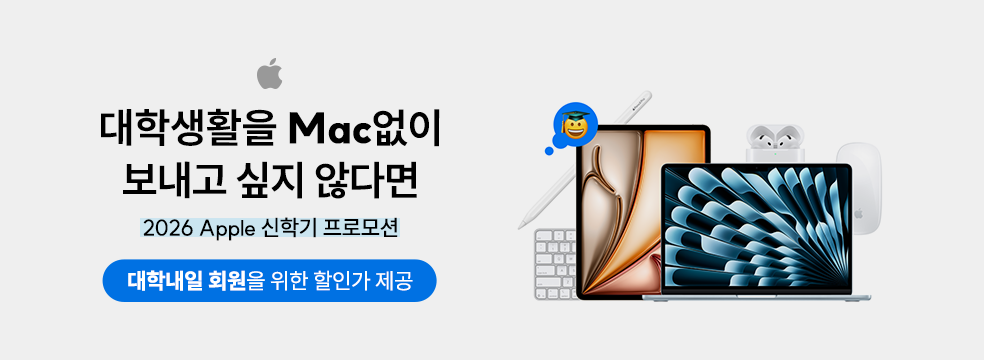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엄마의 등굣길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외로운 길을 걸었을까?
내가 만약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퍼즐을 맞춘다면, 아마 많은 조각들이 만원버스를 추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나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매일같이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그 6년의 등굣길에 버스는 만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30분 남짓의 등굣길마다 사람에 치여 땀에 젖은 채로 정류장에 내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지옥철’을 일주일에 몇 번씩 탄다. 바다 위의 나룻배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파에 이리저리 쓸려 다닐 때는 나도 모르게 천장을 보고 한숨짓는다. ‘다 때려치울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난 누군가의 등굣길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는다. 바로 엄마의 등굣길이다. 1971년 옥천 산골 외딴집 출신. 7남매 중 막내로 출생. 큰언니와는 27살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늦둥이. 금이야 옥이야 자랐을 것 같지만 의외로 거칠게 자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산길을 걸어서 등교한 것이다. 그것도 4시간을.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 한글도 다 깨치기 전, 엄마는 오래 걷는 법부터 배웠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5시에 집을 나섰다. 항상 지각의 마지노선인 9시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그러다 보니 지각도 잦았다.
그렇게 학교가 1시나 2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5~6시였다. 어쩌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라도 하고 집에 가면 9시 넘어서 도착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약 3년쯤 걸어 다녔을까, 걷는 것에 너무 질린 엄마는 약 보름 정도 학교를 빠졌다.
5시에 집에서 나온 후 학교로 안 가고 다른 곳에서 놀았다. 워낙 외진 동네라 딱히 놀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학교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았기에, 집 근처 산에서 놀다가 도시락을 까먹고 집에 갔다. 집에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결국 담임선생님은 출석부에 적힌 엄마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셨다.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던 담임선생님도 엄마 집에 다다랐을 때 생각이 바뀐 모양이다(엄마 집까지 걸어가셨다). 자신의 반에 이렇게 먼 길을 걸어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선생님은 엄마를 차마 혼내지 못했고, 자신은 집에 가서 몸살이 나고 말았다. 그 뒤로 그 선생님은 엄마가 가끔 늦거나 학교를 안 나와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 이 정도면 가히 등굣길의 전설이라 불릴 만하다.
그나마 중학생 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 다행이다. 중학생 때 그 시골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집은 없어졌고 터만 남아 있었다. 엄마가 다녔던 등굣길도 조금 걸어봤다. 말로만 들었던 그 길은 지금도 열악했다. 가로등도 없었고,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았다.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내뿜는 산의 음산한 기운이 정말로 무서웠다. 그저 재밌는 얘기로만 생각했었던 그 시절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엄마는 4시간을 걸어 다녔다. 심심함을 달래줄 핸드폰이나 MP3도 없었다.
여름에는 땡볕을 온몸으로 받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다녔고, 장마철에는 젖은 양말과 신발을 신은 채 우산 하나에 의지하여 걸어 다녔다. 겨울에는 해가 뜨지도 않은 깜깜한 길을 눈이 허리까지 와도, 발이 시려도 묵묵히 걸었다.
무엇보다 사시사철을 혼자 산길이 주는 불안함과 외로움을 벗 삼아 매일같이 그 흙길을 걸어 다녔다. 다시 현재로 와서, 나는 하굣길의 ‘지옥철’을 뚫고 집에 왔다. 등굣길의 피곤함, 수업의 피곤함, 하굣길의 피곤함을 안고 집에 왔다.
과제라는 짐도 덤으로 한 아름 안고 왔다. 집에 오자마자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머리맡의 노트북을 켠다. 그리고 아침에 떠올렸던 엄마의 등굣길을 마저 상상하기 시작한다.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외로운 길을 걸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엄마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힘들었던 것은 모두 잊은 채 나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엄마의 힘듦을 가늠해본다. 곧 잠에 들 것 같다. 꿈에서라도 그 시절의 엄마를 만나고 싶다. 고무신이 아닌 좋은 운동화를 신겨주고 그 산길을 같이 걷고 싶다. 외롭지 않게 말동무가 되어 주고 싶다. 불안하지 않도록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든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난 누군가의 등굣길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는다. 바로 엄마의 등굣길이다. 1971년 옥천 산골 외딴집 출신. 7남매 중 막내로 출생. 큰언니와는 27살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늦둥이. 금이야 옥이야 자랐을 것 같지만 의외로 거칠게 자랐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산길을 걸어서 등교한 것이다. 그것도 4시간을.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 한글도 다 깨치기 전, 엄마는 오래 걷는 법부터 배웠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5시에 집을 나섰다. 항상 지각의 마지노선인 9시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그러다 보니 지각도 잦았다.
그렇게 학교가 1시나 2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5~6시였다. 어쩌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라도 하고 집에 가면 9시 넘어서 도착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약 3년쯤 걸어 다녔을까, 걷는 것에 너무 질린 엄마는 약 보름 정도 학교를 빠졌다.
5시에 집에서 나온 후 학교로 안 가고 다른 곳에서 놀았다. 워낙 외진 동네라 딱히 놀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학교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았기에, 집 근처 산에서 놀다가 도시락을 까먹고 집에 갔다. 집에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결국 담임선생님은 출석부에 적힌 엄마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셨다.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던 담임선생님도 엄마 집에 다다랐을 때 생각이 바뀐 모양이다(엄마 집까지 걸어가셨다). 자신의 반에 이렇게 먼 길을 걸어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선생님은 엄마를 차마 혼내지 못했고, 자신은 집에 가서 몸살이 나고 말았다. 그 뒤로 그 선생님은 엄마가 가끔 늦거나 학교를 안 나와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 이 정도면 가히 등굣길의 전설이라 불릴 만하다.
그나마 중학생 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 다행이다. 중학생 때 그 시골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집은 없어졌고 터만 남아 있었다. 엄마가 다녔던 등굣길도 조금 걸어봤다. 말로만 들었던 그 길은 지금도 열악했다. 가로등도 없었고,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았다.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내뿜는 산의 음산한 기운이 정말로 무서웠다. 그저 재밌는 얘기로만 생각했었던 그 시절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엄마는 4시간을 걸어 다녔다. 심심함을 달래줄 핸드폰이나 MP3도 없었다.
여름에는 땡볕을 온몸으로 받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다녔고, 장마철에는 젖은 양말과 신발을 신은 채 우산 하나에 의지하여 걸어 다녔다. 겨울에는 해가 뜨지도 않은 깜깜한 길을 눈이 허리까지 와도, 발이 시려도 묵묵히 걸었다.
무엇보다 사시사철을 혼자 산길이 주는 불안함과 외로움을 벗 삼아 매일같이 그 흙길을 걸어 다녔다. 다시 현재로 와서, 나는 하굣길의 ‘지옥철’을 뚫고 집에 왔다. 등굣길의 피곤함, 수업의 피곤함, 하굣길의 피곤함을 안고 집에 왔다.
과제라는 짐도 덤으로 한 아름 안고 왔다. 집에 오자마자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머리맡의 노트북을 켠다. 그리고 아침에 떠올렸던 엄마의 등굣길을 마저 상상하기 시작한다.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외로운 길을 걸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엄마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힘들었던 것은 모두 잊은 채 나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엄마의 힘듦을 가늠해본다. 곧 잠에 들 것 같다. 꿈에서라도 그 시절의 엄마를 만나고 싶다. 고무신이 아닌 좋은 운동화를 신겨주고 그 산길을 같이 걷고 싶다. 외롭지 않게 말동무가 되어 주고 싶다. 불안하지 않도록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든다.
[831호 - 20's voice]
writer 이준호 l9495561@daum.net
아직 만으로는 19살인 대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20's voice#20대 칼럼#8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