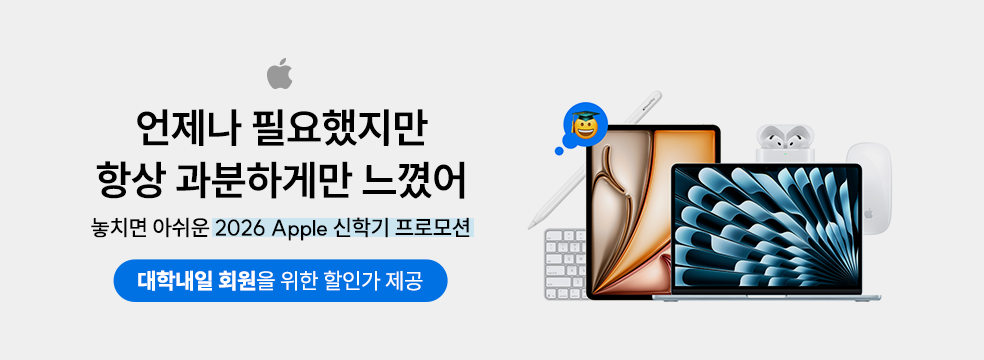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서편제>
살아가기 위한 ‘앓는 소리’
살다 보면 살아진다고? 꼰대질에 익숙한 우리에겐 얼핏 으름장처럼 들린다. “그저 (꾹 참고) 살다 보면 (다들 그런 것처럼) 살아진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앓는 소리 하지 말거라)” 어림없다. 그렇게 살다가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걸?
이 피곤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앓는 소리’다. 하다못해 야자 시간에 떠들다 걸려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을 때도 ‘아야!’ 엄살을 떨어야 덜 아프다. 때리는 사람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고. 앓는 소리 내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수다를 떨어도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드라마 몇 시즌을 정주행해야 숨통 트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스튜핏’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새 신발을 질러야 화병이 가라앉고, 다음 날 숙취로 고생할 걸 알아도 2차 3차까지 달려줘야 비로소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뮤지컬 <서편제>의 넘버 ‘살다 보면’을 들으면 삐딱하던 마음이 누그러진다. ‘송화’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쓰럽다. 일찍 어머니를 잃었고, 정든 동생과 헤어졌고, 명창을 만들겠다는 욕심에 눈먼 아버지 때문에 진짜 앞을 못 보게 된다.
한(恨)이 없다면 이상할 인생을 살았던 송화에게 ‘앓는 소리’ 낼 여력이나 있었을까. 앓는 소리 대신, 송화에겐 어릴 때부터 주문처럼 중얼거리던 말이 있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의지할 곳 없던 송화는 이 말을 방패막 삼아 모진 삶을 버텼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고? 미안하지만 송화가 건네는 말이라 해도 여전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살다가 불만이 생기면 곧장 따질 거다. 한참 걷다가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다른 길을 찾을 거다. 흐르는 바람에 몸을 맡기기는 싫다. 그저 살지 않겠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성의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그러다 좀 지치면 잠시 멈춰 쉬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 다만 휴식을 마치고 다시 한 발 내디딜 때, 문득 두려워질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송화의 주문을 빌려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이 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 꼰대 냄새만 풍겨도 삐딱해지는 사람
- 꼰대 냄새만 풍겨도 삐딱해지는 사람
이 피곤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앓는 소리’다. 하다못해 야자 시간에 떠들다 걸려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을 때도 ‘아야!’ 엄살을 떨어야 덜 아프다. 때리는 사람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고. 앓는 소리 내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수다를 떨어도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드라마 몇 시즌을 정주행해야 숨통 트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스튜핏’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새 신발을 질러야 화병이 가라앉고, 다음 날 숙취로 고생할 걸 알아도 2차 3차까지 달려줘야 비로소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뮤지컬 <서편제>의 넘버 ‘살다 보면’을 들으면 삐딱하던 마음이 누그러진다. ‘송화’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쓰럽다. 일찍 어머니를 잃었고, 정든 동생과 헤어졌고, 명창을 만들겠다는 욕심에 눈먼 아버지 때문에 진짜 앞을 못 보게 된다.
한(恨)이 없다면 이상할 인생을 살았던 송화에게 ‘앓는 소리’ 낼 여력이나 있었을까. 앓는 소리 대신, 송화에겐 어릴 때부터 주문처럼 중얼거리던 말이 있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의지할 곳 없던 송화는 이 말을 방패막 삼아 모진 삶을 버텼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고? 미안하지만 송화가 건네는 말이라 해도 여전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살다가 불만이 생기면 곧장 따질 거다. 한참 걷다가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다른 길을 찾을 거다. 흐르는 바람에 몸을 맡기기는 싫다. 그저 살지 않겠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성의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그러다 좀 지치면 잠시 멈춰 쉬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 다만 휴식을 마치고 다시 한 발 내디딜 때, 문득 두려워질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송화의 주문을 빌려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그저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이 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 꼰대 냄새만 풍겨도 삐딱해지는 사람
- 꼰대 냄새만 풍겨도 삐딱해지는 사람[832호 - Weekly culture]
#832호#832호 weekly culture#832호 대학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