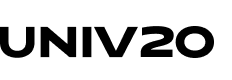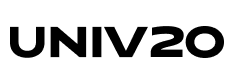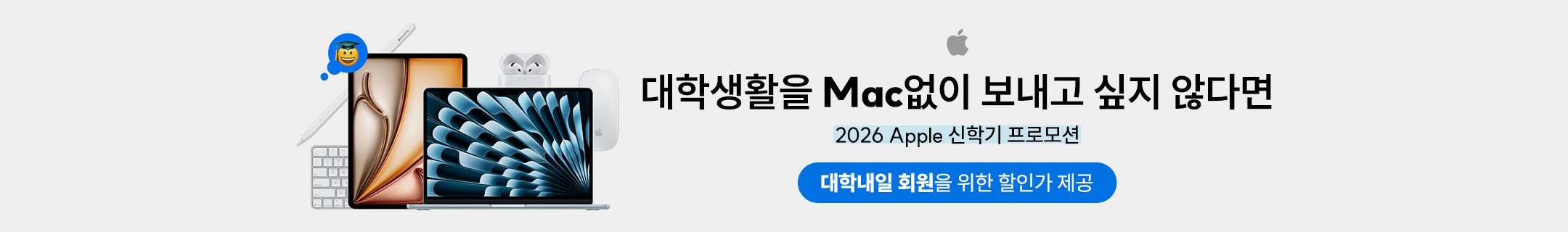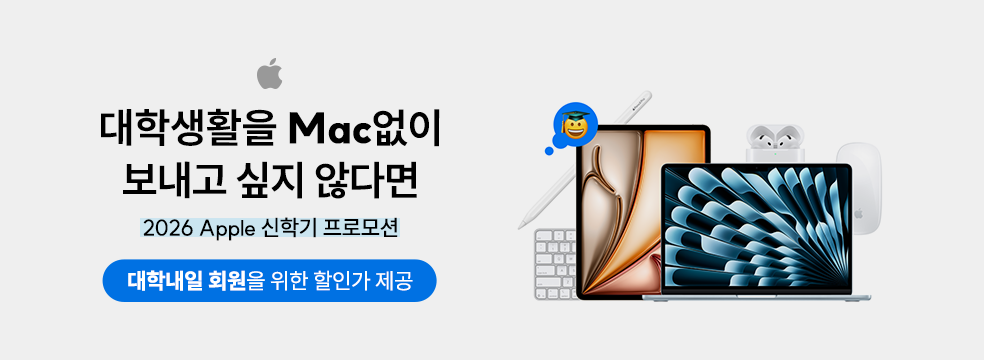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이번 생은 처음이라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요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 대학에 들어와서 수험생이 됐다
세금을 너무 내고 싶은 거 있지. 그냥 남들처럼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아서 저축도 하고, 세금도 내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이야. 저녁은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이후엔 악기를 배운다든가 스쿼시 같은 운동을 다닌다든가. 가끔 어디론가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퇴근 후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삶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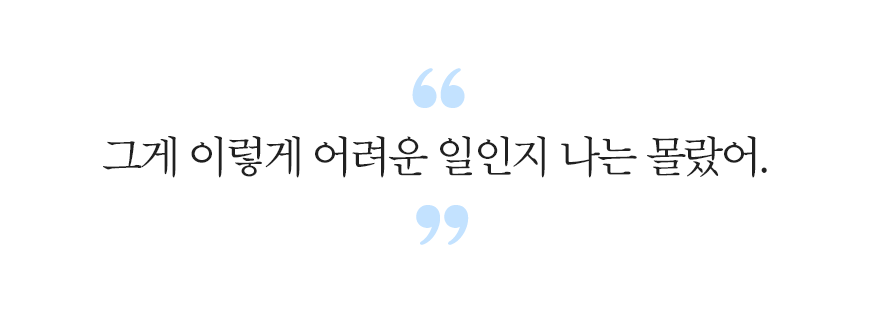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나는 몰랐어. 3학년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 인문계 출신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나는 이렇다 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거야. 그제야 왜 사람들이 ‘문송하다’고 말하는지 알겠더라.
불안함에 무작정 휴학 신청을 해놓고 보니 ‘더 늦기 전에 수능이나 다시 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공대나 의약학 전공이면 취업 걱정이 훨씬 덜할 텐데 싶더라고. 이렇게 답이 없는 고민만 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뭐라도 시작해보자는 결심이 섰어. 그렇게 수능을 다시 보기로 했어. 3학년 때였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수험생 생활 다시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공부만 하는 삶, 밥 먹을 때가 아니고는 움직일 일이 크게 없는 삶,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삶….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어. 1년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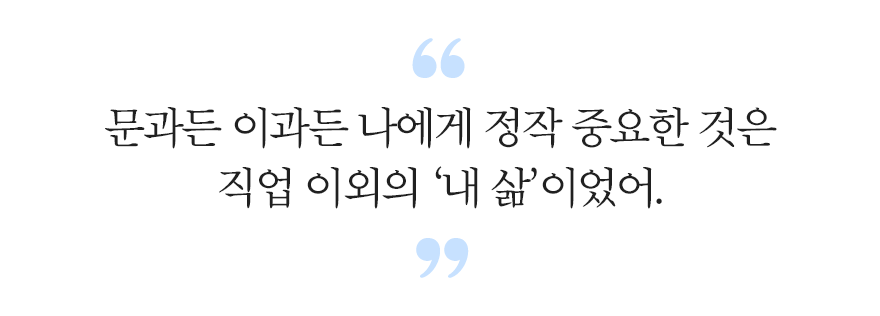
복학을 앞두고 보니 난 여전히 제자리인 거야. 1년을 그냥 날려버린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문과든 이과든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직업 이외의 ‘내 삶’이었어. 내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내야 하는 피로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 일 때문에 가족이고 생활이고 하나도 못 챙기는 삶은 더더욱.
공무원 준비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는 좀 의아해하더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냐는 둥, 좋은 학교 나와서 왜 공무원 준비를 하냐는 둥…. 그도 그럴 게 온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꿈을 이루라’고 입 아프도록 얘기하니까, 20대라면 마땅히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꿈을 품어야 할 것 같잖아. 남들과는 다르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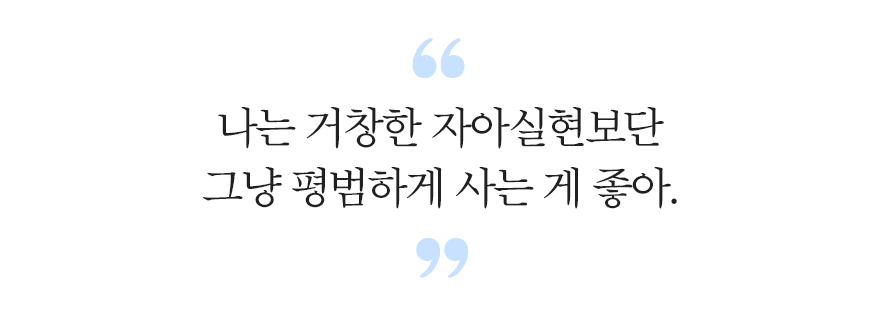
그러니 공시생들은 야망이나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지. 사실 학교 다닐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괜히 자괴감 들 때도 많았어. 나는 이 전공에 재능이 없거나, 아님 열정이 없나 보다 하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게 어때서?’ 나는 거창한 자아실현보단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늦기 전에 얼른 안착해서 가정도 꾸리고, 일하면서 아이도 직접 키우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퇴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없냐고? 이게 내가 바라는 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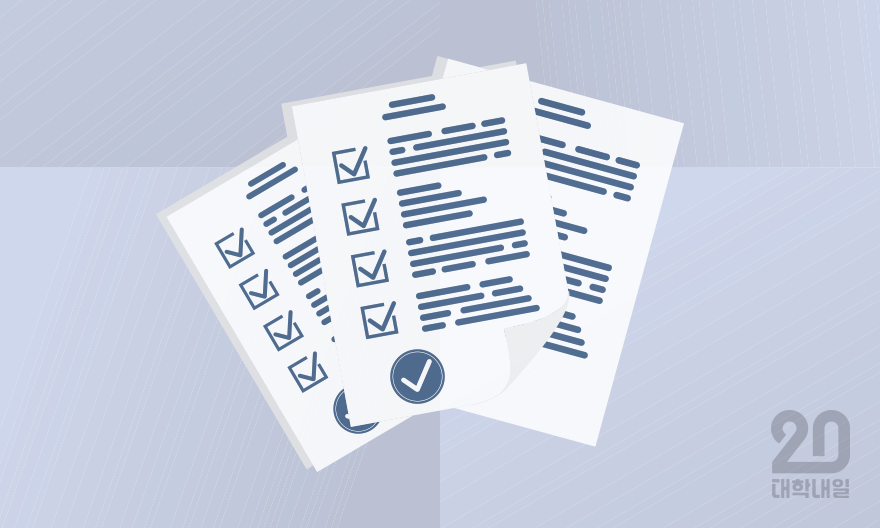
# 아무것도 포기한 적 없는데 삼포세대라니
본격적으로 노량진에서 공부를 시작했어. 처음엔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더라. 언젠가 공시 경쟁률의 대부분은 ‘허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다들 정말 열심히 해. 학원 오가면서 교재 보고, 복도에 걸터앉아 밥 먹고. 강의실에서는 매번 자리 경쟁 때문에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어.
한 강의실에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뒤쪽은 강사가 안 보여서 스크린을 볼 수밖에 없거든.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도 7시부터 자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앞자리엔 영영 못 앉는 거야. 나는 첫날 8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이미 다 꽉 차 있어서 맨 뒷줄에서 들어야 했지. 그것 말고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아. 학원에선 매번 책 관리 잘하라고 신신당부해.
책상에 그냥 올려두거나 자물쇠 안 채워두면 훔쳐간다고. 실제로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강의실에 와서는 “어제 ◯◯책 훔쳐간 사람 CCTV에 다 찍혔으니까 자수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뒤로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챙겨서 나가야 했는데…. 좀 살벌하지?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할 수밖에 없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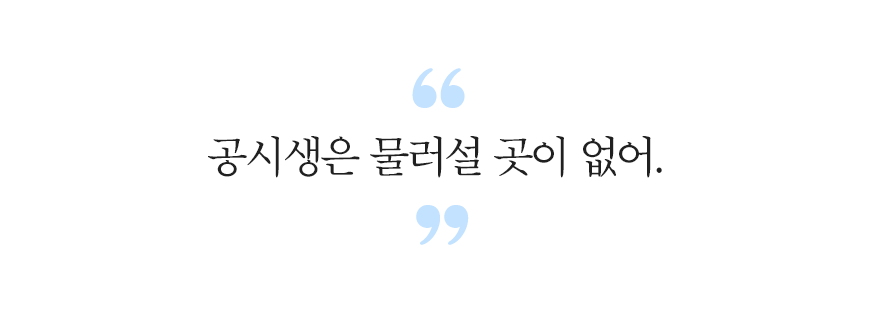
공시생은 물러설 곳이 없어. 무조건 합/불이라는 결과밖에 남지 않으니까 플랜 B가 없는 거야. 1점 차든 2점 차든 떨어지면 그냥 끝, 1년을 더 준비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에 내몰려. 과정은 의미가 없고 결과만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체력이고 자존감이고 고갈되는 거 정말 한순간인 거지. 얼마 전에 시험을 쳤어. 수능도 다시 친 사람인데, 이건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더라.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공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교재 가장자리에 나온 작은 글씨들, 숫자들을 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1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도 이 좁은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몇 만 명이나 몰려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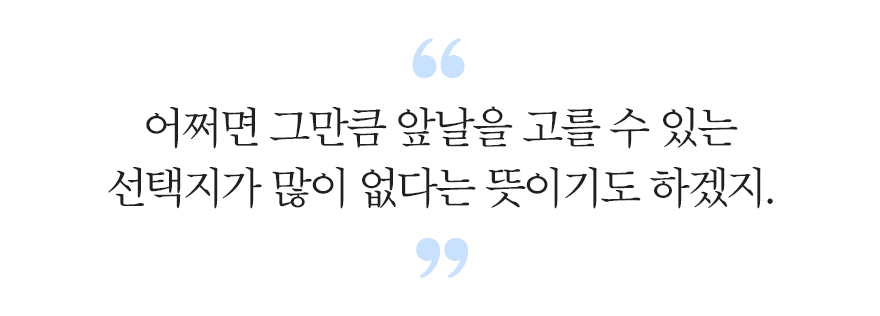
어쩌면 그만큼 앞날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이젠 집에서도 슬슬 눈치가 보인다는 게 문제야. 나이 압박도 계속 커지고. 주변에서는 졸업은 안하고 언제까지 공부만 하냐, 요즘 학생들은 공무원 좋다니까 남들 하는 거 우르르 따라서 한다, 걱정인지 참견인지 모를 말들을 해. 사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러는 당신이 한번 해보든가!’라고 말하고 싶더라.
합격이 아니면 의미 없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몇 년간 악을 쓰는 모습을 직접 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할걸. 나는 담대한 꿈이나 이상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정시 퇴근 하는거,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임신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일하면서 눈치 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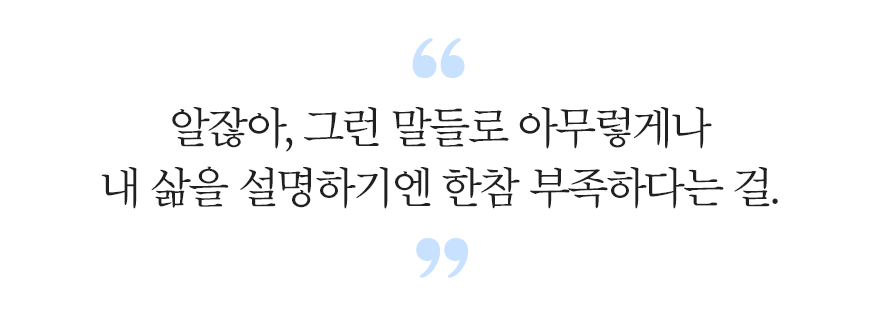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이 사회에선 그게 공무원이 아니면 꿈꿀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인데 삼포세대라느니, 의지가 없다느니…. 알잖아, 그런 말들로 아무렇게나 내 삶을 설명하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걸.
세금을 너무 내고 싶은 거 있지. 그냥 남들처럼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아서 저축도 하고, 세금도 내는 그런 평범한 삶 말이야. 저녁은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이후엔 악기를 배운다든가 스쿼시 같은 운동을 다닌다든가. 가끔 어디론가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퇴근 후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삶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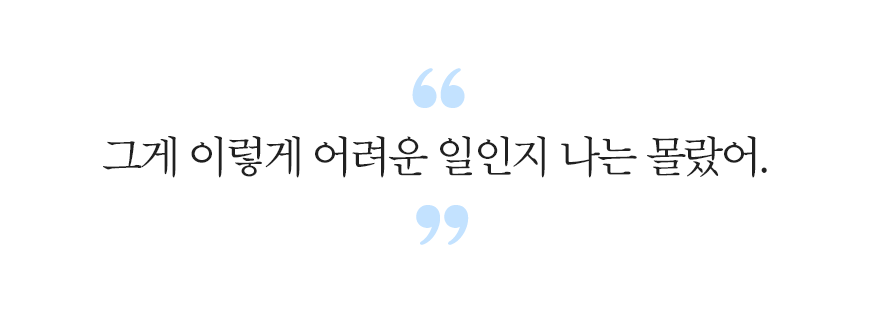
불안함에 무작정 휴학 신청을 해놓고 보니 ‘더 늦기 전에 수능이나 다시 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공대나 의약학 전공이면 취업 걱정이 훨씬 덜할 텐데 싶더라고. 이렇게 답이 없는 고민만 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뭐라도 시작해보자는 결심이 섰어. 그렇게 수능을 다시 보기로 했어. 3학년 때였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수험생 생활 다시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공부만 하는 삶, 밥 먹을 때가 아니고는 움직일 일이 크게 없는 삶,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삶….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어. 1년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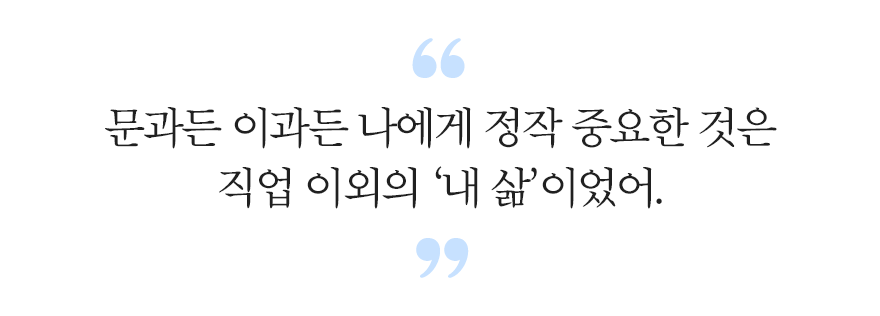
복학을 앞두고 보니 난 여전히 제자리인 거야. 1년을 그냥 날려버린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문과든 이과든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직업 이외의 ‘내 삶’이었어. 내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내야 하는 피로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 일 때문에 가족이고 생활이고 하나도 못 챙기는 삶은 더더욱.
공무원 준비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는 좀 의아해하더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냐는 둥, 좋은 학교 나와서 왜 공무원 준비를 하냐는 둥…. 그도 그럴 게 온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꿈을 이루라’고 입 아프도록 얘기하니까, 20대라면 마땅히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꿈을 품어야 할 것 같잖아. 남들과는 다르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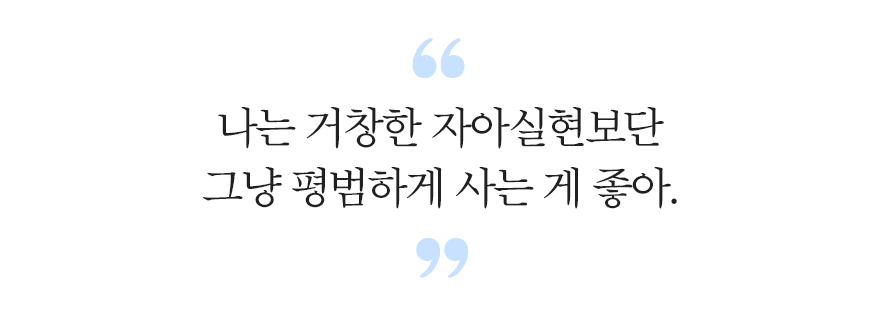
그러니 공시생들은 야망이나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지. 사실 학교 다닐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괜히 자괴감 들 때도 많았어. 나는 이 전공에 재능이 없거나, 아님 열정이 없나 보다 하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게 어때서?’ 나는 거창한 자아실현보단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늦기 전에 얼른 안착해서 가정도 꾸리고, 일하면서 아이도 직접 키우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퇴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없냐고? 이게 내가 바라는 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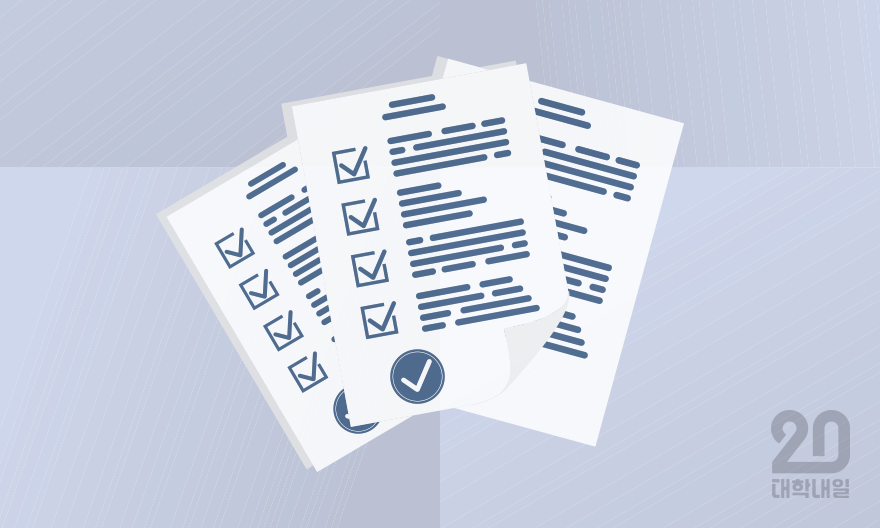
# 아무것도 포기한 적 없는데 삼포세대라니
본격적으로 노량진에서 공부를 시작했어. 처음엔 삭막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더라. 언젠가 공시 경쟁률의 대부분은 ‘허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다들 정말 열심히 해. 학원 오가면서 교재 보고, 복도에 걸터앉아 밥 먹고. 강의실에서는 매번 자리 경쟁 때문에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어.
한 강의실에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뒤쪽은 강사가 안 보여서 스크린을 볼 수밖에 없거든.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도 7시부터 자리를 사수하지 않으면 앞자리엔 영영 못 앉는 거야. 나는 첫날 8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이미 다 꽉 차 있어서 맨 뒷줄에서 들어야 했지. 그것 말고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아. 학원에선 매번 책 관리 잘하라고 신신당부해.
책상에 그냥 올려두거나 자물쇠 안 채워두면 훔쳐간다고. 실제로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강의실에 와서는 “어제 ◯◯책 훔쳐간 사람 CCTV에 다 찍혔으니까 자수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뒤로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챙겨서 나가야 했는데…. 좀 살벌하지?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할 수밖에 없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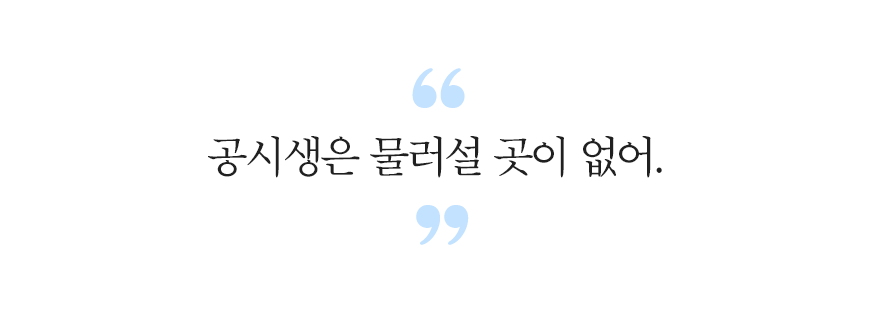
공시생은 물러설 곳이 없어. 무조건 합/불이라는 결과밖에 남지 않으니까 플랜 B가 없는 거야. 1점 차든 2점 차든 떨어지면 그냥 끝, 1년을 더 준비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에 내몰려. 과정은 의미가 없고 결과만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체력이고 자존감이고 고갈되는 거 정말 한순간인 거지. 얼마 전에 시험을 쳤어. 수능도 다시 친 사람인데, 이건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더라.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공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교재 가장자리에 나온 작은 글씨들, 숫자들을 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 1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도 이 좁은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몇 만 명이나 몰려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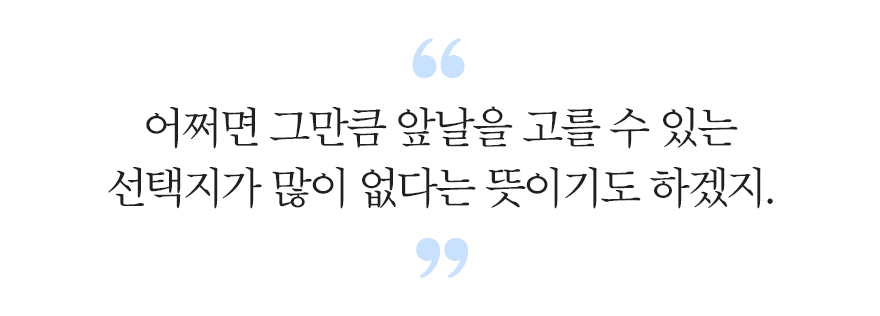
합격이 아니면 의미 없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몇 년간 악을 쓰는 모습을 직접 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할걸. 나는 담대한 꿈이나 이상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정시 퇴근 하는거,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임신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일하면서 눈치 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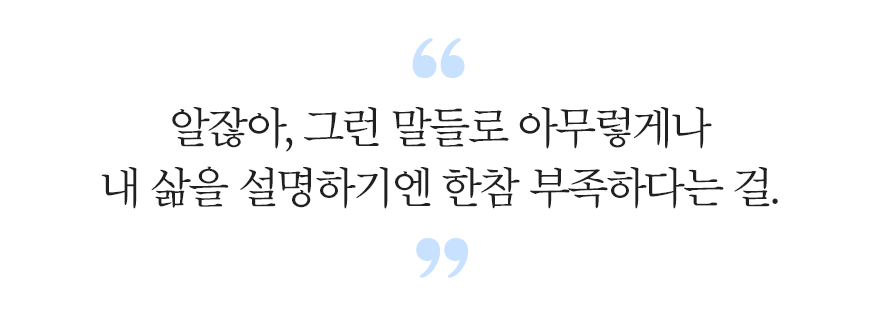
[837호 - 20's ㅇㄱㄹㅇ]
Intern 김영화 movie@univ.me Interviewee 정세영(가명) 2년차 공시생 정세영씨(가명)와의 인터뷰를 인턴 에디터가 옮겨 적었습니다.
#20's ㅇㄱㄹㅇ#20대 인터뷰#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