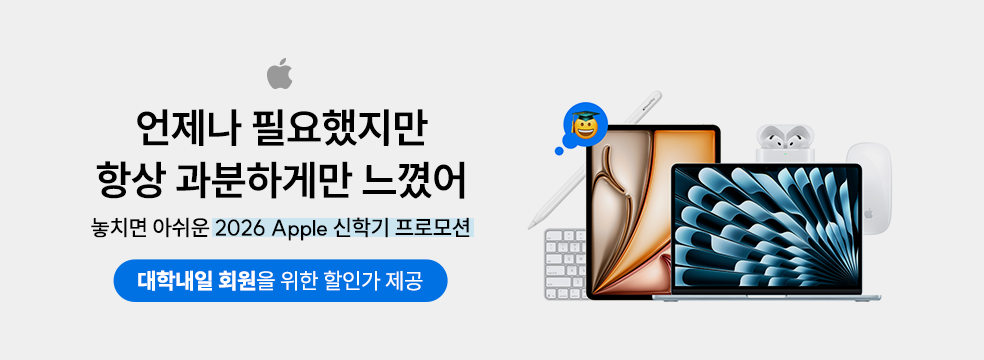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북반구의 시드니에서
남들 다 간다는 워홀
시드니에서 산 지 반년이 다 돼간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하다. 익숙해서 반갑고 새로워서 신기하던 풍경들도 시들해진 지 오래, 요즘 나의 하루는 어제의 끝없는 반복이다. 시시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것. 그게 하루 내용의 전부다.
책도 읽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고, 따라서 약속도 없다. 오고 가며 스치는 타인의 삶을 멀찍이서 일별하는 게 나와 세상이 맺는 관계의 전부다. 투명한 상자 속에 갇힌 기분이다. 제각각의 표정을 한 타인들은 어쨌거나 움직인다. 분주하거나 느릿하게, 걷거나 달린다.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
종종 질투가 난다. 속에서 끓어오른 질투는 식으면서 열등감으로 변한다. 끈적거리는 액체처럼 온몸에 달라붙어 손발을 묶고 시야를 가린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글을 쓰기도, 남의 글을 읽기도 두렵다. 부끄럽다.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 대학가 원룸 ‘시드니’ 말고 남반구의 진짜 시드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온 뒤로 모든 게 변했다.
어린 시절에 이미 몇 년의 시간을 보낸 시드니는 내게 익숙한 도시였다. 거기서 다시 1년 반을 살게 된 건 순전히 경솔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같이 워홀 가면 재밌겠다”고, 우울해하던 여자 친구에게 빈말처럼 던진 그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낙향해 백화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여자친구는 퇴근 후에 영어 학원까지 다녀가며 워홀 준비를 시작했다.
그걸 본 이상 말을 물릴 수는 없었다. 더구나 나도 반 정도는 진심이었으니. 같이 워홀가면 재미‘는’ 있겠다, 정도로 소극적인 것이긴 했지만. 예상대로 시드니는 재밌었다. 나는 주택 안팎을 칠하는 페인트 일을 했다. 백인 중산층 가정이 주 고객이었다. 난생처음 하는 육체노동은 그 자체로 보람차고 유익했다. 주말엔 서핑을 했다. 웨트슈트를 넣은 백팩과 케이스 안에 든 쇼트보드를 매고 전철에 탄 다음, 파도 차트를 보고 그날의 목적지를 정하곤 했다.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파도가 좋지 않으면 집에서 드라마를 봤다. 평일엔 말할 것도 없었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다 잠들었다. 책도 읽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친구도 약속도 없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적어도 내 삶의 패턴은 아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페인트칠이 학교 수업으로 바뀌었지만 빈지워칭이 중심에 놓인 나의 하루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단지 그때와 지금 뿐인가.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언제나 게을렀고, 항상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뭔가를 보고 있었다. 시시하긴 해도 나는 그런 삶이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귀국 직후, 엄마가 미리 계약해둔 원룸 ‘시드니’로 이사함과 동시에 나는 돌연 불안과 외로움과 지독한 열등감에 휩싸인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실은 뻔한 이유에서였다.
내 삶에서 바뀐 게 하나 더 있다. 남반구의 시드니에서 북반구의 시드니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졸업까지 30학점 남은 스물여덟의 대학생이 돼 있었다. 떠날 때 스물일곱이었으니 고작 한 살 더 먹었을 뿐인데, 디지털 세상이라 그런지 ‘1’의 차이가 엄청나다. 남들 다 간다는 워홀, 남들 다 한다는 갭이어인 줄 알았는데 그 갭이 협곡이었을 줄이야.
이제 나이 얘기를 진전시켜야겠지만 글을 닫을 때가 돼서 그럴 수가 없다. 사실 일부러 뒤늦게 얘기를 꺼냈다. 나이 앞에서 난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다. 누구도 나이를 들먹여 나를 옥죄지 않는데도 숨이 막힌다. 이 숨 막힘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겠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느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느니 하는 성공한 자들의 수상 소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다못해 ‘컴활’ 자격증이라도 준비하는 게 어쩌면 최선이라는 것도. 그러나 여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오늘도 관성처럼 드라마를 본다. 난 이미 잔뜩 쫄았다.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마스터 오브 제로>만 끝내면 뭐라도 해봐야겠다. 아니면 넷플릭스 구독이 끝나는 이달 말이 지나면…. 아니면 다음 달까지만 보고 새해가 되면… 젠장.
책도 읽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고, 따라서 약속도 없다. 오고 가며 스치는 타인의 삶을 멀찍이서 일별하는 게 나와 세상이 맺는 관계의 전부다. 투명한 상자 속에 갇힌 기분이다. 제각각의 표정을 한 타인들은 어쨌거나 움직인다. 분주하거나 느릿하게, 걷거나 달린다.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
종종 질투가 난다. 속에서 끓어오른 질투는 식으면서 열등감으로 변한다. 끈적거리는 액체처럼 온몸에 달라붙어 손발을 묶고 시야를 가린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글을 쓰기도, 남의 글을 읽기도 두렵다. 부끄럽다.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 대학가 원룸 ‘시드니’ 말고 남반구의 진짜 시드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온 뒤로 모든 게 변했다.
어린 시절에 이미 몇 년의 시간을 보낸 시드니는 내게 익숙한 도시였다. 거기서 다시 1년 반을 살게 된 건 순전히 경솔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같이 워홀 가면 재밌겠다”고, 우울해하던 여자 친구에게 빈말처럼 던진 그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낙향해 백화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여자친구는 퇴근 후에 영어 학원까지 다녀가며 워홀 준비를 시작했다.
그걸 본 이상 말을 물릴 수는 없었다. 더구나 나도 반 정도는 진심이었으니. 같이 워홀가면 재미‘는’ 있겠다, 정도로 소극적인 것이긴 했지만. 예상대로 시드니는 재밌었다. 나는 주택 안팎을 칠하는 페인트 일을 했다. 백인 중산층 가정이 주 고객이었다. 난생처음 하는 육체노동은 그 자체로 보람차고 유익했다. 주말엔 서핑을 했다. 웨트슈트를 넣은 백팩과 케이스 안에 든 쇼트보드를 매고 전철에 탄 다음, 파도 차트를 보고 그날의 목적지를 정하곤 했다.

단지 그때와 지금 뿐인가.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언제나 게을렀고, 항상 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뭔가를 보고 있었다. 시시하긴 해도 나는 그런 삶이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귀국 직후, 엄마가 미리 계약해둔 원룸 ‘시드니’로 이사함과 동시에 나는 돌연 불안과 외로움과 지독한 열등감에 휩싸인 무기력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실은 뻔한 이유에서였다.
내 삶에서 바뀐 게 하나 더 있다. 남반구의 시드니에서 북반구의 시드니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졸업까지 30학점 남은 스물여덟의 대학생이 돼 있었다. 떠날 때 스물일곱이었으니 고작 한 살 더 먹었을 뿐인데, 디지털 세상이라 그런지 ‘1’의 차이가 엄청나다. 남들 다 간다는 워홀, 남들 다 한다는 갭이어인 줄 알았는데 그 갭이 협곡이었을 줄이야.
이제 나이 얘기를 진전시켜야겠지만 글을 닫을 때가 돼서 그럴 수가 없다. 사실 일부러 뒤늦게 얘기를 꺼냈다. 나이 앞에서 난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다. 누구도 나이를 들먹여 나를 옥죄지 않는데도 숨이 막힌다. 이 숨 막힘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겠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느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느니 하는 성공한 자들의 수상 소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다못해 ‘컴활’ 자격증이라도 준비하는 게 어쩌면 최선이라는 것도. 그러나 여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오늘도 관성처럼 드라마를 본다. 난 이미 잔뜩 쫄았다.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마스터 오브 제로>만 끝내면 뭐라도 해봐야겠다. 아니면 넷플릭스 구독이 끝나는 이달 말이 지나면…. 아니면 다음 달까지만 보고 새해가 되면… 젠장.
[837호 - 20's voice]
writer 류새힘 shamedonut@gmail.com살려주세요….
#20's voice#20대 에세이#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