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일
<나는 이렇게 망했다> ③ 수업 망함
이름만 보고 강의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문제의 발단은 귀찮음이었을까 허세였을까. 아마 그 둘의 찰떡 같은 콜라보가 이뤄낸 성과였을 것이다. 나는 신입생 때 많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데 연연하는 이상한 취미가 있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유로움을 연출했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신중한 얼굴로 “귀찮다”고 해버리곤 ‘방금 좀 멋있었다’고 뿌듯해하는 이상한 취향.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줄곧 그런 태도였다. 이 강의가 꿀강인가요, 저 강의가 학점을 잘 주나요 같은 걸 묻는 건 참 멋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드르륵드르륵 굴리며 차분히 강의명을 훑어보고 그중 제일 멋있는 이름을 픽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론’이라든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같은 강의를 발견하면 그 멋짐에 잠시 아찔해하다 떨리는 손으로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곤 했다. 그러다 듣게 된 강의가 ‘내러티브 구조의 이해’였다. 연극영화나 문예창작 전공의 예술 동지들이 많았다. 강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대충 멋있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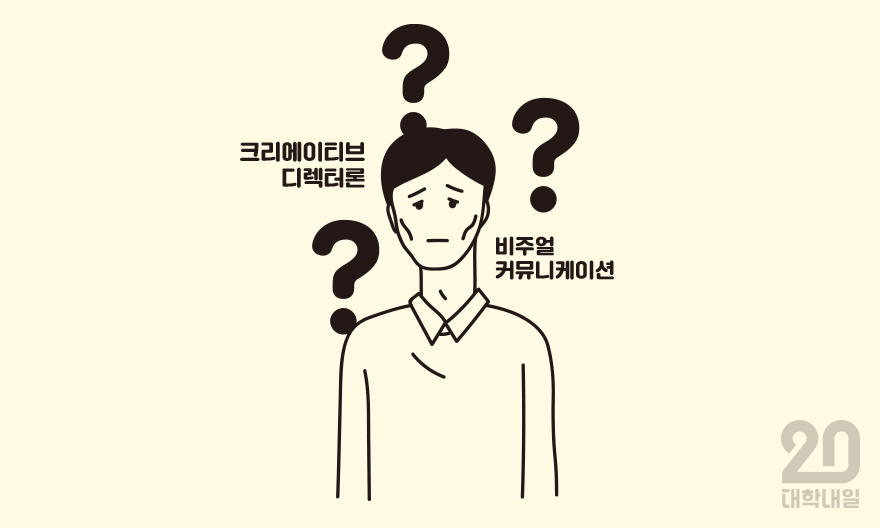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마시는 것처럼, 강의에서 수업을 들었다기보다 예술적 느낌을 들었다. 대강 만족하면서 강의를 듣던 중 첫 과제를 받았다. ‘네러티브에 대한 감상을 비주얼로 표현하시오.’ 오늘 아침에 싼 똥을 팬톤 컬러로 표현하라는 요구만큼 난감했다.
그 과제를 받았을 때 X됐다는 걸 감지했어야 했다. 동기는 아연실색한 내게 조언을 했다. “아무거나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 말이었지만 그땐 꽤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만들었다.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 봤다면 “우리 코딱지들~ 정말 코딱지 같은 걸 만들었네요~”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과제 발표날이 됐다. 예술 동지들의 열띤 발표가 이어졌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거나 만들어온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나는 약간 울컥하는 심정이 됐다.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던 동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죽빵을 날리리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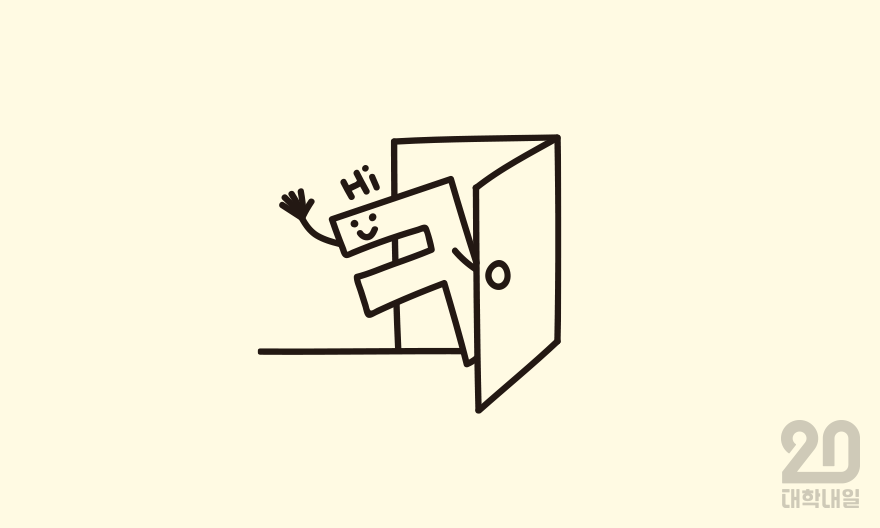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내 차례가 됐다. 예술 동지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발표를 시작했다. 5분 정도 열심히 이빨을 털었다. 잘 털고 있는데….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표현한 부부느흐…ㅎ…히…ㅎ” 갑자기 현타가 온 것이다.
10분 만에 완성한 과제와… 거기에 추상이니 의미니… 하는 말을 욱여맞추는 나와… 그걸 경청하는 사람들… 특히 그 경청… 좀 대충 듣지… 왜들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사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시 떠올려도 빈혈기가 도는 것 같다. 장내는 술렁였고 예술 동지들은 ‘웃기다’와 ‘웃어도 되는가’ 사이에서 치열하게 번뇌하다 하나둘 피식거리기 시작했다.
난 겉으론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속으론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창밖의 벚꽃처럼 흩날려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여기까지가 내 치욕의 역사다. 이후에도 많은 걸 귀찮아하고 있지만 이제 이름만 보고 강의를 선택하진 않는다. 특히 어떤 과제를 주는지는 꼭 알아보는 편이다. 모두 나를 타산지석 삼아 좋은 수강 신청 하시길 바란다.
빵떡씨 / 사실 전공도 이름 보고 정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신중한 얼굴로 “귀찮다”고 해버리곤 ‘방금 좀 멋있었다’고 뿌듯해하는 이상한 취향.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줄곧 그런 태도였다. 이 강의가 꿀강인가요, 저 강의가 학점을 잘 주나요 같은 걸 묻는 건 참 멋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드르륵드르륵 굴리며 차분히 강의명을 훑어보고 그중 제일 멋있는 이름을 픽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론’이라든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같은 강의를 발견하면 그 멋짐에 잠시 아찔해하다 떨리는 손으로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곤 했다. 그러다 듣게 된 강의가 ‘내러티브 구조의 이해’였다. 연극영화나 문예창작 전공의 예술 동지들이 많았다. 강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대충 멋있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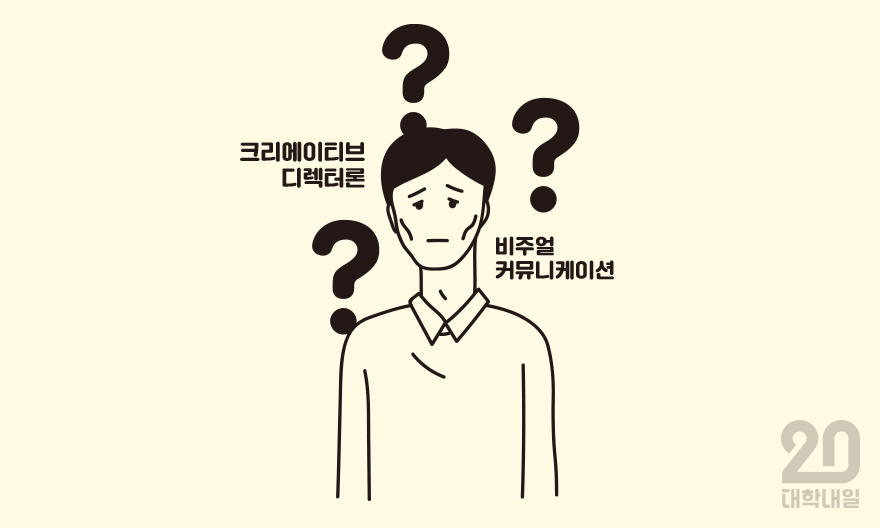
그 과제를 받았을 때 X됐다는 걸 감지했어야 했다. 동기는 아연실색한 내게 조언을 했다. “아무거나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 말이었지만 그땐 꽤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만들었다.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 봤다면 “우리 코딱지들~ 정말 코딱지 같은 걸 만들었네요~”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과제 발표날이 됐다. 예술 동지들의 열띤 발표가 이어졌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거나 만들어온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나는 약간 울컥하는 심정이 됐다.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던 동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죽빵을 날리리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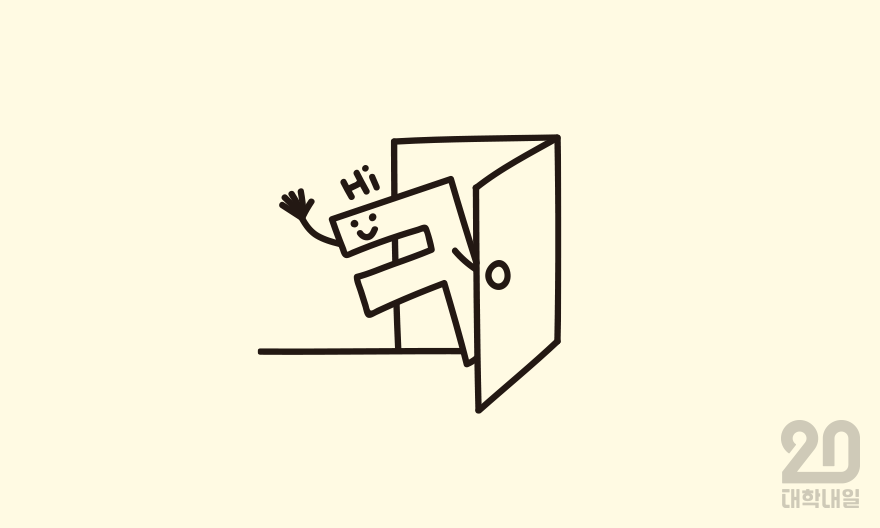
10분 만에 완성한 과제와… 거기에 추상이니 의미니… 하는 말을 욱여맞추는 나와… 그걸 경청하는 사람들… 특히 그 경청… 좀 대충 듣지… 왜들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사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시 떠올려도 빈혈기가 도는 것 같다. 장내는 술렁였고 예술 동지들은 ‘웃기다’와 ‘웃어도 되는가’ 사이에서 치열하게 번뇌하다 하나둘 피식거리기 시작했다.
난 겉으론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속으론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창밖의 벚꽃처럼 흩날려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여기까지가 내 치욕의 역사다. 이후에도 많은 걸 귀찮아하고 있지만 이제 이름만 보고 강의를 선택하진 않는다. 특히 어떤 과제를 주는지는 꼭 알아보는 편이다. 모두 나를 타산지석 삼아 좋은 수강 신청 하시길 바란다.
빵떡씨 / 사실 전공도 이름 보고 정했습니다
[841호 - special]
Intern 최은유
#841호#841호 special#841호 대학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