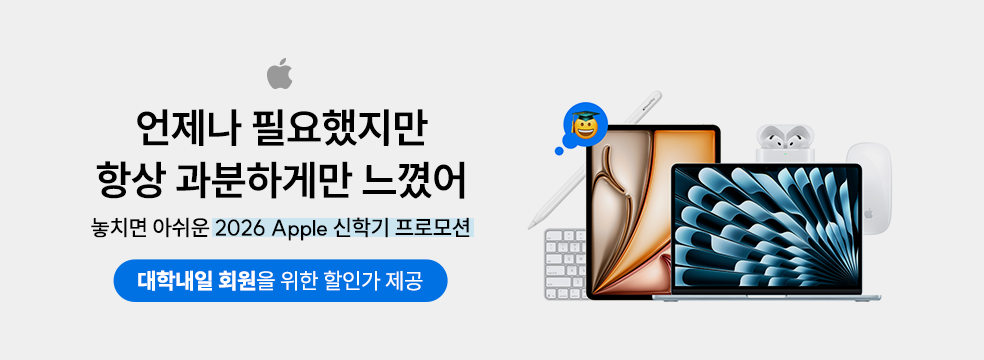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필터 없는 사진에 익숙해지기
필터를 씌워서라도 완벽한 여행으로 포장하고 싶었다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마알간 벚꽃과 노란 개나리, 붉은 목련이 봄을 알리고 있다. 애인이 있는 친구들은 제각각 벚꽃이 예쁜 ‘핫 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볼을 붉혔다. 멀리 못 간 학생들은 학교 동산에 옹기종기 모여 카메라를 들었다.
나도 봄을 느끼고 싶어 강릉 여행을 계획했다. 미세먼지가 덜한 곳에서 바다 냄새를 맡고 싶었다. 예쁜 여행 사진을 찍기 위해 출발 전 유명한 카메라 어플을 모조리 다운받았다. 강릉으로 가는 2시간 30분 내내, 강릉 바다 사진을 찾아보고, 사진 찍기 좋은 벽화 길을 미리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 보니 강릉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벚꽃과 진달래가 피어 있었지만 그냥 ‘봄이 온 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줄기의 검은 대나무를 기대하고 오죽헌에 갔지만,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가는 줄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을 부탁하는 커플들만 잔뜩 만나고 돌아왔다. 경포해변에서 쭉 걸어서 점찍어 두었던 맛집에서 물회를 한 그릇 먹고, 강문해변으로 나와 모래사장에 앉았다.
바닷바람에 눈이 시렸고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바다의 빛깔도 사진에서 본 에메랄드 빛이 아니었다. 그날 하늘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거무튀튀한 색이었다. 그 와중에 사진은 찍어야겠다 싶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어플을 켰다. 황량한 바다이지만 어플로 예쁘게 둔갑시켜 부러움을 사고 싶었다.

필터를 끼얹으니 그럭저럭 예뻐 보였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며 물었다. “예쁘냐? 나 강릉이다.” 잠시 기다리니 1이 사라졌고, 나는 친구가 내 여행과 사진을 칭찬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쁘긴 한데 바다 아닌 것 같다. 그림 같네.”
다시 보니 넘실넘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수지마냥 고여 있는 물처럼 보였다. 죽은 바다였다. 과하게 카메라 필터를 씌워서 초점은 하나도 맞지 않았고 바다 색깔은 인조적이었다.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행이었다. 그런데도 “예쁜 바다야, 정말 예쁜 날이야”하며 억지로 행복 회로를 작동시키고, 필터를 씌워 과장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부족한 여행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은데. 또 오면 되는데. 완벽한 나로, 완벽한 경험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예쁜 사진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왕 추억을 남길 거라면 필터를 얹어 아름다운 사진이 되면 좋을 거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시 쓰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현대인은 현재를 잘 긍정하지 않아요. 늘 미래를 준비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죠. 그러나 시를 쓰는 것은 현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를 쓰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고운 필터를 씌우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 익숙해져야겠다는 것이다. 강릉 바다가 가르쳐준 것처럼.
나도 봄을 느끼고 싶어 강릉 여행을 계획했다. 미세먼지가 덜한 곳에서 바다 냄새를 맡고 싶었다. 예쁜 여행 사진을 찍기 위해 출발 전 유명한 카메라 어플을 모조리 다운받았다. 강릉으로 가는 2시간 30분 내내, 강릉 바다 사진을 찾아보고, 사진 찍기 좋은 벽화 길을 미리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 보니 강릉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벚꽃과 진달래가 피어 있었지만 그냥 ‘봄이 온 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줄기의 검은 대나무를 기대하고 오죽헌에 갔지만,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가는 줄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을 부탁하는 커플들만 잔뜩 만나고 돌아왔다. 경포해변에서 쭉 걸어서 점찍어 두었던 맛집에서 물회를 한 그릇 먹고, 강문해변으로 나와 모래사장에 앉았다.
바닷바람에 눈이 시렸고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바다의 빛깔도 사진에서 본 에메랄드 빛이 아니었다. 그날 하늘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거무튀튀한 색이었다. 그 와중에 사진은 찍어야겠다 싶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어플을 켰다. 황량한 바다이지만 어플로 예쁘게 둔갑시켜 부러움을 사고 싶었다.

필터를 끼얹으니 그럭저럭 예뻐 보였다. 고등학교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며 물었다. “예쁘냐? 나 강릉이다.” 잠시 기다리니 1이 사라졌고, 나는 친구가 내 여행과 사진을 칭찬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쁘긴 한데 바다 아닌 것 같다. 그림 같네.”
다시 보니 넘실넘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저수지마냥 고여 있는 물처럼 보였다. 죽은 바다였다. 과하게 카메라 필터를 씌워서 초점은 하나도 맞지 않았고 바다 색깔은 인조적이었다.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행이었다. 그런데도 “예쁜 바다야, 정말 예쁜 날이야”하며 억지로 행복 회로를 작동시키고, 필터를 씌워 과장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부족한 여행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은데. 또 오면 되는데. 완벽한 나로, 완벽한 경험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예쁜 사진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왕 추억을 남길 거라면 필터를 얹어 아름다운 사진이 되면 좋을 거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시 쓰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현대인은 현재를 잘 긍정하지 않아요. 늘 미래를 준비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죠. 그러나 시를 쓰는 것은 현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를 쓰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고운 필터를 씌우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 익숙해져야겠다는 것이다. 강릉 바다가 가르쳐준 것처럼.
[848호 - 20's voice]
WRITER 허나우 hyh676@naver.com 순간을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20대#20대 보이스#20대 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