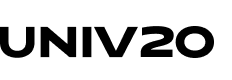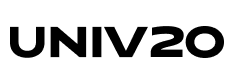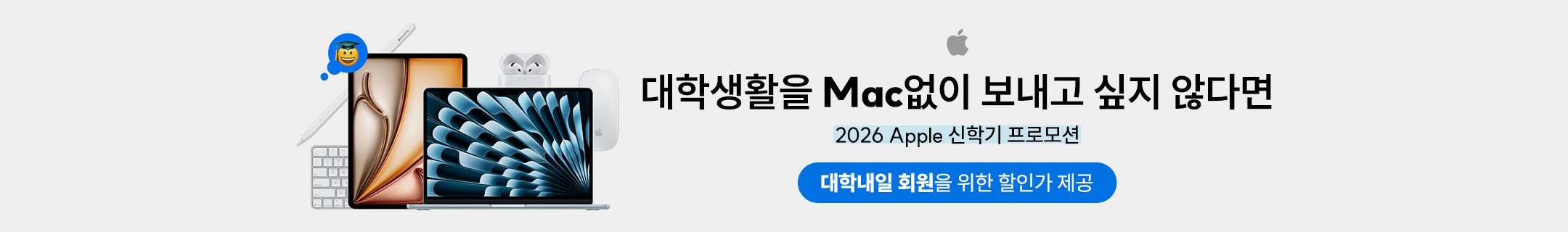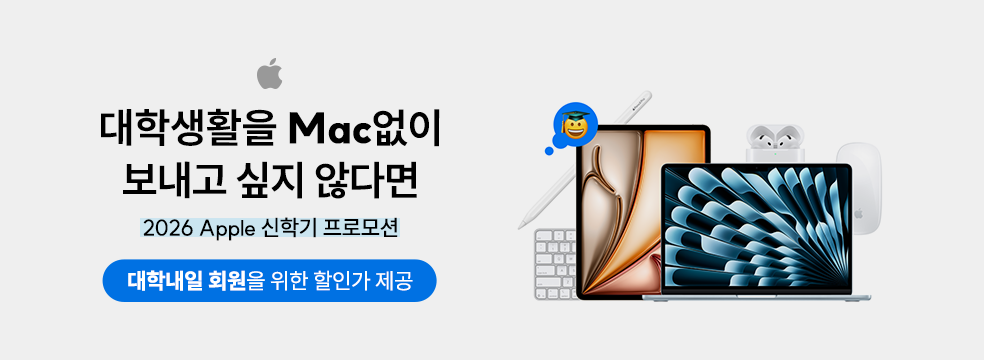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구애의 기술
구직과 구애는 기본적으로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막 대학을 졸업했던 2000년대 초반에도 취직은 쉽지 않았다. 심지어 가진 건 대학 졸업장과 평점 3점을 겨우 넘긴 성적 증명서, 토익 점수, 달랑 세 개였다. 그렇다고 면접을 잘 본 것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단군신화처럼 아득한 그 시절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려 보니, 한 영상제작 사무실에서 본 면접이 생각난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건물 가장 안쪽에 있는 어두침침한 곳, 그러니까 청소 비품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장소의 문을 열어야 했다. 문을 여니 놀라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긴 사무실 저 끝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책상 앞에는 한국전쟁, 아니 최소 월남전에는 참전하셨을 듯한 노인 한 분이 검은 항공점퍼를 입고 마치 지옥의 심판관처럼 앉아 있었다.
그 사무실이 정확히 무얼 하는 곳이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그 사무실에서 본 면접에서도 떨어졌다. 나는 면접을 잘 못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자기 어필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요즘도 TV에서 공채 입사 면접 장면이 나오면 민망해서 식은땀이 난다. 한 톨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등을 꼿꼿하게 편 면접자가 입꼬리를 올린 채 “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귀사가 원하는 바로 그 인재입니다!”라는 말을 또박또박 내뱉고, 면접관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가 입사할 때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질문을 던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식이라는 걸 면접관도 면접자도 다 안다. 면접은 양측 합의하에 치러지는 쇼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라는 질문에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준비성과 연기력과 자제력을 발휘해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다. 나처럼 미숙하고 철없는 사람이나 이런 걸 참지 못한다. 아무튼 면접의 기본은 면접관을 사로잡는 것이다. 구직과 구애는 기본적으로 같다. 사실상 세상 모든 일들—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일들이 ‘유혹’과 관련이 있다. 좀 비정하게 들리기는 해도 그 기본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라는 얘기다.

20대까지 나는 대개 구애자, 유혹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제 나는 구애자이면서 또 때로는 구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책을 만들 때 나는 늘 세상을 유혹하는 마음이다. 동시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출간 제의나 투고 제의, 강연 제의 같은 것들. 다 거절을 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제 나에게도 기준이란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선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는 웬만하면 의구심을 갖는 편이다. 그럴 때는 “이 일에 왜 제가 필요한 거죠?”라는 질문으로 재차 확인을 한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보수가 없더라도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면 그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듯한 현란한 제안서에는 이쪽도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는다. 이름만 바꿔서 보낸 자기소개서, 연애편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떨림과 수줍음과 애정과 열의가 느껴지는 제안서와는 언제나 사랑에 빠진다. 서류 너머의 인간이 보일 듯한 제안 말이다.
아무튼 나 따위의 인간에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나는 수년 전에 대구에서 2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그 강연에서 아마 ‘클리토리스’라는 단어를 최소한 5번 이상 말했을 것이다(200명 앞에서 그 단어를 5번 이상 말하고 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진다). 돈도 받지 않고 나는 그걸 왜 했을까.
순전히 강연의 기획자인 대학생들이 내게 보낸 제안서 때문이었다. PPT 양식의 서툴고 평범한 제안서임에도 그 안에는 나 같은 무명의 칼럼니스트를 섭외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나를 (그 서류상에서나마)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나는 200명 앞에서 ‘밝히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 전 읽은 사랑하는 우치다 다쓰루 선생님의 책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좋은 작가는 설명을 잘하고, 작가가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이며, 그것은 독자를 향한 배려를 넘어 일종의 사랑과도 같다고.
그런데 그것이 꼭 작가와 독자 사이에만 있는 일일까.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 다만 그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애하는 자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가진 패를 다 꺼내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애자의 슬픈 운명이다. 하지만 그 슬픈 운명을 딛지 않고서는, 마음은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생각하면 단군신화처럼 아득한 그 시절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려 보니, 한 영상제작 사무실에서 본 면접이 생각난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건물 가장 안쪽에 있는 어두침침한 곳, 그러니까 청소 비품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장소의 문을 열어야 했다. 문을 여니 놀라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긴 사무실 저 끝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책상 앞에는 한국전쟁, 아니 최소 월남전에는 참전하셨을 듯한 노인 한 분이 검은 항공점퍼를 입고 마치 지옥의 심판관처럼 앉아 있었다.
그 사무실이 정확히 무얼 하는 곳이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그 사무실에서 본 면접에서도 떨어졌다. 나는 면접을 잘 못 봤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자기 어필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요즘도 TV에서 공채 입사 면접 장면이 나오면 민망해서 식은땀이 난다. 한 톨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등을 꼿꼿하게 편 면접자가 입꼬리를 올린 채 “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귀사가 원하는 바로 그 인재입니다!”라는 말을 또박또박 내뱉고, 면접관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가 입사할 때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질문을 던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식이라는 걸 면접관도 면접자도 다 안다. 면접은 양측 합의하에 치러지는 쇼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라는 질문에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준비성과 연기력과 자제력을 발휘해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다. 나처럼 미숙하고 철없는 사람이나 이런 걸 참지 못한다. 아무튼 면접의 기본은 면접관을 사로잡는 것이다. 구직과 구애는 기본적으로 같다. 사실상 세상 모든 일들—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일들이 ‘유혹’과 관련이 있다. 좀 비정하게 들리기는 해도 그 기본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라는 얘기다.

20대까지 나는 대개 구애자, 유혹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제 나는 구애자이면서 또 때로는 구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책을 만들 때 나는 늘 세상을 유혹하는 마음이다. 동시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출간 제의나 투고 제의, 강연 제의 같은 것들. 다 거절을 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제 나에게도 기준이란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선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는 웬만하면 의구심을 갖는 편이다. 그럴 때는 “이 일에 왜 제가 필요한 거죠?”라는 질문으로 재차 확인을 한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보수가 없더라도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면 그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듯한 현란한 제안서에는 이쪽도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는다. 이름만 바꿔서 보낸 자기소개서, 연애편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떨림과 수줍음과 애정과 열의가 느껴지는 제안서와는 언제나 사랑에 빠진다. 서류 너머의 인간이 보일 듯한 제안 말이다.
아무튼 나 따위의 인간에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이지 감사한 일 아닌가. 나는 수년 전에 대구에서 2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그 강연에서 아마 ‘클리토리스’라는 단어를 최소한 5번 이상 말했을 것이다(200명 앞에서 그 단어를 5번 이상 말하고 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진다). 돈도 받지 않고 나는 그걸 왜 했을까.
순전히 강연의 기획자인 대학생들이 내게 보낸 제안서 때문이었다. PPT 양식의 서툴고 평범한 제안서임에도 그 안에는 나 같은 무명의 칼럼니스트를 섭외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잔뜩 배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나를 (그 서류상에서나마)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나는 200명 앞에서 ‘밝히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 전 읽은 사랑하는 우치다 다쓰루 선생님의 책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좋은 작가는 설명을 잘하고, 작가가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이며, 그것은 독자를 향한 배려를 넘어 일종의 사랑과도 같다고.
그런데 그것이 꼭 작가와 독자 사이에만 있는 일일까.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 다만 그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애하는 자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가진 패를 다 꺼내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애자의 슬픈 운명이다. 하지만 그 슬픈 운명을 딛지 않고서는, 마음은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 법이다.
[867호 - THINK]
Writer 한수희 kazmikgirl@naver.com 책 『온전히 나답게』,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 저자 illustrator 강한
#구애#구직#표현 스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