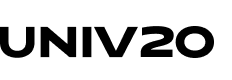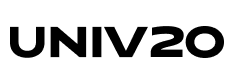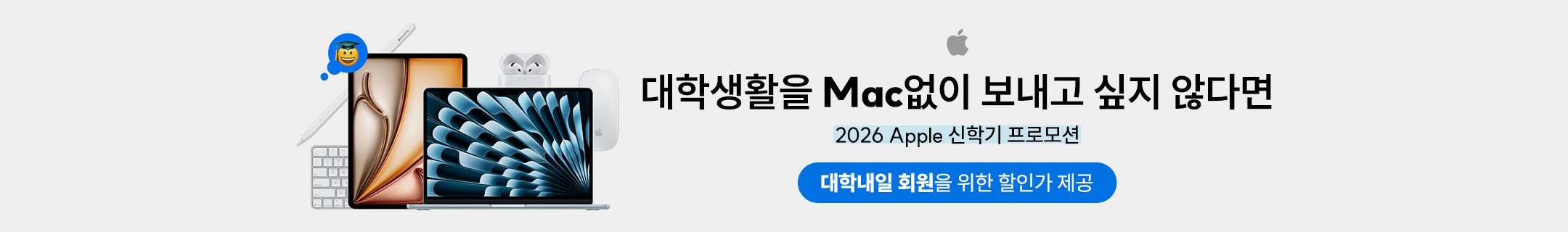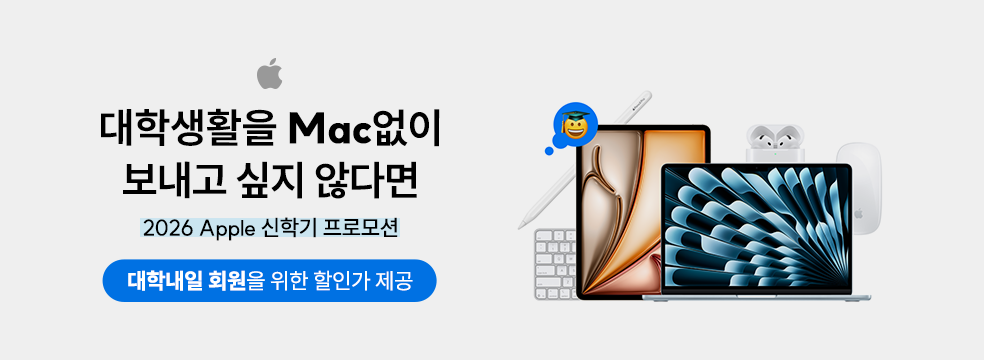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내 편견과 트라우마 중 절반은 10대 때 생겼다.
"엄마, 선생님이 엄마랑 얘기하고 싶다고 학교 오래."
"휴… 또?"
담임선생님은 갑자기 엄마를 호출했다. 엄마를 직접 만나 내 칭찬을 하려나 싶어 으쓱해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알았다. 그 칭찬 가득한 특별 면담 이후에는, 돈 봉투를 내밀어야 했다는 걸. 돌이켜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았다. 초등학교 때는 촌지에 따라 담임선생님이 발표를 시켜주는 친구가 달라졌다. 중학교 때는 반 친구가 앞에 불려 나가 뺨을 맞았다. 나이 지긋하신 어떤 남자 선생님은 체벌이랍시고 겨드랑이를 꼬집었다. 촌지나 폭력,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너무 명확하게 나쁜 짓이어서 더 언급할 필요도 못 느낀다. 오히려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반장 임명 사건이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을 임명했다. 우리 반 애들은 조용하고 소심한 반장을 재수 없다고 수군댔다. 어른들은 쉽게 말했다. 따돌린 애들이 나쁜 거라고. 성적이 좋은 애가 반장 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아니, 이건 선생님이 나쁜 거였다.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반장 투표를 했어야 했다. 반장 할 생각 없던 친구는 원하지 않는 감투를 쓰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테고, 반장이 되고 싶었던 친구는 되든 안 되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철없던 아이들의 시기 어린 비아냥도 없었을 거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10대는 ‘재수 없다’는 한마디에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을 돌돌 말아 던져버리기도 한다. 나 또한 그 감정을 던지기도, 맞아보기도 했다. 선생님의 생각 없는 행동은 우리가 그것들을 마구 던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권력자인 선생님에게도 잘 보이는 방법을 찾아 나갔다. 일종의 사회화다. 그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먼저 깨우친 것은 과한 경쟁심(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해), 자본주의(집이 잘살면 선생님이 잘 해주는구나), 갑을 관계(선생님에게 잘 보이면 떨어지는 게 있구나) 같은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연대를 위해 뒤에서 선생님 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변태 같은 선생님을 보며 세상에 조심해야 할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때 뼈저리게 느낀 것 같다.

물론 학교생활을 하며 즐거웠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트라우마 중 절반은 이때 생긴 것이기도 하다. 학교를 벗어나도 그 기억들은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트라우마들이 나를 찌를 때면 힘없이 타인을 원망하곤 했는데, 그 원망의 대상에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폭력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젠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을 은사로 만났더라면. 그랬다면 좋은 영향을 받아 내 인생이 더 맑지 않았을까.
요즘 스쿨 미투 기사를 자주 찾아 읽는다. 기사 내용을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있었던 문제들이다. 학생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그대로인가 보다. 만약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10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못 할 거다. 용기도 없고, 무엇보다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다. 시대가 변했다. “다 맞으면서 크는 거야, 우리도 기성회비 못 냈다고 쫓겨나며 컸어.”라고 말하기에는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다. 변한 기류 속에 이제는 어른들이 고개 들어 답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한 사람의 인생의 개입할 건지.
이제는 시간이 흘러 내 주변에도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있다. 그들을 보며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 남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성장 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과거 학생일 때 느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조심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한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을 임명했다. 우리 반 애들은 조용하고 소심한 반장을 재수 없다고 수군댔다. 어른들은 쉽게 말했다. 따돌린 애들이 나쁜 거라고. 성적이 좋은 애가 반장 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아니, 이건 선생님이 나쁜 거였다.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반장 투표를 했어야 했다. 반장 할 생각 없던 친구는 원하지 않는 감투를 쓰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테고, 반장이 되고 싶었던 친구는 되든 안 되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철없던 아이들의 시기 어린 비아냥도 없었을 거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10대는 ‘재수 없다’는 한마디에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을 돌돌 말아 던져버리기도 한다. 나 또한 그 감정을 던지기도, 맞아보기도 했다. 선생님의 생각 없는 행동은 우리가 그것들을 마구 던질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권력자인 선생님에게도 잘 보이는 방법을 찾아 나갔다. 일종의 사회화다. 그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먼저 깨우친 것은 과한 경쟁심(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해), 자본주의(집이 잘살면 선생님이 잘 해주는구나), 갑을 관계(선생님에게 잘 보이면 떨어지는 게 있구나) 같은 것이었다. 친구들과의 연대를 위해 뒤에서 선생님 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변태 같은 선생님을 보며 세상에 조심해야 할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때 뼈저리게 느낀 것 같다.

요즘 스쿨 미투 기사를 자주 찾아 읽는다. 기사 내용을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있었던 문제들이다. 학생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그대로인가 보다. 만약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10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못 할 거다. 용기도 없고, 무엇보다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다. 시대가 변했다. “다 맞으면서 크는 거야, 우리도 기성회비 못 냈다고 쫓겨나며 컸어.”라고 말하기에는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다. 변한 기류 속에 이제는 어른들이 고개 들어 답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한 사람의 인생의 개입할 건지.
이제는 시간이 흘러 내 주변에도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있다. 그들을 보며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 남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성장 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과거 학생일 때 느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조심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한다.
#교사#선생님#스쿨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