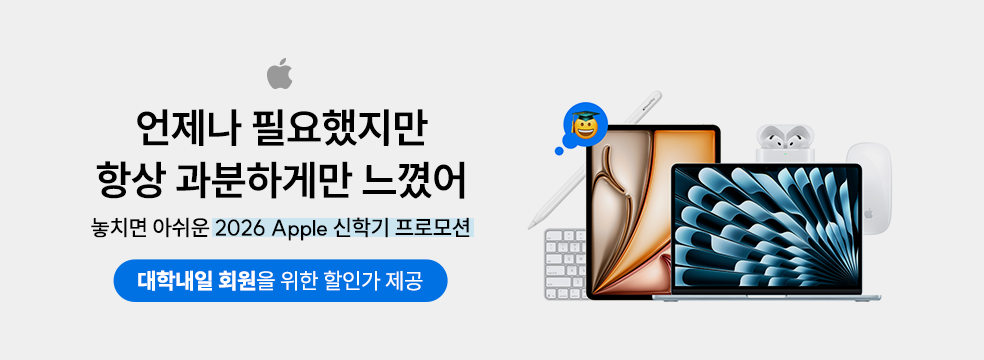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그의 발가락에서는 청량한 냄새가 났네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장면
폭염인데 ‘아아’도 없는 이탈리아에서
지금부터 쓸 글은 발가락에 대한 것이고,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3월의 대학가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어디선가 발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도 들지만 약속한다. 적어도 고린내만 풍겨놓고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는가. 40도에 달하는 더위였는데 나는 이탈리아에 있었다. 언니와 엄마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그 나라로 떠난다는 소식에 “나도!”를 외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건만, 그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한여름의 열기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곳은 더웠고, 성수기라 사람이 많았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었다. 좋긴 한데 안 좋기도 한 기분. 와! 베네치아 예쁘다. 근데 그늘이 없군. 와, 여기가 오드리 헵번이 젤라토를 먹었던 분수? 일단 어디 좀 들어가자. 그날도 이런 날 중 하나였다.
‘친퀘테레’라는 해변 마을에서 우리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바다도 보고 포도밭도 봤으니 이제 그만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 하지만 낡은 스피커에서 심상치 않은 억양의 방송이 흘러나왔고 수능 외국어 영역을 추리력과 상상력으로 해결한 나는 본능적으로 연착을 예감했다.
아아, 덥다. 이곳은 그늘 한 점 없는 노천 역사. 어디 앉기라도 하면 좀 나았으련만 그나마도 몇 개 없는 벤치는 여름 해를 그대로 받아 뜨겁기도 하거니와 더러웠다. 무너진 돌담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딱 10분만 아름다웠고, 그렇게 30분쯤 서있으니 이마와 겨드랑이에 땀이 맺혔다. 끈적한 몸으로 온종일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왈칵 짜증이 몰려왔다.
발가락을 주물러도 청량한 청춘
그 발가락과 조우한 건 몇 분 뒤의 일이었다. 내 옆에는 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무리가 있었는데 바캉스를 왔는지 여자들은 민소매 안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반바지에 플립플롭을 신었다.
곱슬머리 청년은 심지어 가방도 없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더러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플립플롭 밖으로 드러난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느긋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이야기에 이따금 보조개를 보이며.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짜증을 내며 바라보던 바다가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등 뒤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땅바닥에 앉아 발가락을 만지는 일이 필연적인 행위로 느껴질 정도였다. 아아, 나는 이 꾀죄죄한 이탈리아 청년에게 시선을 홀랑 빼앗겨버렸다.
그의 모습에는 바다와 번갈아 훔쳐보고 싶은 청량함이 있었다. 왜 이탈리아에까지 가서 남의 발가락 같은 것이나 기억하고 오는 것인지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에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 시절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어서가 아니었을까.
같은 여행자였지만 나는 앞뒤가 꽉 막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이 더러워질까 봐 벤치에도 앉지 않았으며, 땀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짐을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숙소의 화장실 상태가 중요해진 사람.
잠깐이라도 저렇게 맨몸으로 훌쩍 나가는 것은, 더러움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것은 저 또래였던 ‘과거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일은 더더욱.

‘지금’에는 항상 가산점을 주어야지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남의 발가락에 감동을 받은 인간인 만큼 대학 시절의 추억도 몹시 꾀죄죄하여 쉬는 시간에 누군가가 텀블러에 타 온 깔루아 밀크를 돌려 마시고, 시험 전주에 벚꽃을 보러 가고, 공강 시간에 만화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버리기 직전의 된장찌개를 먹은 일 등 느긋하고 바보 같았던 장면만이 대표 스틸컷처럼 떠오른다.
분명 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을 테지만 이런 것들만 앞다투어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인 것을 안다. 회사 워크숍 중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부장님의 모습은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출근용 텀블러에 깔루아 밀크를 타서 가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에 딱인 것처럼 말이다.
발가락을 주물러도 청량해 보이는 시간은 삶에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항상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도 간이 허용하는 한 술도 많이 마시고, 연애도 시간 낭비도 실컷, 그리고 발가락도 마음껏 긁으시길.
어쩐지 발 냄새 가득한 글이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모든 제스처에서 어쩐지 푸른 기운을 느끼는 나로서는 여러분의 발가락에서조차도 부러움을 느낀다. 아니면 거기가 이탈리아라서 그랬나. 그렇다면 이 칼럼은 어쩌지.
지금부터 쓸 글은 발가락에 대한 것이고,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3월의 대학가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어디선가 발 냄새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도 들지만 약속한다. 적어도 고린내만 풍겨놓고 도망가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는가. 40도에 달하는 더위였는데 나는 이탈리아에 있었다. 언니와 엄마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그 나라로 떠난다는 소식에 “나도!”를 외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건만, 그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한여름의 열기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곳은 더웠고, 성수기라 사람이 많았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었다. 좋긴 한데 안 좋기도 한 기분. 와! 베네치아 예쁘다. 근데 그늘이 없군. 와, 여기가 오드리 헵번이 젤라토를 먹었던 분수? 일단 어디 좀 들어가자. 그날도 이런 날 중 하나였다.
‘친퀘테레’라는 해변 마을에서 우리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바다도 보고 포도밭도 봤으니 이제 그만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 하지만 낡은 스피커에서 심상치 않은 억양의 방송이 흘러나왔고 수능 외국어 영역을 추리력과 상상력으로 해결한 나는 본능적으로 연착을 예감했다.
아아, 덥다. 이곳은 그늘 한 점 없는 노천 역사. 어디 앉기라도 하면 좀 나았으련만 그나마도 몇 개 없는 벤치는 여름 해를 그대로 받아 뜨겁기도 하거니와 더러웠다. 무너진 돌담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딱 10분만 아름다웠고, 그렇게 30분쯤 서있으니 이마와 겨드랑이에 땀이 맺혔다. 끈적한 몸으로 온종일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왈칵 짜증이 몰려왔다.
발가락을 주물러도 청량한 청춘
그 발가락과 조우한 건 몇 분 뒤의 일이었다. 내 옆에는 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무리가 있었는데 바캉스를 왔는지 여자들은 민소매 안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반바지에 플립플롭을 신었다.
곱슬머리 청년은 심지어 가방도 없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더러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플립플롭 밖으로 드러난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느긋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이야기에 이따금 보조개를 보이며.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짜증을 내며 바라보던 바다가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등 뒤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땅바닥에 앉아 발가락을 만지는 일이 필연적인 행위로 느껴질 정도였다. 아아, 나는 이 꾀죄죄한 이탈리아 청년에게 시선을 홀랑 빼앗겨버렸다.
그의 모습에는 바다와 번갈아 훔쳐보고 싶은 청량함이 있었다. 왜 이탈리아에까지 가서 남의 발가락 같은 것이나 기억하고 오는 것인지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에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 시절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어서가 아니었을까.
같은 여행자였지만 나는 앞뒤가 꽉 막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이 더러워질까 봐 벤치에도 앉지 않았으며, 땀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짐을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숙소의 화장실 상태가 중요해진 사람.
잠깐이라도 저렇게 맨몸으로 훌쩍 나가는 것은, 더러움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것은 저 또래였던 ‘과거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일은 더더욱.

‘지금’에는 항상 가산점을 주어야지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남의 발가락에 감동을 받은 인간인 만큼 대학 시절의 추억도 몹시 꾀죄죄하여 쉬는 시간에 누군가가 텀블러에 타 온 깔루아 밀크를 돌려 마시고, 시험 전주에 벚꽃을 보러 가고, 공강 시간에 만화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버리기 직전의 된장찌개를 먹은 일 등 느긋하고 바보 같았던 장면만이 대표 스틸컷처럼 떠오른다.
분명 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을 테지만 이런 것들만 앞다투어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인 것을 안다. 회사 워크숍 중 발가락을 주물럭거리는 부장님의 모습은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출근용 텀블러에 깔루아 밀크를 타서 가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에 딱인 것처럼 말이다.
발가락을 주물러도 청량해 보이는 시간은 삶에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항상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여러분도 간이 허용하는 한 술도 많이 마시고, 연애도 시간 낭비도 실컷, 그리고 발가락도 마음껏 긁으시길.
어쩐지 발 냄새 가득한 글이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모든 제스처에서 어쩐지 푸른 기운을 느끼는 나로서는 여러분의 발가락에서조차도 부러움을 느낀다. 아니면 거기가 이탈리아라서 그랬나. 그렇다면 이 칼럼은 어쩌지.
[881호 - think]
Writer 김은경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저자ILLUSTRATOR 강한
#김은경 작가#에세이#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