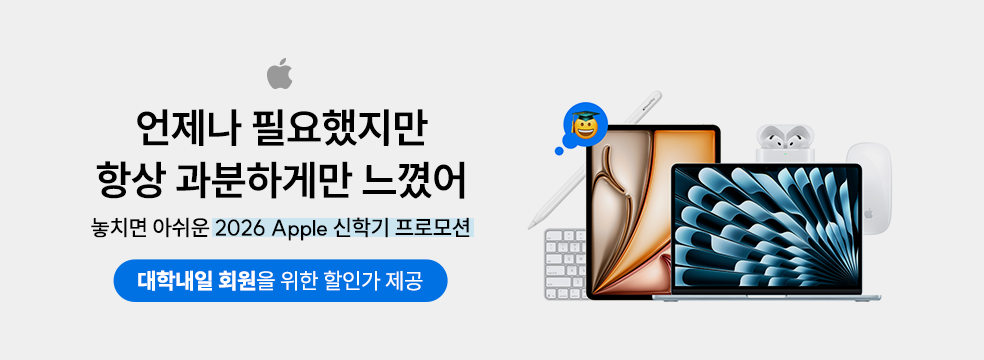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니 너무하네
나에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다면 5등급이 아닐까
에너지 효율 5등급의 비애
무더운 여름날,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낡은 에어컨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나에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붙어 있다면 5등급일 거라고. 늘 뭔가 미진한 채로 애쓰고 있는 듯한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건 내가 저 에어컨처럼 5등급이라서가 아닐까, 하고.
지난 여름휴가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환갑을 맞은 엄마와 아빠, 오빠네 가족까지 총 여덟 명이 떠나는 완전체 가족 여행. 여행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가이드처럼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는 서울로 돌아온 뒤 꼬박 이틀을 누워 있었다. 여행 중엔 바빠 그런 줄도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걸 느낄 수 있었다. 배터리 잔량 2%에서 깜빡거리다 죽어버린 휴대폰처럼.
그런데도 이틀간 방 안에 누워만 있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왔다.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운 휴가인데, 씻고 나가서 어디 전시라도 좀 다녀올까. 이상한 일이었다. 쉬려고 휴가를 쓴 건데, 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심지어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잠은 죽어서 자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아, 나랑 친구가 되긴 힘들겠구나….’ 잠은 그냥 살아서 푹 자두고 싶은 나인데, 어째서 겨우 ‘쉰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면, 뭔가(그게 뭔지 몰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진다. 그 초조함이 기어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럼 또 뭔가를 하고, 또다시 금세 지치고, 그럼 또 눕고, 이내 불안해져서 일어나는 일의 반복….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제일 힘든 걸까?

너는 경차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여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털어놓았을 때 선배 S는 말했다. “완충되는 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3시간 안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라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꼬박 충전기에 꽂아두어야 완충되는 배터리인 거지.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냐. 부러워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다른 사람인 거잖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 나는 오래 쉬어야 충전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선배 W는 네가 경차로 태어난 걸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경차라니! 기분 나쁘지만 너무 맞는 비유네요! 하며 술잔을 부딪쳤더니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경차가 나쁜 게 아니라고. 경차에겐 경차의 속도로만 볼 수 있는 삶이 따로 있는데 자꾸 스포츠카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비유의 달인들이 연달아 해주는 위로를 듣고 있자니, 하루 종일 침대라는 충전기에 누워 한 칸씩 배터리를 채워가는 나, 고속도로 옆의 국도를 슬렁슬렁 달리는 경차 같은 내가 보이는 듯했다. 그건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일 뿐이었다. 지쳐서 쉬어 가려는 나, 원래의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는 나.
하긴 내가 열아홉 살까지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했다. 여름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인 아침과 맹렬한 더위가 좀 수그러든 저녁에만 들판에 나가 일을 하고, 쨍쨍한 한낮에는 모두가 쉬었다. 그래야 무사히 기운을 회복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때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에게 누구도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낮에 조금 더 일을 해놓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말렸다. 그러다 큰일 난다고. 괜히 욕심부리지 말라고.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어쩌면 그동안 뭐라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얼마나 ‘덜’ 해야 좋을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게 아닐까. 요즘 내 숙제는 내게 맞는 에너지의 적정량을 찾는 일이다. 나라는 사람은 얼마큼 무리하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경고가 뜨는지, 그럼 충전하는 데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럴 때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완충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일이니까.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에너지의 적정량이 다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남의 에너지와 속도를 곁눈질할 시간에, 스스로를 더 자주 살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열심인지, 바깥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데 나가서 뛰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사는 건 아닌지, 충전되지 못한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탓에 배터리가 바닥나기 직전은 아닌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어렵다. 우리는 효율과 속도의 시대를 겨우 헤쳐나가는 중이니까.
“어쩌면 그게 내가 여행에서 배운 전부인지도 모른다. 누울 줄 아는 것.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한수희, 『여행이라는 이상한 일』 중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 앞으로 십 년은 더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다. 쉴 때는 푹 쉬기만 하기. 이왕 누워 있을 거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누워 있기. 참, 잠은 죽어서 자지 말고 살아서 많이 자두기!
무더운 여름날,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낡은 에어컨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 나에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붙어 있다면 5등급일 거라고. 늘 뭔가 미진한 채로 애쓰고 있는 듯한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건 내가 저 에어컨처럼 5등급이라서가 아닐까, 하고.
지난 여름휴가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환갑을 맞은 엄마와 아빠, 오빠네 가족까지 총 여덟 명이 떠나는 완전체 가족 여행. 여행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가이드처럼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는 서울로 돌아온 뒤 꼬박 이틀을 누워 있었다. 여행 중엔 바빠 그런 줄도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걸 느낄 수 있었다. 배터리 잔량 2%에서 깜빡거리다 죽어버린 휴대폰처럼.
그런데도 이틀간 방 안에 누워만 있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왔다.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운 휴가인데, 씻고 나가서 어디 전시라도 좀 다녀올까. 이상한 일이었다. 쉬려고 휴가를 쓴 건데, 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심지어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잠은 죽어서 자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아, 나랑 친구가 되긴 힘들겠구나….’ 잠은 그냥 살아서 푹 자두고 싶은 나인데, 어째서 겨우 ‘쉰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면, 뭔가(그게 뭔지 몰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진다. 그 초조함이 기어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럼 또 뭔가를 하고, 또다시 금세 지치고, 그럼 또 눕고, 이내 불안해져서 일어나는 일의 반복….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제일 힘든 걸까?

너는 경차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여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털어놓았을 때 선배 S는 말했다. “완충되는 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3시간 안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라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꼬박 충전기에 꽂아두어야 완충되는 배터리인 거지.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냐. 부러워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다른 사람인 거잖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아, 나는 오래 쉬어야 충전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선배 W는 네가 경차로 태어난 걸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경차라니! 기분 나쁘지만 너무 맞는 비유네요! 하며 술잔을 부딪쳤더니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경차가 나쁜 게 아니라고. 경차에겐 경차의 속도로만 볼 수 있는 삶이 따로 있는데 자꾸 스포츠카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비유의 달인들이 연달아 해주는 위로를 듣고 있자니, 하루 종일 침대라는 충전기에 누워 한 칸씩 배터리를 채워가는 나, 고속도로 옆의 국도를 슬렁슬렁 달리는 경차 같은 내가 보이는 듯했다. 그건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일 뿐이었다. 지쳐서 쉬어 가려는 나, 원래의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는 나.
하긴 내가 열아홉 살까지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했다. 여름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인 아침과 맹렬한 더위가 좀 수그러든 저녁에만 들판에 나가 일을 하고, 쨍쨍한 한낮에는 모두가 쉬었다. 그래야 무사히 기운을 회복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때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에게 누구도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낮에 조금 더 일을 해놓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말렸다. 그러다 큰일 난다고. 괜히 욕심부리지 말라고.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어쩌면 그동안 뭐라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얼마나 ‘덜’ 해야 좋을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게 아닐까. 요즘 내 숙제는 내게 맞는 에너지의 적정량을 찾는 일이다. 나라는 사람은 얼마큼 무리하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경고가 뜨는지, 그럼 충전하는 데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럴 때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완충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일이니까.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에너지의 적정량이 다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남의 에너지와 속도를 곁눈질할 시간에, 스스로를 더 자주 살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열심인지, 바깥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데 나가서 뛰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사는 건 아닌지, 충전되지 못한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탓에 배터리가 바닥나기 직전은 아닌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어렵다. 우리는 효율과 속도의 시대를 겨우 헤쳐나가는 중이니까.
“어쩌면 그게 내가 여행에서 배운 전부인지도 모른다. 누울 줄 아는 것.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한수희, 『여행이라는 이상한 일』 중
누워 있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 앞으로 십 년은 더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다. 쉴 때는 푹 쉬기만 하기. 이왕 누워 있을 거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누워 있기. 참, 잠은 죽어서 자지 말고 살아서 많이 자두기!
[899호 - think]
Illustrator 강한
#899호 think#에세이#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