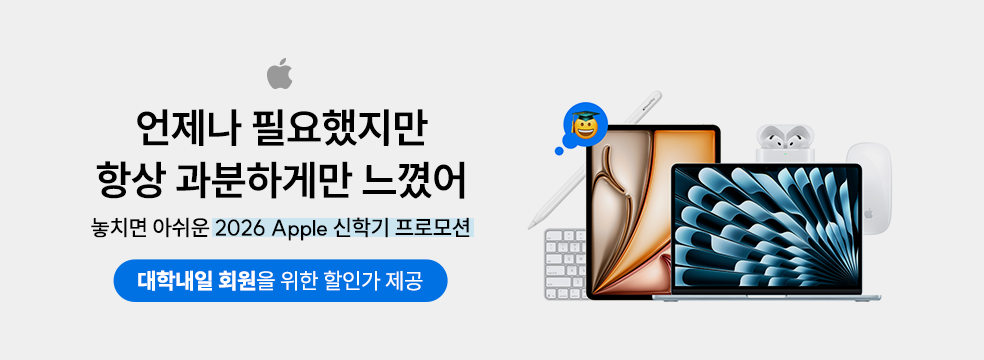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먼저야
다들 운명처럼 전공을 잘만 선택한 것 같았다.
십 대의 마지막을 보낸 고등학교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사치였다. 선생님들은 뭐든지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생각하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미래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어야 했다. “글깨나 쓰는 것 같은데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봐.”라는 담임선생님 말을 듣고 주관 없이 수시 지원을 했다가 보기 좋게 탈락하기 전에. 도저히 재수할 엄두는 나지 않아서, 정시 전형에선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합격 예측 프로그램 결과를 따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이 추천하는 안정권 대학에 지원했다.
생각 없이 대학에 갔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뭘 배우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행정학도가 된 것이다. 같은 과 동기들은 대부분 9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다. 다들 그것 말고 딴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 공무원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였다. 한때 멋진 문장을 뽑아내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꿈꿔온 미래와 동떨어진 곳으로 잘못 와도 아주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퇴할까.” 아는 사람만 보면 덜컥 푸념을 늘어놓고 고달픈 기분에 취해서 지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유일한 희생양인 양 단단히 착각했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운명처럼 전공을 잘만 선택한 것 같았다. 왜 혼자만 실수한 건지 비참하고 억울했다. 그렇다고 전공을 바꾸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스무 살의 나는 자신이 가진 가능성보다 핑계를 앞세우는 녀석이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입대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웃긴 건, 학교와 달리 군대에선 생각을 강요했다는 거다. 우리 중대에선 신입 대원들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면, 소대장이 당직을 서는 날 밤에 집합을 시켰다. 그렇게 다목적실 책상에 소대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수와 아래 후임들까지 열두 명 남짓한 대원들이 둘러앉았다. 멘토링 명목으로 이루어지곤 했던 이 교양을, 나는 ‘꿈 강론 시간’이라고 불렀다.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 소대장은 한 명 한 명 시간을 들여 심문하듯 물었다. 음악을 하겠다는 이도, 비행기 조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여행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 모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소대장은 본인의 인생사를 읊었다.
어떤 환경에서 군인이 되었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은 아이가 몇이고, 어떤 차를 타는지까지. 삶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조금 달라진 눈빛으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꿈들을 하나씩 깨뜨리기에 나섰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돈을 못 벌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는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청춘들의 꿈을 찍어 눌렀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인지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생각 잘 해라.” 생각을 거듭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놔야 한다고 했다. 답답했다. 위로랍시고 건네는 무책임한 말에 화도 났다.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정작 군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제약이 무성했고,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엔 명령 같은 조언을 잠자코 듣고 있어야 했지만, 돌이켜 보니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막냇동생이 이제 고3이 된다. 내가 했던 걱정을 똑같이 품고서. 그 아이의 작은 몸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안쓰럽다.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녀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되려나. 생각을 가지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생각은 잠시 미뤄두라고 해야 할까.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심했다. 생각이야 어떻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보다는 네 마음 돌보기가 우선이라고 말해주기로. 나처럼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신을 더 사랑하길 바라며.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먼저야.”
생각 없이 대학에 갔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뭘 배우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행정학도가 된 것이다. 같은 과 동기들은 대부분 9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다. 다들 그것 말고 딴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 공무원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였다. 한때 멋진 문장을 뽑아내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꿈꿔온 미래와 동떨어진 곳으로 잘못 와도 아주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퇴할까.” 아는 사람만 보면 덜컥 푸념을 늘어놓고 고달픈 기분에 취해서 지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유일한 희생양인 양 단단히 착각했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운명처럼 전공을 잘만 선택한 것 같았다. 왜 혼자만 실수한 건지 비참하고 억울했다. 그렇다고 전공을 바꾸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스무 살의 나는 자신이 가진 가능성보다 핑계를 앞세우는 녀석이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입대를 하게 됐다. 그런데 웃긴 건, 학교와 달리 군대에선 생각을 강요했다는 거다. 우리 중대에선 신입 대원들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면, 소대장이 당직을 서는 날 밤에 집합을 시켰다. 그렇게 다목적실 책상에 소대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수와 아래 후임들까지 열두 명 남짓한 대원들이 둘러앉았다. 멘토링 명목으로 이루어지곤 했던 이 교양을, 나는 ‘꿈 강론 시간’이라고 불렀다.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 소대장은 한 명 한 명 시간을 들여 심문하듯 물었다. 음악을 하겠다는 이도, 비행기 조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여행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 모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소대장은 본인의 인생사를 읊었다.
어떤 환경에서 군인이 되었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은 아이가 몇이고, 어떤 차를 타는지까지. 삶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조금 달라진 눈빛으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꿈들을 하나씩 깨뜨리기에 나섰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돈을 못 벌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는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청춘들의 꿈을 찍어 눌렀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인지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생각 잘 해라.” 생각을 거듭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놔야 한다고 했다. 답답했다. 위로랍시고 건네는 무책임한 말에 화도 났다.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정작 군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제약이 무성했고,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엔 명령 같은 조언을 잠자코 듣고 있어야 했지만, 돌이켜 보니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막냇동생이 이제 고3이 된다. 내가 했던 걱정을 똑같이 품고서. 그 아이의 작은 몸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안쓰럽다.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녀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되려나. 생각을 가지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생각은 잠시 미뤄두라고 해야 할까.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심했다. 생각이야 어떻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보다는 네 마음 돌보기가 우선이라고 말해주기로. 나처럼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자신을 더 사랑하길 바라며.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먼저야.”
[913호 - 20's voice]
writer 독자 이건희 peter906@naver.com
#20's voice#에세이#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