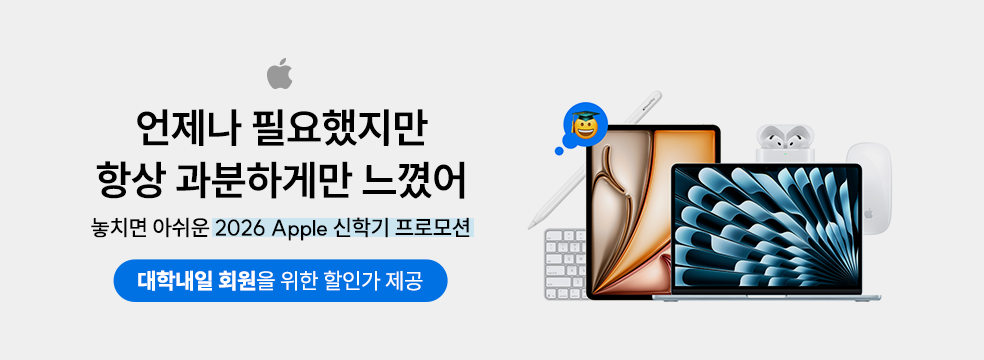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반했다 차인 이야기를 씁니다.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네.
가을방학의 노래 <취미는 사랑>의 후렴 구절이다. 그 노래를 듣던 사춘기 소녀는 자신의 취미가 만화책도 영화도 아닌 사랑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그리고 젊은 날의 취미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20대의 중턱에 올라서서 지난한 나의 취미생활들을 돌아보면 차라리 만화가 취미인 편이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수많은 애인에게 사랑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어쩐지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나름의 사랑을(혹은 그 비슷한 것을) 해오며 지울 수 없는 흑역사들을 방출해냈고, 시간과 체력과 눈물을 지금은 없는 그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렇게 스물다섯이 되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사랑은 몰라도 사랑이 아닌 것은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친구의 오빠이던 그는 나보다 여섯 살이 많았다. 6년 차이 정도 별 대수냐 싶지만 18세이던 내게 24살은 우러러볼 어른 같은 거였다. 나는 그와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좋기도 때론 싫기도 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다고 하니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 첫 키스도, 첫 성관계도, 연락의 빈도나 데이트의 횟수도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런 그와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20대로 막 접어들 무렵 내 연애를 지켜보던 한 (진짜)어른이 넌지시 물었다. “그 애가 널 정말 사랑하니?”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양이도 쥐를 사랑한다고 하더구나.”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내 삶이 가장 피폐했을 적 등장한 동창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내게 그의 존재는 마치 구원자였다. 그의 친절을 딛고 일어선 나는 그 열렬한 희생과 헌신에 감동하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사랑인가’라는 확신을 했었다.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사랑을 시작하려던 찰나, 그가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로 시작하는 무수한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배은망덕한 애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그가 내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구나.’
첫눈에 반해버린 기타리스트와의 첫 만남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했다. 정신없는 파티 한가운데에서 그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이름을 물었고 잔을 부딪쳤고, 소음을 핑계로 서로의 귀에 간지러운 말들을 속삭이다가 밖으로 나왔고, 꼭 영화처럼 밤거리를 쏘다니다가 입을 맞췄고, 운명적 사랑을 확신한 나는 그를 내 침대 위로 초대했다. 잠이 들며 이 일이 하룻밤 꿈처럼 끝나버리지 않길 기도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도 그는 내 옆에 있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이어갔고, 다음 만남도, 그 다음만남도 꼭 꿈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황홀함에 정신이 아득했다.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토해내듯 고백했을 때, 그의 대답은 어쩐지 뜨뜻미지근했다. 나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애하는 거 어때요?”라고 말했다. 그의 답은 “난 이미 연애를 하고 있고 당신과는 이렇게 노는 게 좋았어요. 그쪽도 그런 줄 알았는데......”였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또 한 번, 순간의 감정 그 짜릿함을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억울함에 이소라의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를 들으며 며칠 밤을 앓았다.
남성들과 만날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아달라던 대학 선배, 원치도 않는 선물 공세를 하곤 내가 사용하지 않음에 서운해하던 소개팅남, 자신의 지인들과 만날 땐 차려입어 줄 수 있겠느냐는 아는 오빠. 그들뿐만이 아니다. 상대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만나기를 요구했던 나, 헤어진 애인의 집 앞에 불쑥불쑥 찾아가던 나, 애인이 있다는 데도 내 마음만 줄줄이 쏟아내던 나, 집착하는 나, 소리치던 나, 주저앉아 울던 나. 무수한 나와 그들이 만나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할퀴고 상처를 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진짜 사랑도 존재했을 것이다.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과 따뜻한 포옹, 서로를 살게 하던 황홀한 말들 또한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내가 먹은 것들이 곧 나이듯, 내가 만난 사람들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집착을, 욕심을, 성적흥분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나를.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것인지 인간을 대하는 또 다른 인간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나를.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말한다. 진정한 사랑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생각하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른다.
Writer 김글빈 instagram@ye22bin
반했다 차인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에세이 기고 안내]
‘쓸 만한 인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학내일은 20대를 보내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솔직한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어느덧 20대의 중턱에 올라서서 지난한 나의 취미생활들을 돌아보면 차라리 만화가 취미인 편이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수많은 애인에게 사랑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어쩐지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나름의 사랑을(혹은 그 비슷한 것을) 해오며 지울 수 없는 흑역사들을 방출해냈고, 시간과 체력과 눈물을 지금은 없는 그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렇게 스물다섯이 되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사랑은 몰라도 사랑이 아닌 것은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친구의 오빠이던 그는 나보다 여섯 살이 많았다. 6년 차이 정도 별 대수냐 싶지만 18세이던 내게 24살은 우러러볼 어른 같은 거였다. 나는 그와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좋기도 때론 싫기도 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다고 하니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 첫 키스도, 첫 성관계도, 연락의 빈도나 데이트의 횟수도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런 그와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20대로 막 접어들 무렵 내 연애를 지켜보던 한 (진짜)어른이 넌지시 물었다. “그 애가 널 정말 사랑하니?”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양이도 쥐를 사랑한다고 하더구나.”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내 삶이 가장 피폐했을 적 등장한 동창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내게 그의 존재는 마치 구원자였다. 그의 친절을 딛고 일어선 나는 그 열렬한 희생과 헌신에 감동하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사랑인가’라는 확신을 했었다.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사랑을 시작하려던 찰나, 그가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로 시작하는 무수한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배은망덕한 애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그가 내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구나.’
첫눈에 반해버린 기타리스트와의 첫 만남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했다. 정신없는 파티 한가운데에서 그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이름을 물었고 잔을 부딪쳤고, 소음을 핑계로 서로의 귀에 간지러운 말들을 속삭이다가 밖으로 나왔고, 꼭 영화처럼 밤거리를 쏘다니다가 입을 맞췄고, 운명적 사랑을 확신한 나는 그를 내 침대 위로 초대했다. 잠이 들며 이 일이 하룻밤 꿈처럼 끝나버리지 않길 기도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도 그는 내 옆에 있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이어갔고, 다음 만남도, 그 다음만남도 꼭 꿈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황홀함에 정신이 아득했다.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토해내듯 고백했을 때, 그의 대답은 어쩐지 뜨뜻미지근했다. 나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애하는 거 어때요?”라고 말했다. 그의 답은 “난 이미 연애를 하고 있고 당신과는 이렇게 노는 게 좋았어요. 그쪽도 그런 줄 알았는데......”였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또 한 번, 순간의 감정 그 짜릿함을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억울함에 이소라의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를 들으며 며칠 밤을 앓았다.
남성들과 만날 때는 자신의 허락을 받아달라던 대학 선배, 원치도 않는 선물 공세를 하곤 내가 사용하지 않음에 서운해하던 소개팅남, 자신의 지인들과 만날 땐 차려입어 줄 수 있겠느냐는 아는 오빠. 그들뿐만이 아니다. 상대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만나기를 요구했던 나, 헤어진 애인의 집 앞에 불쑥불쑥 찾아가던 나, 애인이 있다는 데도 내 마음만 줄줄이 쏟아내던 나, 집착하는 나, 소리치던 나, 주저앉아 울던 나. 무수한 나와 그들이 만나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할퀴고 상처를 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진짜 사랑도 존재했을 것이다.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과 따뜻한 포옹, 서로를 살게 하던 황홀한 말들 또한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내가 먹은 것들이 곧 나이듯, 내가 만난 사람들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집착을, 욕심을, 성적흥분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나를.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것인지 인간을 대하는 또 다른 인간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나를.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말한다. 진정한 사랑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생각하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른다.
Writer 김글빈 instagram@ye22bin
반했다 차인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에세이 기고 안내]
‘쓸 만한 인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학내일은 20대를 보내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솔직한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20's voice#20대 에세이#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