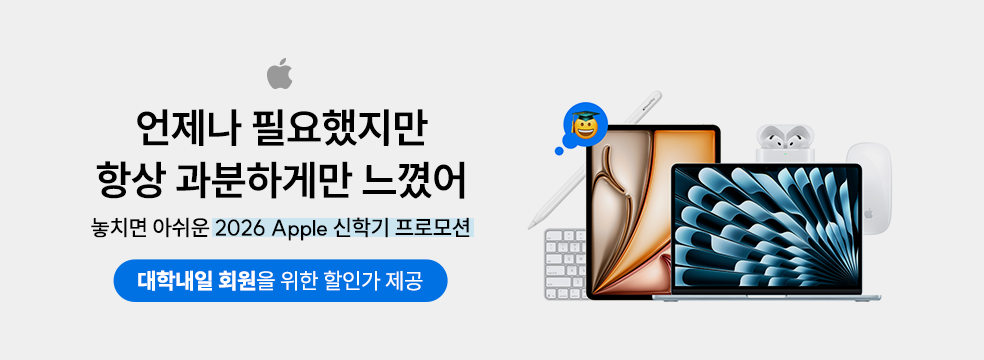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구김 없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구김이 없었다. 나는 그 친구가 부러웠던 것 같다.
‘연연하지 말자’
매년 새해가 되면, 내 다이어리 맨 위쪽 구석에 적히는 문구는 늘 똑같다.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 무색하게도 다이어리에는 지난 일을 뒤돌아보며 걱정하는 내가 곳곳에 숨어있지만. 아마 대학교 때부터 세웠던 목표였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있었다. 처음 만나자마자 알았다.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의 표본이구나. 구김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꼬아서 듣는 법도 없었고, 함부로 화를 내는 법도 없었다. 나는 그 친구가 부러웠던 것 같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담담함이 부러웠고, 괜히 맘속으로 되새기며 혼자 상처 받지도 않는 쿨함이 부러웠다. 나는 속이 좁아 네가 부럽다 말도 못했다. 이상하게 그 친구 옆에만 가면 초라해져서는 입을 꾹 다물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들을 건너보기만 하게 됐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연연해하는 것이 나의 ‘구김’이었다. 그 때부터 내 일기장에는 연연하지 말자는 문구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게 됐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나는 더욱 구겨진 어른이 됐다.
“너는 볼 때마다 참 바쁘게 산다.” 바쁜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바쁘게 살고 싶어서 바쁘냐. 반사적으로 항의하려다 말고 문득 멈췄다. 미간에는 잔뜩 주름이 져있었을 것이다. 그 때만큼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까. 물론 그 말에 비아냥이 섞여있었다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친구의 목소리에는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담뿍 담겨있었다. 그런 친구에게 불쑥 화를 내려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만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려던 말을 삼키고 나는 친구에게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몇 정거장 전에 내려 한참을 걸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쿨하지 못하다. 언쿨(Uncool)에 가깝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돌이켜보며 ‘아, 그때 그말은 하지말 걸’ 후회하는 편이다. 기분이 나빴던 일들은 집에 와서 곱씹어본다. 그리고는 기분이 더 나빠져 ‘에이, 관두자’ 하고는 이불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만다. 가끔은 우울함을 못 견디고 충동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내 조각들 하나하나가 나의 구김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내가 미친 듯이 싫어질 때도 있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몇 십 년을 살다보니 나에게 정이 들었다는 것이 좀 더 맞는 말이 되겠다. 부러워할 수도 있지. 내가 못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 나 자신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과정에는 내 구김을 포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옷도 조금만 움직이면 구겨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생은 내게 ‘자기중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 자신을 찾아보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거라고 덧붙여줬다. 그러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였다. 구김 없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목표일 테지만, 구김 없다는 말의 다른 뜻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유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닐까. 내년부터는 다이어리에 목표를 바꿔 적어 볼까 한다. 나는 담백하게 나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Writer 마고
26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내 다이어리 맨 위쪽 구석에 적히는 문구는 늘 똑같다. 연연하지 말자는 것이 무색하게도 다이어리에는 지난 일을 뒤돌아보며 걱정하는 내가 곳곳에 숨어있지만. 아마 대학교 때부터 세웠던 목표였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있었다. 처음 만나자마자 알았다.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의 표본이구나. 구김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꼬아서 듣는 법도 없었고, 함부로 화를 내는 법도 없었다. 나는 그 친구가 부러웠던 것 같다. 화를 낼 만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담담함이 부러웠고, 괜히 맘속으로 되새기며 혼자 상처 받지도 않는 쿨함이 부러웠다. 나는 속이 좁아 네가 부럽다 말도 못했다. 이상하게 그 친구 옆에만 가면 초라해져서는 입을 꾹 다물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들을 건너보기만 하게 됐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연연해하는 것이 나의 ‘구김’이었다. 그 때부터 내 일기장에는 연연하지 말자는 문구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게 됐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나는 더욱 구겨진 어른이 됐다.
“너는 볼 때마다 참 바쁘게 산다.” 바쁜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바쁘게 살고 싶어서 바쁘냐. 반사적으로 항의하려다 말고 문득 멈췄다. 미간에는 잔뜩 주름이 져있었을 것이다. 그 때만큼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까. 물론 그 말에 비아냥이 섞여있었다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친구의 목소리에는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담뿍 담겨있었다. 그런 친구에게 불쑥 화를 내려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만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려던 말을 삼키고 나는 친구에게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몇 정거장 전에 내려 한참을 걸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쿨하지 못하다. 언쿨(Uncool)에 가깝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돌이켜보며 ‘아, 그때 그말은 하지말 걸’ 후회하는 편이다. 기분이 나빴던 일들은 집에 와서 곱씹어본다. 그리고는 기분이 더 나빠져 ‘에이, 관두자’ 하고는 이불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만다. 가끔은 우울함을 못 견디고 충동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내 조각들 하나하나가 나의 구김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내가 미친 듯이 싫어질 때도 있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몇 십 년을 살다보니 나에게 정이 들었다는 것이 좀 더 맞는 말이 되겠다. 부러워할 수도 있지. 내가 못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 나 자신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과정에는 내 구김을 포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옷도 조금만 움직이면 구겨지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생은 내게 ‘자기중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 자신을 찾아보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거라고 덧붙여줬다. 그러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였다. 구김 없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목표일 테지만, 구김 없다는 말의 다른 뜻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유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닐까. 내년부터는 다이어리에 목표를 바꿔 적어 볼까 한다. 나는 담백하게 나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Writer 마고
26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에세이#고민#어른이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