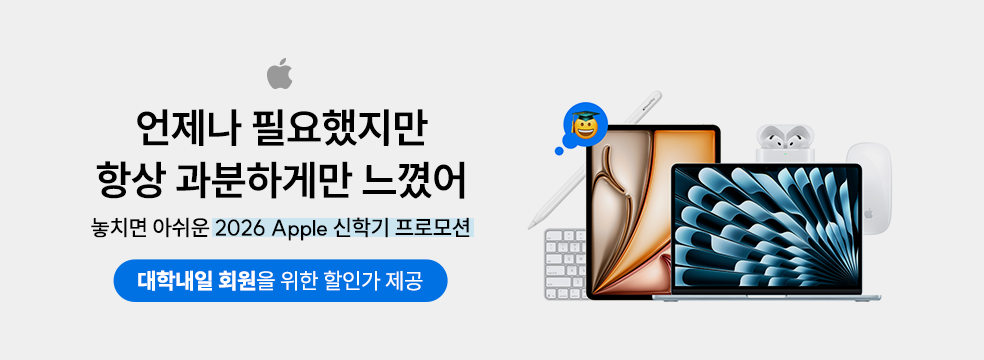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학교에 더 이상 동기들이 없다
작정해야만 볼 수 있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지
첫 실기 수업이 있던 1학년 가을, 작업실에서 나오면 항상 흡연구역으로 향했다. 담배를 피지는 않았지만, 흡연구역 근처에 동기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 왔냐.” 하는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우리는 서로 그 곳에서 만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
‘취업을 하고 나면 이런 만남도 힘들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 말이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 동기들이 보이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카페에서도 옆 자리를 내어줄 친구가 하나쯤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끝난 날, 우울한 기분에 술을 마시고 싶을 땐 작업실로 향했다. 같이 소주병을 열어 줄 친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교수님을 원망하기도, 못난 내 솜씨를 탓하기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수업이 끝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우리는 어느새 테이블 한 줄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역 이후 다시 만난 학교는 전혀 달랐다.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빠르면 조기졸업을 하기도 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카페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 일쑤였다. 혹시나 옥상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 올라가 보면, 또 다른 1학년들이 그 때의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땐 복학생들이 있었다. 마주치긴 어렵지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도 생각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내다 보니, 내가 그리워했던 흡연구역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내가 휴학을 하기 전까진 말이다.

인턴 생활과 개인적인 공부로 2년을 보내고 복학 신청을 했다. 취업 전 마지막 학교 생활인만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대학교에서 2년이란 전공 수업의 이름이 바뀌고, 교수님이 바뀔 정도의 시간이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나뿐이었다. 작업실 옆은 금연구역이 된 지 오래였다.
간만에 카톡을 열어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다. 일주일 뒤로 약속을 잡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채 둘을 넘기지 못했다. 바쁘거나, 어색해졌거나, 불편하거나 각자의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듯, 작업실 옆 흡연구역으로 향하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카톡을 보내도 만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어느새 작정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졸업하면 만나기 어려워져.”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졸업이 만나기 어려워지는 계기인 게 아니라, 그저 대학생 시절이 만나기 쉬웠던 시절 같다. 작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한 사이여서라기보다 작정하지 않아도 늘 옆에 있었으니까.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마음 먹으면 만날 수 있음을 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때처럼 편하게 만날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 가끔씩 개강 총회에서 서로를 처음 본 순간을 생각한다. 너무도 다르지만 가까워졌던 사람들. 흡연구역 앞에서 만나는 서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한다. 나는 그때가 그립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 이렇게 작정해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줄 알았다면 더 가까워지려 노력해 볼 걸. 그때는 흡연구역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했다.
Writer 최광래
11학번.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서 10년째 대학생인, 10년차 대학생
‘취업을 하고 나면 이런 만남도 힘들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 말이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 동기들이 보이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카페에서도 옆 자리를 내어줄 친구가 하나쯤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끝난 날, 우울한 기분에 술을 마시고 싶을 땐 작업실로 향했다. 같이 소주병을 열어 줄 친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교수님을 원망하기도, 못난 내 솜씨를 탓하기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수업이 끝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우리는 어느새 테이블 한 줄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역 이후 다시 만난 학교는 전혀 달랐다.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빠르면 조기졸업을 하기도 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카페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 일쑤였다. 혹시나 옥상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 올라가 보면, 또 다른 1학년들이 그 때의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땐 복학생들이 있었다. 마주치긴 어렵지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도 생각 이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내다 보니, 내가 그리워했던 흡연구역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내가 휴학을 하기 전까진 말이다.

인턴 생활과 개인적인 공부로 2년을 보내고 복학 신청을 했다. 취업 전 마지막 학교 생활인만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대학교에서 2년이란 전공 수업의 이름이 바뀌고, 교수님이 바뀔 정도의 시간이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나뿐이었다. 작업실 옆은 금연구역이 된 지 오래였다.
간만에 카톡을 열어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다. 일주일 뒤로 약속을 잡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채 둘을 넘기지 못했다. 바쁘거나, 어색해졌거나, 불편하거나 각자의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놀이터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듯, 작업실 옆 흡연구역으로 향하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카톡을 보내도 만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어느새 작정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졸업하면 만나기 어려워져.”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졸업이 만나기 어려워지는 계기인 게 아니라, 그저 대학생 시절이 만나기 쉬웠던 시절 같다. 작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한 사이여서라기보다 작정하지 않아도 늘 옆에 있었으니까.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마음 먹으면 만날 수 있음을 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때처럼 편하게 만날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 가끔씩 개강 총회에서 서로를 처음 본 순간을 생각한다. 너무도 다르지만 가까워졌던 사람들. 흡연구역 앞에서 만나는 서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한다. 나는 그때가 그립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 이렇게 작정해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줄 알았다면 더 가까워지려 노력해 볼 걸. 그때는 흡연구역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했다.
Writer 최광래
11학번.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서 10년째 대학생인, 10년차 대학생
#에세이#복학#인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