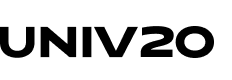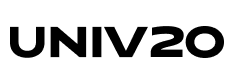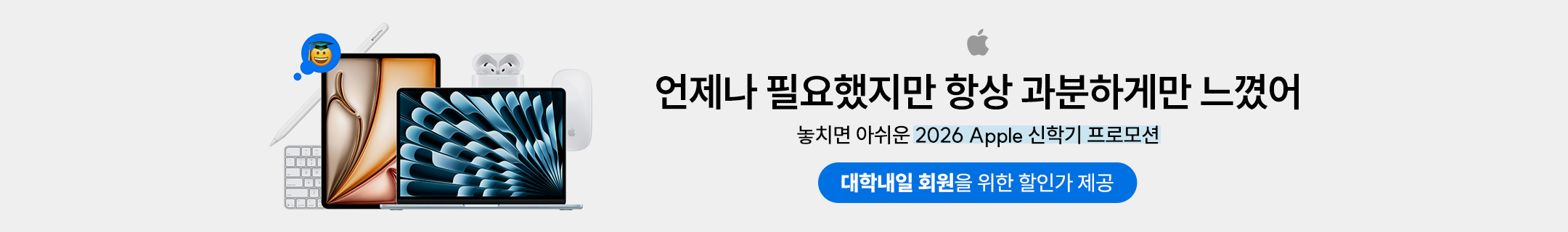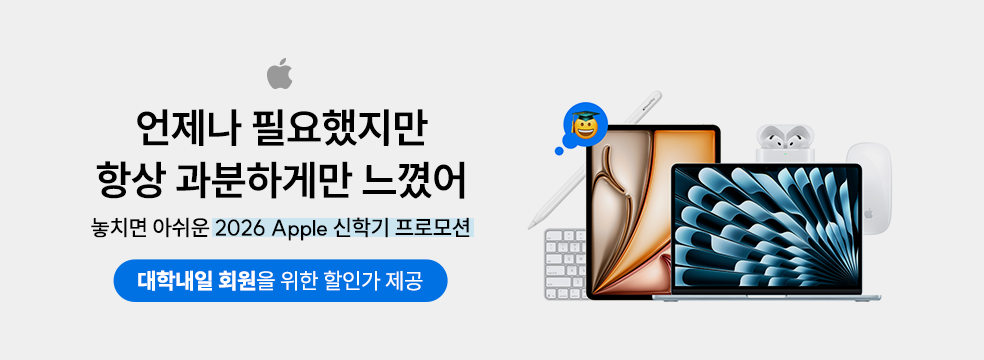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그렇다고 아빠랑 남처럼 살 순 없잖아요
방학엔 고향에 내려와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가장 진부한 자기소개서의 도입으로 ‘엄하신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고…’가 꼽힌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만큼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딱딱한 이미지에 갇혀있다는 뜻일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하고 늦게 귀가하느라 피곤에 지쳐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여력도 없었을 테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인 만큼 바깥에서 쓰고 다니던 사회적 가면을 벗고 행동하게 된다.
성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아빠가 가부장적이다.’ 고 말하면 반응이 그저 그렇지만 ‘대구 출신 아버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랐다.’ 고 하면 다들 이해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보낸다. 대학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나만의 주관을 형성해가기 시작했지만, 아빠는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은퇴를 하고 시골에 칩거하면서 허구한 날 전화를 걸어 1시간씩 일방적인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방학엔 고향에 내려와 소위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제는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과제를 할 정도였다.
어느 날은 몇 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자취방까지 올라오셨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급하게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냄비의 물이 끓다 못해 넘치듯이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아빠의 횡포와 그로 인한 서운함을 다 털어놓았다. 아빠는 그렇게 다 내 탓만 할 거면 연을 끊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방향을 잃은 내 말들만 덩그러니 빈방에 남았다. 여전히 아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였다. 젊음의 용기도 아빠의 철옹성 같은 고집 앞에선 소용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빠도 나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내 일상에서 아빠의 존재가 희미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길거리에서 취객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다. 혼자 고생할 엄마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합리화를 하며 안동병원으로 향했다. 6인실 구석에 아빠의 이름표가 보였다. 골반 뼈 골절이라고 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십 년은 늙은 듯한 아빠의 어깨는 병원복 안에서 더 처지고 작아보였다. 평소와 달리 아빠 앞에 선 내가 커진 느낌이었다. 얼굴을 비췄으니 다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아빠가 “온 김에 자고가라.”라고 한 마디를 내뱉었다. 잠깐 서 있다가 병실을 나섰다.
아빠와 쉽게 화해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속의 작은 꼬마가 조금은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동안 묵혀둔 앙금과 섭섭함을 풀려면 몇 번의 언쟁과 소리 없는 싸움이 더 이어지겠지만…. 영 희망이 없어보이진 않는다.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누가 어디서 변을 당하면 다 같이 발 벗고 나서는 사이. 해묵은 감정을 들춰내가며 계속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사이.
Writer 지수
26세,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써요.
성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아빠가 가부장적이다.’ 고 말하면 반응이 그저 그렇지만 ‘대구 출신 아버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랐다.’ 고 하면 다들 이해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보낸다. 대학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나만의 주관을 형성해가기 시작했지만, 아빠는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은퇴를 하고 시골에 칩거하면서 허구한 날 전화를 걸어 1시간씩 일방적인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방학엔 고향에 내려와 소위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이제는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과제를 할 정도였다.
어느 날은 몇 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자취방까지 올라오셨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급하게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냄비의 물이 끓다 못해 넘치듯이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아빠의 횡포와 그로 인한 서운함을 다 털어놓았다. 아빠는 그렇게 다 내 탓만 할 거면 연을 끊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방향을 잃은 내 말들만 덩그러니 빈방에 남았다. 여전히 아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였다. 젊음의 용기도 아빠의 철옹성 같은 고집 앞에선 소용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빠도 나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내 일상에서 아빠의 존재가 희미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길거리에서 취객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다. 혼자 고생할 엄마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합리화를 하며 안동병원으로 향했다. 6인실 구석에 아빠의 이름표가 보였다. 골반 뼈 골절이라고 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십 년은 늙은 듯한 아빠의 어깨는 병원복 안에서 더 처지고 작아보였다. 평소와 달리 아빠 앞에 선 내가 커진 느낌이었다. 얼굴을 비췄으니 다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아빠가 “온 김에 자고가라.”라고 한 마디를 내뱉었다. 잠깐 서 있다가 병실을 나섰다.
아빠와 쉽게 화해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속의 작은 꼬마가 조금은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동안 묵혀둔 앙금과 섭섭함을 풀려면 몇 번의 언쟁과 소리 없는 싸움이 더 이어지겠지만…. 영 희망이 없어보이진 않는다.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누가 어디서 변을 당하면 다 같이 발 벗고 나서는 사이. 해묵은 감정을 들춰내가며 계속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사이.
Writer 지수
26세,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써요.
#대학생에세이#가족#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