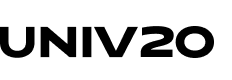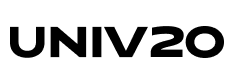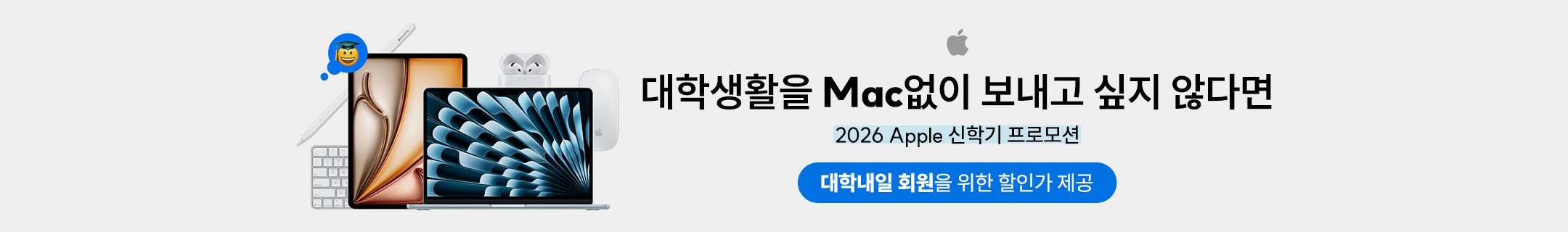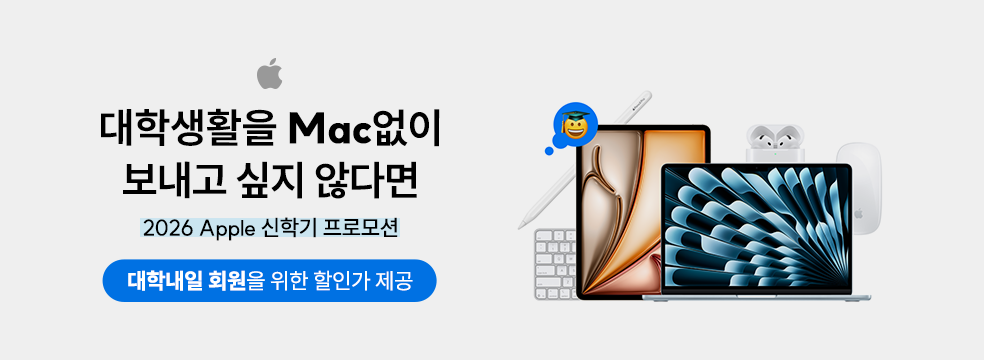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사회생활의 첫걸음, 자취
혼자 산다는 것은 건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취(自炊)’란 스스로(自) 불 때며 밥 지어 먹는(炊) 것이다. 말 자체로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내며 손수 밥을 지어 먹는 것이지만, 요점은 결국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생활 전체를 말한다. 기숙사는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하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기숙사 배정에서 탈락해 다른 집을 구해 살게 되면 이를 자취라 한다.
그러나 ‘자취’는 손수 밥 지어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발 뻗고 잘 권리’가 가능할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자취’란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최소 몇 평 이상이어야 살만한지, 햇볕은 잘 들어오는지, 통풍은 잘 되는지, 밥해 먹을 취사도구와 열원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모두 ‘집’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취하는 대학생의 삶은 딱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자취’란 자유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내 방을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으며 친구를 초대하여 같이 잘 수도 있다. 자취란 가족이나 동거인이 없이 혼자 독신자 생활하는 생활 전체다. 자취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생활이지만 그렇다고 고립은 아니다. 자취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회에 살아가는 나의 첫걸음이고,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자립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도시란 집이 잔뜩 모인 곳이 아니다. 도시란 본래 서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곳이고, 한데 모여 살기 어려운 이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 어느 사람이나 움직이면서도 정착할 곳을 찾는 게 도시다. 따라서 자취하며 혼자 산다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가족과 함께 나서지 않는다. 혼자서 걸어 나와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가? 지하철 요금도 한 사람을 단위로 내고, 숙박시설도 한 사람이 점유하는 값으로 낸다. 사회는 이미 한 사람을 단위로 상품화되어 버린 지 오래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근대화로 땅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이 해체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핵가족도 어느덧 개인 생활자로 해체되었다. 맞벌이 부부, 고령화, 비혼, 또 학업이나 취업으로 홀로 사는 세대가 늘어났다. 도시는 홀로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가족, 기업, 근린 공동체라는 중간 집단을 거치지 않는다. 그 대신 외부에, 도시에 그대로 의존한다. 대도시의 편의점, 피시방, 음식점 등 24시간 영업하는 상업 시설은 모두 혼자 이동하는 이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다.
통상 건축에서는 ‘모두’, ‘함께’, ‘공동체’, ‘연결’ 등을 중시하지만, ‘혼자’, ‘독거’는 분단되고 이질적인 타자들의 고립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혼밥, 혼술, 혼영, 혼행, 혼핑, 혼놀 등 ‘나 홀로 문화’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도시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이상해할 것 없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나 홀로 생활 양식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자 하는 생활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나만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아니겠는가? 혼자 있는 장소와 공간, 그것은 가장 작은 ‘주택’에 대한 갈망이다.

‘자취’? 그것은 스스로 불 때며 밥 지어 먹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다. ‘자취’는 도시 한가운데 사는 고독한 생활 같은 것이 아니다. 도시 안에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주변을 향해 어떤 장소와 공간을 펼쳐야 하는가를 배우는 더없는 기회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며 자기 삶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나’를 발견하고,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사회적 개인주의자’의 장소를 터득하는 시간. 그것은 ‘자취’에서 시작한다.
Writer. 김광현 명예교수
김광현 명예교수는 2018년까지 42년간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의 공동성(共同性, commonness)에 기초한 건축의장과 건축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건축학도들의 큰 스승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축계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이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충청남도 총괄건축가, 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그러나 ‘자취’는 손수 밥 지어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발 뻗고 잘 권리’가 가능할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자취’란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최소 몇 평 이상이어야 살만한지, 햇볕은 잘 들어오는지, 통풍은 잘 되는지, 밥해 먹을 취사도구와 열원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모두 ‘집’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취하는 대학생의 삶은 딱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자취’란 자유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내 방을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으며 친구를 초대하여 같이 잘 수도 있다. 자취란 가족이나 동거인이 없이 혼자 독신자 생활하는 생활 전체다. 자취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생활이지만 그렇다고 고립은 아니다. 자취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회에 살아가는 나의 첫걸음이고,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자립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근대화로 땅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이 해체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핵가족도 어느덧 개인 생활자로 해체되었다. 맞벌이 부부, 고령화, 비혼, 또 학업이나 취업으로 홀로 사는 세대가 늘어났다. 도시는 홀로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가족, 기업, 근린 공동체라는 중간 집단을 거치지 않는다. 그 대신 외부에, 도시에 그대로 의존한다. 대도시의 편의점, 피시방, 음식점 등 24시간 영업하는 상업 시설은 모두 혼자 이동하는 이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다.
통상 건축에서는 ‘모두’, ‘함께’, ‘공동체’, ‘연결’ 등을 중시하지만, ‘혼자’, ‘독거’는 분단되고 이질적인 타자들의 고립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혼밥, 혼술, 혼영, 혼행, 혼핑, 혼놀 등 ‘나 홀로 문화’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도시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이상해할 것 없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나 홀로 생활 양식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자 하는 생활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나만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아니겠는가? 혼자 있는 장소와 공간, 그것은 가장 작은 ‘주택’에 대한 갈망이다.

‘자취’? 그것은 스스로 불 때며 밥 지어 먹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다. ‘자취’는 도시 한가운데 사는 고독한 생활 같은 것이 아니다. 도시 안에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주변을 향해 어떤 장소와 공간을 펼쳐야 하는가를 배우는 더없는 기회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며 자기 삶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나’를 발견하고,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사회적 개인주의자’의 장소를 터득하는 시간. 그것은 ‘자취’에서 시작한다.
Writer. 김광현 명예교수
김광현 명예교수는 2018년까지 42년간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의 공동성(共同性, commonness)에 기초한 건축의장과 건축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건축학도들의 큰 스승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축계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이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충청남도 총괄건축가, 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건축학과#김광현 명예교수#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