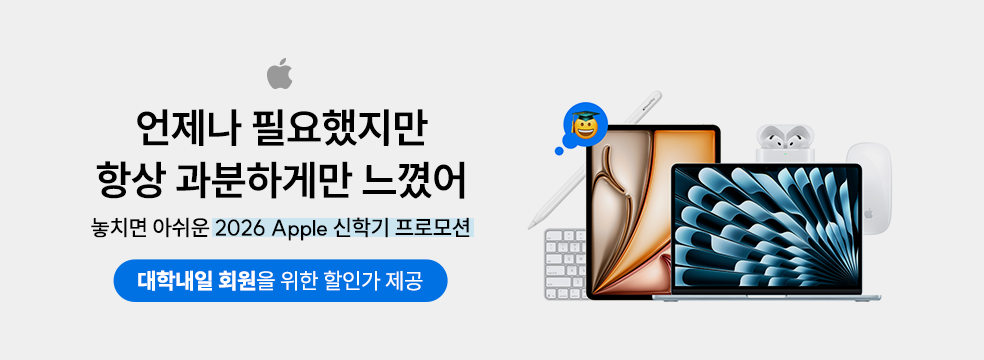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적어도 이 단칸방 하나의 무게는 내가 이고 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므로
오늘도 아무도 없는 자취방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나간다.
겨울방학이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 한파로 인해 새빨개진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곳은 나의 첫 자취방. 빈집인 채 있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기본으로 놓인 침대와 책상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제 내 색으로 가득 채워갈 공간. 잘 지내보자, 우리. 바닥에 냅다 누워 그렇게 결심했었다. 분명 그렇게 결심했었다.
다른 사람들의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예쁜 가구나 오브제를 저장해 두며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다. 집에서 계속 쓰던 이불을 가져다 뒀고, 아침에 햇빛이 너무도 들이치는 창을 가리기 위해 붙여둔 포스터와 빨래 건조대만 놓아도 꽉 차는 것이 내 방의 인테리어였다.
요리를 해 먹을 생각도 했다. 온갖 레시피를 기억해 두고 식재료를 사 오기도 했다. 초보 자취생의 치기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밖에서 밥을 먹는 시간도 많을뿐더러, 집에 오는 길엔 이미 지쳐 프라이팬을 들 힘조차 없어 침대로 직행하여 엎어지는 날이 늘었다. 배가 고파도 먹을 여력이 없고, 요리라고 해봤자 라면 물이나 올리는 신세였다.

반찬 좀 보내주세요. 본가에 보낸 작은 투정에 돌아온 반찬들을 갓 지은 밥이 아닌 갓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 위에 올려 먹는 것이 내 최고의 식사였다. 냉장고 안에서 시들어 가던 양배추가 온전히 늘어져 나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쯤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보내준 이후, 요리에 대한 열망은 더욱 사그라들었다.
자유다!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에 들었던 생각이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온전한 나의 공간, 통금이 없는 자유로운 삶. 혼자인 것이 좋았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이어졌다. 방을 바로 치우지 않아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본가의 강아지처럼 네 발로 자취방으로 돌아와도 통제가 없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어느 순간에는 혼자가 싫어질 수도 있었다.
늦은 시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를 맞이하는 불 꺼진 집이 서러웠다. 혼자 아플 때면 땀에 푹 젖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서 약조차 사러 가지 못하고 운 날도 있었다. 밀린 집안일은 아무리 바빠도 온전한 나의 책임이었고, 가끔 문밖에서 덜커덕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었다.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다 보면 이 좁은 원룸이 괜스레 넓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그 방의 여백은 온전히 새벽에 찾아온 미래와 삶에 대한 고민으로만 가득 차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이 자취촌의 자취방마다 가득 찬 자취생들의 고민은 셀 수 없이 다양할 거고, 비슷해도 온전히 같은 고민은 없겠지. 모두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잘 지내니 하는 가족들의 물음에는 늘 당찬 목소리로 잘 지내요. 하고 답하고 있었다. 내가 힘들다며 응석을 부리고 투정하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보란 듯 살아내야지. 적어도 이 단칸방 하나의 무게는 내가 이고 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므로. 작은 단칸방이지만, 1인 가구지만 가장인 내가 기특하다. 오늘도 아무도 없는 자취방 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간다. 그래도 내가 돌아올 곳이니까.
Writer. 윤이정
돌아보면 찬란하게 반짝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예쁜 가구나 오브제를 저장해 두며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다. 집에서 계속 쓰던 이불을 가져다 뒀고, 아침에 햇빛이 너무도 들이치는 창을 가리기 위해 붙여둔 포스터와 빨래 건조대만 놓아도 꽉 차는 것이 내 방의 인테리어였다.
요리를 해 먹을 생각도 했다. 온갖 레시피를 기억해 두고 식재료를 사 오기도 했다. 초보 자취생의 치기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밖에서 밥을 먹는 시간도 많을뿐더러, 집에 오는 길엔 이미 지쳐 프라이팬을 들 힘조차 없어 침대로 직행하여 엎어지는 날이 늘었다. 배가 고파도 먹을 여력이 없고, 요리라고 해봤자 라면 물이나 올리는 신세였다.

자유다!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에 들었던 생각이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온전한 나의 공간, 통금이 없는 자유로운 삶. 혼자인 것이 좋았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이어졌다. 방을 바로 치우지 않아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본가의 강아지처럼 네 발로 자취방으로 돌아와도 통제가 없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어느 순간에는 혼자가 싫어질 수도 있었다.
늦은 시간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를 맞이하는 불 꺼진 집이 서러웠다. 혼자 아플 때면 땀에 푹 젖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서 약조차 사러 가지 못하고 운 날도 있었다. 밀린 집안일은 아무리 바빠도 온전한 나의 책임이었고, 가끔 문밖에서 덜커덕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었다.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다 보면 이 좁은 원룸이 괜스레 넓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그 방의 여백은 온전히 새벽에 찾아온 미래와 삶에 대한 고민으로만 가득 차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이 자취촌의 자취방마다 가득 찬 자취생들의 고민은 셀 수 없이 다양할 거고, 비슷해도 온전히 같은 고민은 없겠지. 모두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잘 지내니 하는 가족들의 물음에는 늘 당찬 목소리로 잘 지내요. 하고 답하고 있었다. 내가 힘들다며 응석을 부리고 투정하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보란 듯 살아내야지. 적어도 이 단칸방 하나의 무게는 내가 이고 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므로. 작은 단칸방이지만, 1인 가구지만 가장인 내가 기특하다. 오늘도 아무도 없는 자취방 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간다. 그래도 내가 돌아올 곳이니까.
Writer. 윤이정
돌아보면 찬란하게 반짝일 우리
#20's voice#대학생 에세이#겨울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