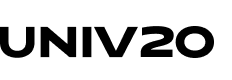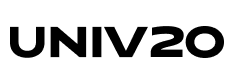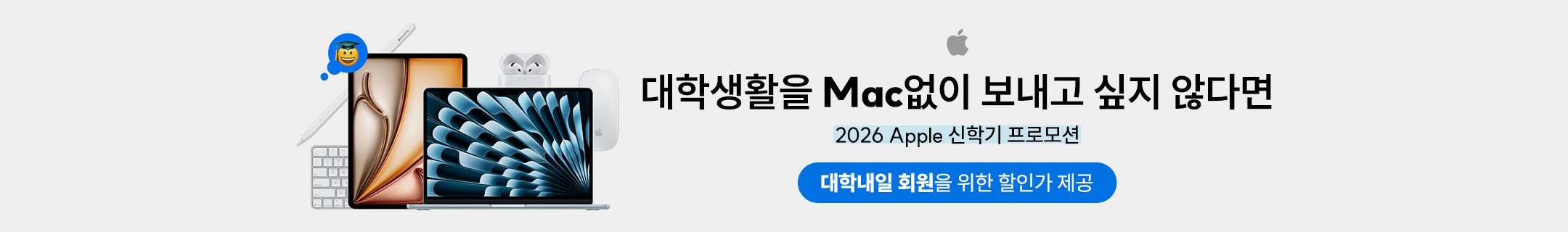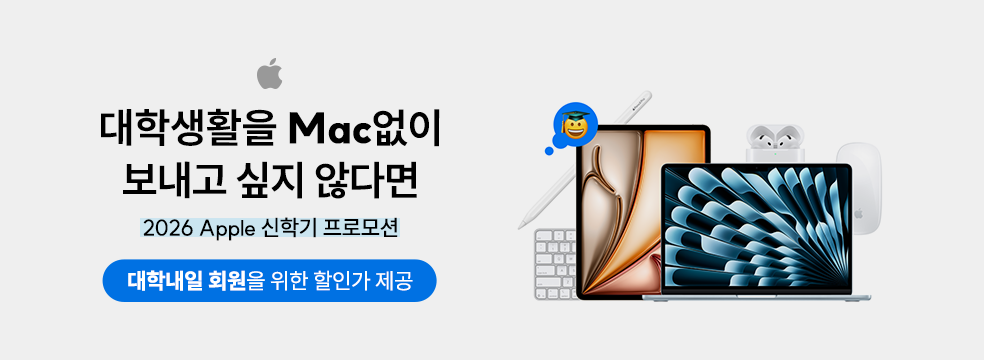대학내일
밥약 걸기 전,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희대 선배들의 경험담으로 알려주는 밥약 기준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에 <밥약 거는 기준 딱 말해줄게>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밥 먹자고 약속을 거는 행위, 즉 '밥약'의 적정선을 정리한 5가지 기준을 안내했다. 이 게시글은 많은 공감을 얻으며 경험담을 담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 밥약 걸기 전,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자 📌(출처: <밥약 거는 기준 딱 말해줄게>, 경희대 에브리타임(2025.3.19))1. 만난 지 최소 3번은 돼야 함2. 서로 말을 놨을 때3.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일 때4. "얻어먹자" 마인드는 금지5. 돈 없다고 말한 선배에겐 밥약 금물
이 글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밥약을 어렵게 느끼는 재학생과 새내기 모두의 마음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밥약은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문화지만, 막상 하려면 늘 애매하다. 누군가는 밥약을 어디까지가 예의고 어디부터가 부담인지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선배에게 밥약을 걸어도 되는 시점조차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밥약을 걸어도 될까?” 고민하던 이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 위 글에서 제시한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밥약의 기준선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밥약을 걸기 직전이라면, 이 글이 딱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1. 만난 지 최소 3번은 돼야 함
밥약 가능한 사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처음 보는 선배들 보고 밥약 걸고 다녔던 철없는 시절이 생각나네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대접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 댓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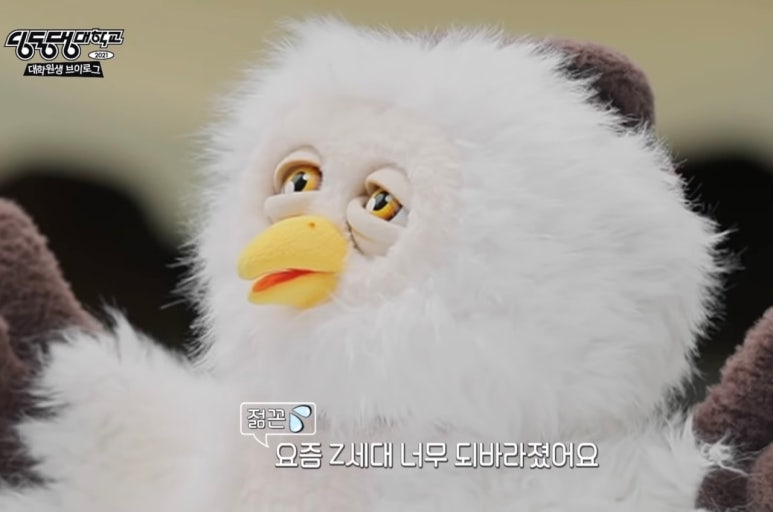
갓 새내기들이 선배들한테 밥약을 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처음 보는 선배한테 밥약을 걸라니 내가 너무 빠른 건가 싶고, 두 번 봤을 땐 아직 어색하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다. 작성자는 "세 번은 봐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이라는 숫자, 어쩌면 제법 절묘하다. 엄마도 “한 숟갈은 너무 적고, 두 숟갈은 정 없으니 세 숟갈만 먹으라.”고 말하신다.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세 번쯤 마주쳤다면, 이제는 밥 한 끼를 함께해도 어색하지 않을 시점이라는 뜻이다.
📌 Tip: 밥약은 랜덤 매칭이 아니다. 세 번쯤 봤다면, 슬슬 말 걸어도 괜찮다.
2. 서로 말을 놨을 때
어색한 존댓말 사이에 밥약은 시기상조!
“그래서 난 나랑 친해지는 후배 아니면 밥약 잘 안 해줌." (에브리타임 댓글 中)

밥약은 인터뷰가 아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간 거지, 긴장 속에서 질문에 답하러 간 게 아니다. 하지만 말을 놓지 않은 사이의 밥약은 그냥 '어색한 대화 연습장'이 되기 쉽다. "선배는 어떤 전공이시죠…?”, “아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이쯤 되면 밥보다 긴장이 더 많이 씹힌다.
그래서 작성자는 “서로 말을 놨을 때만 밥약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쪽은 ‘~입니다.’로 존댓말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ㅋㅋ 그거 맞아.’ 같은 반말 톤이라면 무게 중심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말을 트는 건 작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그걸 계기로 서로의 리듬이 맞기 시작하고, 밥도 대화도 훨씬 부드럽게 넘어간다.
📌 Tip: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관계는 천천히 익는 게 더 오래 간다.
3.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일 때
다시 볼 사이 아니면 의미 없음
"그냥 상대방 선배가 자기 좀 좋아하는 것 같으면(친해지면) 거는 게 맞음." (에브리타임 댓글 中)

밥약은 한 끼 때우고 끝이 아니다. 그 한 끼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처음에는 그냥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밥 한번 먹어요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보단 어색함만 덧칠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작성자는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밥약을 걸라.”고 말한다.
진심은 알겠는데… 오티 때 한 번 마주친 선배에게 밥약을 건다는 건,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밥은 먹어 보자에 가까운 이야기다. 상대도 나도, 둘 다 그 밥의 의미를 짚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그럼 남는 건, 어색함 뿐이다. 다신 안 볼 사이였다는 걸 밥 먹고 나서 알게 되는 그 순간, '굳이 이 약속을 왜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는다.
📌 Tip: '한 번'보다 '앞으로'를 위한 약속이 중요하다. 그리고 밥은 이어질 관계에서, 제 맛이 난다.
4. "얻어먹자" 마인드는 금지
선배가 사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기들끼리 도망간 24학번 2명 기억하고 있다.” (에브리타임 댓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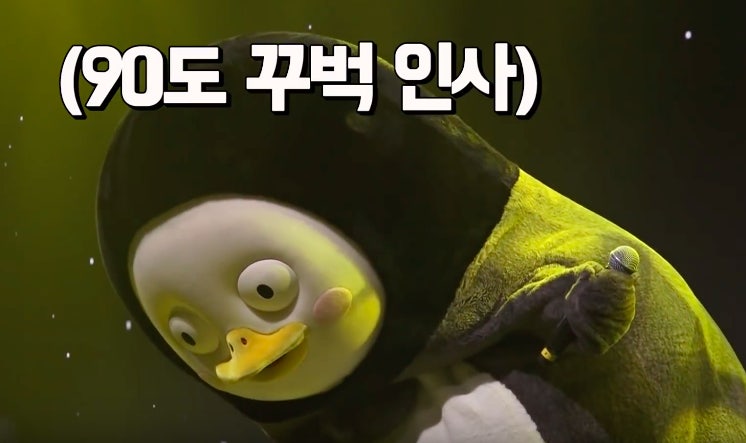
밥약에서 가장 예민한 순간은 바로 계산대 앞이다. 말은 안 해도, 그 몇 초 사이에 서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작성자는 “얻어먹으려는 마음가짐은 금지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선배가 밥을 사주는 문화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걸 당연하다는 전제로 밥약을 건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다. 일방적인 부탁이고, 어쩌면 선배 입장에선 살짝 당한 기분마저 들 수 있다.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기들끼리 도망간 새내기들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댓글, 처음엔 웃기지만 가만 보면 정말 서운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 Tip: 밥약은 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도, 눈치는 항상 챙기자.
5. 돈 없다고 말한 선배에겐 밥약 금물
사정 아는 사이엔 밥보다 배려가 먼저다
"학기 내내 돈 없다고 계속 말했는데, 새내기가 갑자기 밥약 걸더라. 진짜 고맙긴 했는데… 솔직히 좀 부담됐음." (에브리타임 댓글 中)

가끔은 진심도 부담이 된다. 특히 상대가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성자는 마지막 기준으로 “돈 없다고 말한 선배에게 밥약을 걸지 말자.”고 말한다.
후배 입장에서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배는 내가 얻어 먹으니 어색하고, 사주자니 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일지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 호의에 더 미안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선배가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있거나, 최근에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게 식사라는 형식으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진심은 반드시 '밥'이라는 형태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 Tip: 밥약은 상냥한 배려로 걸고, 사정은 눈치로 알아채자.
밥약은 가볍게 던진 인사말이 아니다. 그 안엔 거리감, 진심, 예의, 배려가 담겨 있다. 많은 경희대생들이 공감한 이 다섯 가지 기준은, 밥약이라는 이름의 관계 온도를 재는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고요?”
그 말, 진심으로 꺼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까워졌는지부터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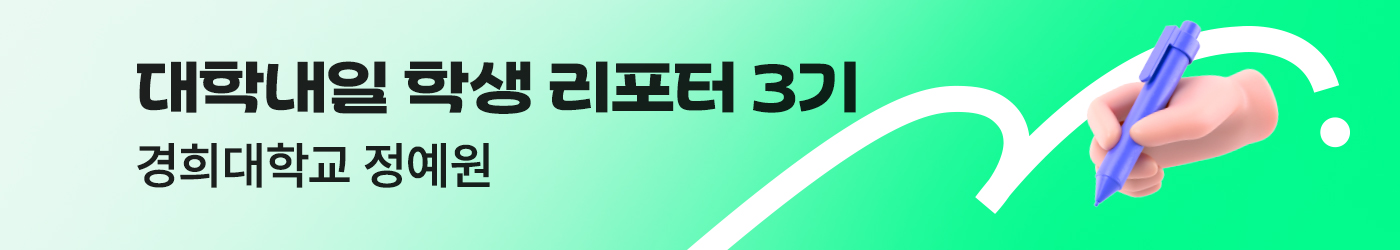
#밥약#약속#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