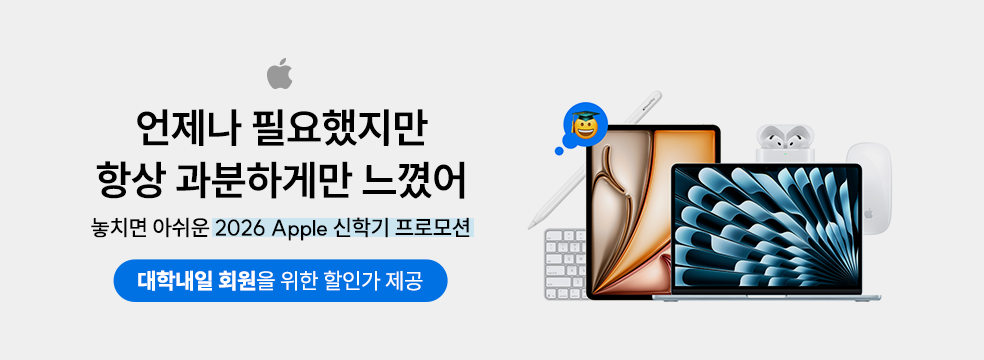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순간의 맛
카메라를 내려놓고, 빛나는 것에 눈부실 필요가 있다.

“그들은 기억의 불멸을 꾀하느라 생생한 현재를 희생한다”
김영하의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中
여행의 프로세스는 꽤 단순하다. 낯설고 멋진 곳에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고 다시 낯설고 멋진 곳으로 가는 것의 반복. 여행이 끝나면 기억은 쉽게 휘발하고, 여행지에서의 인연은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주소록의 전화번호 중 하나가 된다.
‘결국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 김영하 작가는 1996년 그의 데뷔작에서 조금 다르게 말한 적이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벨베데르 궁전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미술관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말한다. “그들 기억 속의 벨베데르는 흐릿하고 푸른 기 감도는 사각의 영상으로 수렴된다.”
교토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지는 노을을 본 적이 있다. 온 세상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따뜻한 풍경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여행을 마친 뒤, 카메라에 남은 건 선명한 거리의 모습뿐이었다. 사진 속 풍경은 빛나지도 눈이 부시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놓고 멍하니 그 순간을 즐겼다면 어땠을까.
모든 신선한 것들이 그렇듯 기억은 쉽게 부패한다. 확실한 건 순간의 느낌뿐이다. 참치회가 참치캔보다 비싼 건,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 없는 ‘순간의 맛’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찍고 공유하고 좋아하는 사진들은 기억이 0과 1의 형태로 저장된 참치캔에 가깝다.
그러니 가끔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빛나는 것에 눈부실 필요가 있다.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보단 생생한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결국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 김영하 작가는 1996년 그의 데뷔작에서 조금 다르게 말한 적이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벨베데르 궁전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미술관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말한다. “그들 기억 속의 벨베데르는 흐릿하고 푸른 기 감도는 사각의 영상으로 수렴된다.”
교토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지는 노을을 본 적이 있다. 온 세상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따뜻한 풍경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여행을 마친 뒤, 카메라에 남은 건 선명한 거리의 모습뿐이었다. 사진 속 풍경은 빛나지도 눈이 부시지도 않았다. 카메라를 놓고 멍하니 그 순간을 즐겼다면 어땠을까.
모든 신선한 것들이 그렇듯 기억은 쉽게 부패한다. 확실한 건 순간의 느낌뿐이다. 참치회가 참치캔보다 비싼 건,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 없는 ‘순간의 맛’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찍고 공유하고 좋아하는 사진들은 기억이 0과 1의 형태로 저장된 참치캔에 가깝다.
그러니 가끔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빛나는 것에 눈부실 필요가 있다.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보단 생생한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에세이#대학내일#여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