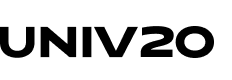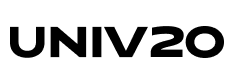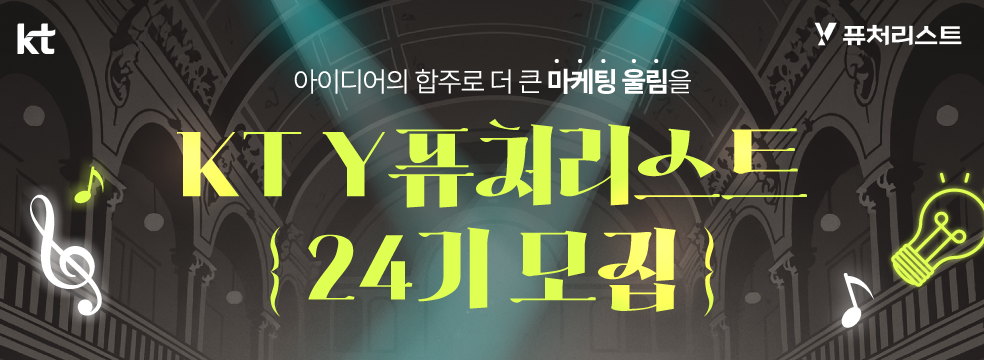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찌질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
민원실 주사 아저씨와의 2년에서 얻은 교훈
중학교 2학년 때쯤, 나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따져보게 됐을 무렵부터 난 나를 찌질하다고 여겨왔다. 공부, 운동, 인간관계 등 잘난 이들의 반대쪽이 내 코너라고 믿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된 건 내가 실제로 찌질하다는 슬픈 사실, 그리고 찌질한 이들도 세상을 살아갈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위안이다.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2001년, 남들보다 늦게 공익요원을 시작했다. 근무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분류계. 편지, 이메일 등 전국에서 오는 온갖 민원을 처음 읽는 부서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 일인지 써넣는 게 주 업무였다.
민원 분류계는 계장님과 서무, 머리 희끗희끗한 주사 아저씨와 나 이렇게 4명으로 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주사 아저씨는 여러모로 보통 분이 아니었다. 10급부터 시작해 6급까지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신 50대 후반의 뚱뚱한 아저씨로, 성격이 고약했다. 더 이상 승진은 어려운 나이,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사무실에서 인기 직원이 아니었다.
사무실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주사아저씨는 사무실 컴퓨터를 싹 고쳐놓으라고 윽박지르셨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드렸다. 20대라고 모두 컴퓨터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리는 어렵죠. 본체를 열어본 적도 없는 제가 만지면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고쳐라.” 결국 컴퓨터 수리 책을 한쪽에 끼고, 공대 출신 공익에게 배워가며 몽땅 수리했다.
민원 분류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 민원인이 글쓰기에 낯설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늘어놓아 정작 해결해야 할 민원이 뭔지 모르겠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어르신 분들의 민원 편지엔 인생사가 통째로 들어 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친척들에게 속아 가난해진 사연부터, 장성한 둘째 아들이 속을 썩여 하루도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는 하소연까지. 마음은 아프지만 15장짜리 편지 속 어딘가 있을 핵심 민원을 찾아내는 게 본업이라 내 쪽도 적잖이 불만이 쌓이곤 했다.
이상한 민원인 역시 우릴 힘들 게 했다. 차마 민원인에게 진상이란 표현을 쓸 순 없다. 그냥 민원인의 2퍼센트 정도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인간이 사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만 이야기하자.

매일매일 민원을 분류하고 또 분류하는 일을 1년 남짓하던 중 나에게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민원 편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편지 주인은 앞서 말한 2퍼센트였다. 자기 민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민원인은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했다. 여긴 엄연히 공무 조직이다. 문서란 모두 공식 문서다. 과장님 계장님 모두 난리가 났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주사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려 했으나, 주사 아저씨 왈 “시끄럽다. 일이나 해라.” 워낙 연세 높은 분이 한참이나 머리를 조아린 터라 민원인도 그냥 넘어갔다. 주사 아저씨는 과장님에게 심하게 깨졌다. 하루 이틀 하시는 일도 아니면서 왜 일을 엉터리로 처리하느냐는 힐난이 사무실 저편에서 들려왔다.
사건 이후 1년을 더 함께 일하며 아저씨와 난 서로를 더 알게 됐다.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을 거르신다던 주사 아저씨는 사실 외벌이에 대학생 자녀까지 있어 돈 아끼려고 점심을 거르는 거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동료들과 식사하러 나가는데 우연히 나를 마주치면 셔츠 윗도리에서 만 원짜리를 하나씩 꺼내주시곤 했다(아저씬 지갑을 안 들고 다녔다). 나는 아저씨가 한국 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최인훈의 소설 『광장』특별판을 구해 선물했다.
28개월만에 공익요원 임기는 끝났고, 나는 번잡한 대학생활로 돌아왔다. 1년 후쯤 전화가 왔는데 주사 아저씨 아들이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이며, 한번 찾아와 줄 수 있느냐는 내용. 평소에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장섭이” 이야기를 가끔 하셨다고 한다. 난 말도 잘 들었고, 이름이 장섭(정섭이다)도 아니었지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사 아저씨는 왼쪽 전신이 마비돼 말도 못 하셨다. 자꾸 환자복 위에 손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뭔가 했더니 예전에 점심값 주던 버릇이었다.
잘난 이들이 제 알아서 살아가는 동안, 혼자 버티기 부족한 찌질이들은 함께 기대어 세상을 살아낸다. 2001년, 서대문구 관공서 사무실 한켠에서 공익요원과 나이 든 주사 아저씨 사이에 일어난 일도 그런 종류의 것일 테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신 찌질한 이들은 모쪼록 함께 하도록. 내가 찾아낸 방법은 그것뿐이니.
Tip + 유독 더 찌질한 독자에겐 언니네 이발관의 4집 수록곡 <꿈의 팝송>을 추천합니다. 음악으로 위로받는 건 고작 들을 때뿐이지만, 그렇게라도 위로받는 게 어딥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2001년, 남들보다 늦게 공익요원을 시작했다. 근무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분류계. 편지, 이메일 등 전국에서 오는 온갖 민원을 처음 읽는 부서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 일인지 써넣는 게 주 업무였다.
민원 분류계는 계장님과 서무, 머리 희끗희끗한 주사 아저씨와 나 이렇게 4명으로 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주사 아저씨는 여러모로 보통 분이 아니었다. 10급부터 시작해 6급까지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신 50대 후반의 뚱뚱한 아저씨로, 성격이 고약했다. 더 이상 승진은 어려운 나이,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사무실에서 인기 직원이 아니었다.
사무실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주사아저씨는 사무실 컴퓨터를 싹 고쳐놓으라고 윽박지르셨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드렸다. 20대라고 모두 컴퓨터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리는 어렵죠. 본체를 열어본 적도 없는 제가 만지면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고쳐라.” 결국 컴퓨터 수리 책을 한쪽에 끼고, 공대 출신 공익에게 배워가며 몽땅 수리했다.
민원 분류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 민원인이 글쓰기에 낯설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늘어놓아 정작 해결해야 할 민원이 뭔지 모르겠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어르신 분들의 민원 편지엔 인생사가 통째로 들어 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친척들에게 속아 가난해진 사연부터, 장성한 둘째 아들이 속을 썩여 하루도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는 하소연까지. 마음은 아프지만 15장짜리 편지 속 어딘가 있을 핵심 민원을 찾아내는 게 본업이라 내 쪽도 적잖이 불만이 쌓이곤 했다.
이상한 민원인 역시 우릴 힘들 게 했다. 차마 민원인에게 진상이란 표현을 쓸 순 없다. 그냥 민원인의 2퍼센트 정도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인간이 사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만 이야기하자.

매일매일 민원을 분류하고 또 분류하는 일을 1년 남짓하던 중 나에게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민원 편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편지 주인은 앞서 말한 2퍼센트였다. 자기 민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민원인은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했다. 여긴 엄연히 공무 조직이다. 문서란 모두 공식 문서다. 과장님 계장님 모두 난리가 났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주사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려 했으나, 주사 아저씨 왈 “시끄럽다. 일이나 해라.” 워낙 연세 높은 분이 한참이나 머리를 조아린 터라 민원인도 그냥 넘어갔다. 주사 아저씨는 과장님에게 심하게 깨졌다. 하루 이틀 하시는 일도 아니면서 왜 일을 엉터리로 처리하느냐는 힐난이 사무실 저편에서 들려왔다.
사건 이후 1년을 더 함께 일하며 아저씨와 난 서로를 더 알게 됐다.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을 거르신다던 주사 아저씨는 사실 외벌이에 대학생 자녀까지 있어 돈 아끼려고 점심을 거르는 거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동료들과 식사하러 나가는데 우연히 나를 마주치면 셔츠 윗도리에서 만 원짜리를 하나씩 꺼내주시곤 했다(아저씬 지갑을 안 들고 다녔다). 나는 아저씨가 한국 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최인훈의 소설 『광장』특별판을 구해 선물했다.
28개월만에 공익요원 임기는 끝났고, 나는 번잡한 대학생활로 돌아왔다. 1년 후쯤 전화가 왔는데 주사 아저씨 아들이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이며, 한번 찾아와 줄 수 있느냐는 내용. 평소에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장섭이” 이야기를 가끔 하셨다고 한다. 난 말도 잘 들었고, 이름이 장섭(정섭이다)도 아니었지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사 아저씨는 왼쪽 전신이 마비돼 말도 못 하셨다. 자꾸 환자복 위에 손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뭔가 했더니 예전에 점심값 주던 버릇이었다.
잘난 이들이 제 알아서 살아가는 동안, 혼자 버티기 부족한 찌질이들은 함께 기대어 세상을 살아낸다. 2001년, 서대문구 관공서 사무실 한켠에서 공익요원과 나이 든 주사 아저씨 사이에 일어난 일도 그런 종류의 것일 테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신 찌질한 이들은 모쪼록 함께 하도록. 내가 찾아낸 방법은 그것뿐이니.
Tip + 유독 더 찌질한 독자에겐 언니네 이발관의 4집 수록곡 <꿈의 팝송>을 추천합니다. 음악으로 위로받는 건 고작 들을 때뿐이지만, 그렇게라도 위로받는 게 어딥니까.
Illustrator_ 김병철
#804호#에세이이#감성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