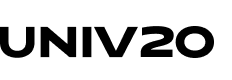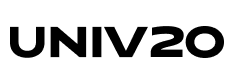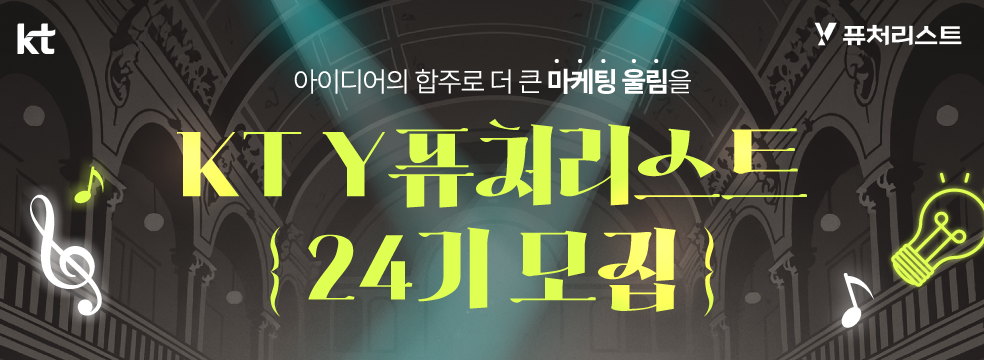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나는 왜 시를 읽는가
한편의 시를 통해 아픔을 쓰다듬는 건 어떨까
얼마 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시인들의 시를 공부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엄마생각」이나 「빈집」, 「질투는 나의 힘」 등으로 교과서에도 실리는 기형도 시인의 시를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기형도 시인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강의 교재에 기형도 이름이 적힌 걸 보시더니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학교에 다니실 때 기형도 시집을 사서 매일 읽었대요. 참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기형도 시인의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대학생들이 기형도 시집을 품에 끼고 다녔다고 했다. 한 손엔 휴대폰을, 한 손엔 토익 책을 들고 다니는 지금과는 조금 낯선 풍경. 아마 저 학생의 어머니도 기형도 시집을 들고서 교정을 거닐었거나, 친구들과 시에대한 감상을 주고받았으리라. 어쩌면 깊은 밤, 노트의 한 귀퉁이에 시의 한 구절을 옮겨 적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그러한 풍경은 다 어디로 갔나.
물론 지금 시를 멀리하는 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도 시 때문에 눈물지으신 적이 있다. 문학을 한다는 아들 때문이었다. 주변에 문학을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던 고등학생 시절, 나는 시를 쓰는 족족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늘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은 미안하다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감정이 메마른 건지 무뎌진 건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
시가 꼭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지금 왜 시를 읽어야 할까? 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모 때문 아닐까. 해가 완전히 진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바깥이 어둡고, 실내가 밝기 때문이다. 반면, 한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들의어더운 유리창에 비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인의 내면이 밝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시인의 메타포(은유)가 된다. 반면 시인의 내면이 어두울 때, 그가 써내려간 시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게 만들고, 또 이 사회를 비춰보게 해준다.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꺼내어 독자들의 숨겨진 아픔들도 꺼내는 사람들이다. 가끔은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다. 자신의 아픔과 마주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아픔을 오래 직시하고 나면, 언젠가 그 아픔을 쓰다듬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아직 아파하는 그 시절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상처 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편의 시를 통해 비춰보며 그 아픔을 쓰다듬는 건 어떨까?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나는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빛나고, 빛나야 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싶다.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ahrajo@univ.me
Freelancer_윤재언 darkblackj2@naver.com
Illustrator_전하은
*Who+ 윤재언은? 입술이 비겁해서 시를 씁니다.
“저는 기형도 시인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강의 교재에 기형도 이름이 적힌 걸 보시더니 막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학교에 다니실 때 기형도 시집을 사서 매일 읽었대요. 참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기형도 시인의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대학생들이 기형도 시집을 품에 끼고 다녔다고 했다. 한 손엔 휴대폰을, 한 손엔 토익 책을 들고 다니는 지금과는 조금 낯선 풍경. 아마 저 학생의 어머니도 기형도 시집을 들고서 교정을 거닐었거나, 친구들과 시에대한 감상을 주고받았으리라. 어쩌면 깊은 밤, 노트의 한 귀퉁이에 시의 한 구절을 옮겨 적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그러한 풍경은 다 어디로 갔나.
물론 지금 시를 멀리하는 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도 시 때문에 눈물지으신 적이 있다. 문학을 한다는 아들 때문이었다. 주변에 문학을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던 고등학생 시절, 나는 시를 쓰는 족족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늘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은 미안하다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감정이 메마른 건지 무뎌진 건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
시가 꼭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지금 왜 시를 읽어야 할까? 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모 때문 아닐까. 해가 완전히 진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바깥이 어둡고, 실내가 밝기 때문이다. 반면, 한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들의어더운 유리창에 비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인의 내면이 밝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시인의 메타포(은유)가 된다. 반면 시인의 내면이 어두울 때, 그가 써내려간 시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게 만들고, 또 이 사회를 비춰보게 해준다.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꺼내어 독자들의 숨겨진 아픔들도 꺼내는 사람들이다. 가끔은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다. 자신의 아픔과 마주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아픔을 오래 직시하고 나면, 언젠가 그 아픔을 쓰다듬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아직 아파하는 그 시절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상처 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편의 시를 통해 비춰보며 그 아픔을 쓰다듬는 건 어떨까?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나는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빛나고, 빛나야 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싶다.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ahrajo@univ.me
Freelancer_윤재언 darkblackj2@naver.com
Illustrator_전하은
*Who+ 윤재언은? 입술이 비겁해서 시를 씁니다.
#20's voice#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