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일
[비독립일기] -2화-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더럽히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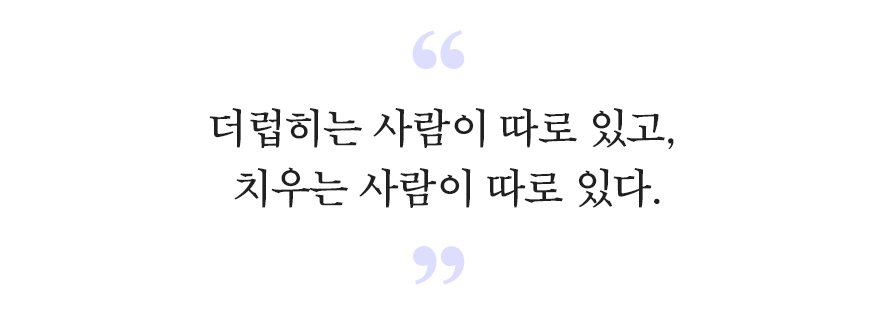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 꼴을 더 ‘못 견딘다’는 것이다. ‘발견’했지만 혹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발견’했을까 싶어서 조금(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보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한다. 마치 무슨 법칙처럼 말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눈은 오랜 훈련으로 길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타고난다. 그렇게 가사의 구도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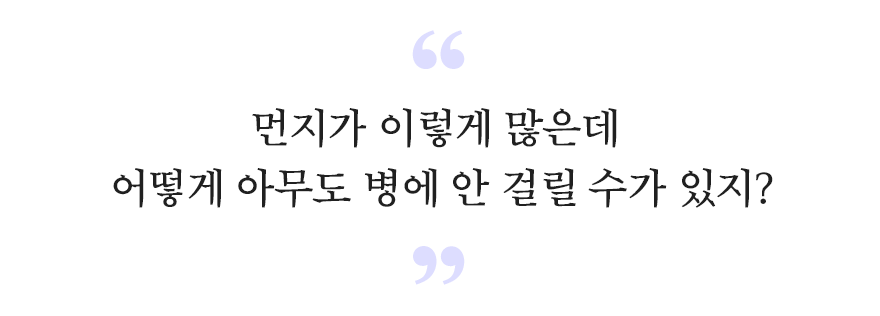
아빠와 나는 정리되지 않은 것을 못 견디고, 엄마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못 견딘다. 형제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것을 견딘다(바퀴벌레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이유의 핵심과 꼭 닮아 있다). 그래서 분노의 청소는 아빠와 나의 몫이다. 청소기가 돌아가는 위이잉- 소리에 목청을 맡기고 알아들을 수 없는 호통과 함께 공격적으로 집 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빨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 두 달 정도 아무도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 상태로 기약 없는 눈치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기를 돌리는 힘보다 눈치 게임에 쓰이는 힘이 더 크며 심지어 도중에 빈정이 상할 위험도 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가?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무도 병에 안 걸릴 수가 있지?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청소는 분노의 청소일 수밖에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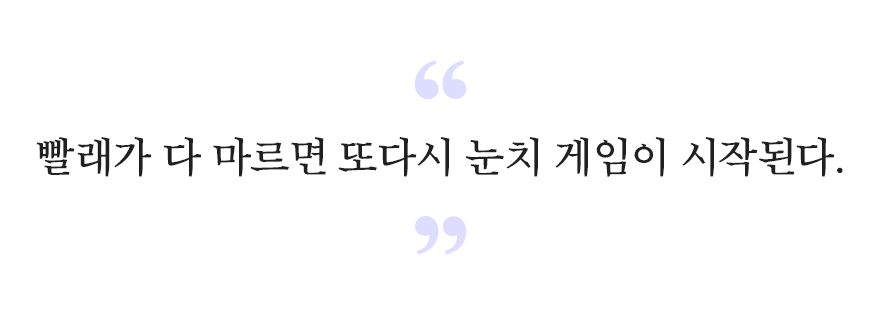 나의 전문 분야는 주로 뭘 돌리는 건데, 두 번째는 세탁기 돌리기다. 세탁 바구니에 던져둔 양말이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바지는 2주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하얀 옷이 시커메져서 돌아오던 지난 세월을 경험삼아 알아서 세탁기를 돌린다. 하지만 세탁기 뚜껑을 닫고 휙 돌아서는 순간 그 존재를 까먹기 일쑤여서 빨래를 너는 건 다른 이의 몫이 되곤 한다. 빨래가 다 마르면 또다시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노는 손을 ‘못 견디는’ 사람이 빨래를 개키게 된다. 자연스럽게 TV를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보는 아빠가 당첨자일 때가 많다.
나의 전문 분야는 주로 뭘 돌리는 건데, 두 번째는 세탁기 돌리기다. 세탁 바구니에 던져둔 양말이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바지는 2주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하얀 옷이 시커메져서 돌아오던 지난 세월을 경험삼아 알아서 세탁기를 돌린다. 하지만 세탁기 뚜껑을 닫고 휙 돌아서는 순간 그 존재를 까먹기 일쑤여서 빨래를 너는 건 다른 이의 몫이 되곤 한다. 빨래가 다 마르면 또다시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노는 손을 ‘못 견디는’ 사람이 빨래를 개키게 된다. 자연스럽게 TV를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보는 아빠가 당첨자일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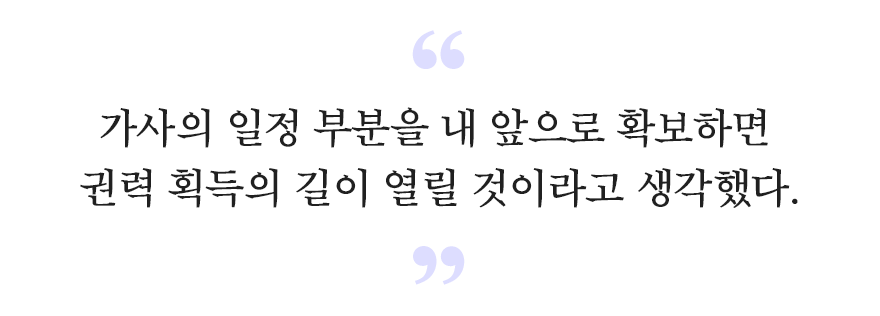
Illustrator 남미가
#대학내일#비독립일기#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