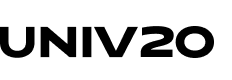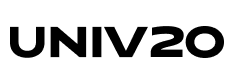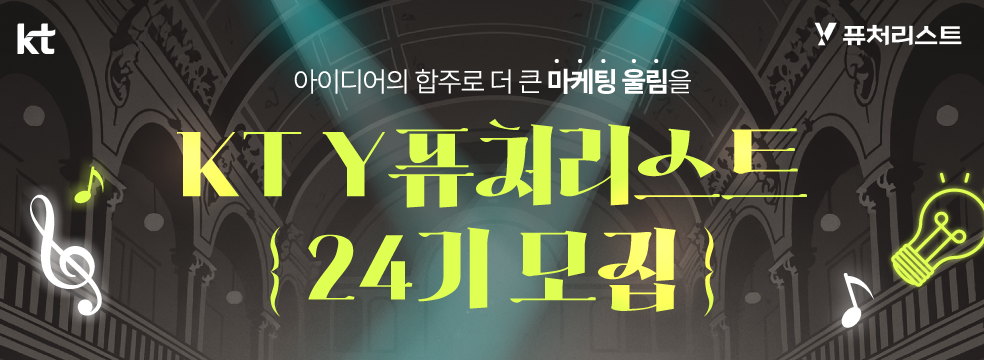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다음엔 내가 살게
애써 더 발랄하게 굴었다.
“다음엔 내가 살게.”
처연한 표정, 축 처진 어깨, 45도 아래로 떨군 고개까지…. 함께 먹은 밥값을 상대방이 계산할 때, 이 모든 행동은 ‘대부분의 밥값을 네가 계산하지만, 나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이때의 ‘다음’ 은 기약된 날이 아니다. 그 순간의 민망함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다. 다정한 연인은 내 민망함을 중화시켜 주고자 “됐어. 그럼 네가 커피 사” 같은 멘트를 날릴 테고, 그럼 난 “사이즈 업이요. 그란데로!”를 외치는 약간의 염치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밥값만 있으랴. 연인들은 함께 영화도 보고, 모텔도 가며, 여행도 떠난다. 그때마다 누가 계산할것인가의 상황에 직면한다. 대학생 시절,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빠른 취업으로 상대적인 벌이가 좋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연인들이 대부분을 계산했다. 상대에 따라 3:7이 나 4:6 등으로 가변적일 뿐, 적은 비율을 담당하는 건 나였다.
암묵적 비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알바를 돌려 막아도 여전히 가난한 나는 줄 게 적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는 받는 사람이었다. 대신 그들이 내게 선사해준 물질적 풍요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 애써 더 발랄하게 굴었다. “와! 정말 맛있다!” “와! 정말 예쁘다!” “와! 여기 정말 좋다.” 그런 과장된 즐거움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바닥에서 일렁이는 자존심을 애써 다독이며, 그들의 호의에 열심히 호응하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상황을 갚아주고 말 거라고.

세상 많은 ‘쿨함’이 마음가짐의 문제다. 사람 관계든, 정치 이슈든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하면 그만이다. 살면서 그런 쿨함을 원한 적은 없지만, 돈에 대해서만은 쿨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필 돈에 대한 쿨함만은 철저히 가진 재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가난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늘 시급 인상에 목말라 있었고, 노동 시간을 돈으로 따져 셈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커피는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애써 기분내서 간 비싼 식당에선 가장 싼 메뉴를 주문했다. 학비, 생활비, 가스비 목록을 줄줄이 꿰고 살았다. 한 달 몇만원 정도 정기 후원을 할까 하다가도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포기했다.
밥값만 있으랴. 연인들은 함께 영화도 보고, 모텔도 가며, 여행도 떠난다. 그때마다 누가 계산할것인가의 상황에 직면한다. 대학생 시절,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빠른 취업으로 상대적인 벌이가 좋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연인들이 대부분을 계산했다. 상대에 따라 3:7이 나 4:6 등으로 가변적일 뿐, 적은 비율을 담당하는 건 나였다.
암묵적 비율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알바를 돌려 막아도 여전히 가난한 나는 줄 게 적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는 받는 사람이었다. 대신 그들이 내게 선사해준 물질적 풍요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 애써 더 발랄하게 굴었다. “와! 정말 맛있다!” “와! 정말 예쁘다!” “와! 여기 정말 좋다.” 그런 과장된 즐거움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바닥에서 일렁이는 자존심을 애써 다독이며, 그들의 호의에 열심히 호응하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상황을 갚아주고 말 거라고.

세상 많은 ‘쿨함’이 마음가짐의 문제다. 사람 관계든, 정치 이슈든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하면 그만이다. 살면서 그런 쿨함을 원한 적은 없지만, 돈에 대해서만은 쿨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필 돈에 대한 쿨함만은 철저히 가진 재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가난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늘 시급 인상에 목말라 있었고, 노동 시간을 돈으로 따져 셈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커피는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애써 기분내서 간 비싼 식당에선 가장 싼 메뉴를 주문했다. 학비, 생활비, 가스비 목록을 줄줄이 꿰고 살았다. 한 달 몇만원 정도 정기 후원을 할까 하다가도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포기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는 가난한 연인의 사랑을 슬프면서도 낭만적으로 묘사하지만 내가 겪은 가난은 그것보다 더 또렷했다. 계산하는 이의 뒤에 서서 “다음에는 내가 살게” 같은,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다음만 기약하는 일 같은 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런 손쉬운 낭만으로 사랑을 욕보이고 싶지 않았다.
가난 때문에 연애마저 포기한다는 소위 ‘7포 세대’임에도 난 불가항력으로 매번 사랑에 빠졌고, 그럴수록 정규직 일자리와 연봉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이 갖고 싶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는 어떤 연애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오기로 똘똘 뭉쳐 있던 나날 끝에 어찌어찌 드디어 ‘정규직’ 자리에 안착했다. 나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그 달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사장 한 명의 인성에 호소하며 월급을 밀리지 말아달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정당한 돈을 받는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취업 준비에 허덕이는 친구를 불러내 거한 밥을 한 끼 사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을 만큼의 통장 잔고를 갖게 된 것이다. 드디어.
모교 쪽문 앞 닭볶음탕집에서 고민 많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어느 밤. 친구 하소연의 한편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얻어먹은 밥과 기꺼이 그 밥값을 계산했던, 이제는 콧대나 눈매마저 희미해진 옛 연인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는 사람’과 ‘얻어먹는 사람’의 구분은 권력 문제가 아니 라는 것, 그 사주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사랑이라는 것.
이제 그때의 연인들은 다 사라지고 내 곁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사준 밥, 보여준 아름다운 곳, 경험시켜준 멋진 것… 무엇보다, 마주 앉아 무수히 많은 밥을 함께 먹으며 나눴던 대화들. 아마도 그 시간과 사랑이 지금의 나를 키워냈을 것이고, 그 덕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됐을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누추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이 우리의 사랑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혹여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존심에 상처 입은 어린 양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고, ‘주는 사랑’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 되돌려 받을 생각에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짐작건대 지난 나의 연인들은 주는 사랑으로도 충만했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갚으면 된다.
어쩌면 이들은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오래 전 받았던 호의를 다른 이에게 갚는 것도 그것대로 좋다. 사랑은 누군가에서 다른 누군가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니까. 그런 날이 오면, 연인에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여주고, 멋진 것들을 사주고, 주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면, 아마도 그때쯤엔 우리도 사랑의 부채감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가난 때문에 연애마저 포기한다는 소위 ‘7포 세대’임에도 난 불가항력으로 매번 사랑에 빠졌고, 그럴수록 정규직 일자리와 연봉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이 갖고 싶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는 어떤 연애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오기로 똘똘 뭉쳐 있던 나날 끝에 어찌어찌 드디어 ‘정규직’ 자리에 안착했다. 나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그 달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사장 한 명의 인성에 호소하며 월급을 밀리지 말아달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정당한 돈을 받는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취업 준비에 허덕이는 친구를 불러내 거한 밥을 한 끼 사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을 만큼의 통장 잔고를 갖게 된 것이다. 드디어.
모교 쪽문 앞 닭볶음탕집에서 고민 많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어느 밤. 친구 하소연의 한편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얻어먹은 밥과 기꺼이 그 밥값을 계산했던, 이제는 콧대나 눈매마저 희미해진 옛 연인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는 사람’과 ‘얻어먹는 사람’의 구분은 권력 문제가 아니 라는 것, 그 사주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사랑이라는 것.
이제 그때의 연인들은 다 사라지고 내 곁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사준 밥, 보여준 아름다운 곳, 경험시켜준 멋진 것… 무엇보다, 마주 앉아 무수히 많은 밥을 함께 먹으며 나눴던 대화들. 아마도 그 시간과 사랑이 지금의 나를 키워냈을 것이고, 그 덕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됐을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누추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이 우리의 사랑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혹여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존심에 상처 입은 어린 양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고, ‘주는 사랑’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된다. 되돌려 받을 생각에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짐작건대 지난 나의 연인들은 주는 사랑으로도 충만했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갚으면 된다.
어쩌면 이들은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오래 전 받았던 호의를 다른 이에게 갚는 것도 그것대로 좋다. 사랑은 누군가에서 다른 누군가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니까. 그런 날이 오면, 연인에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여주고, 멋진 것들을 사주고, 주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면, 아마도 그때쯤엔 우리도 사랑의 부채감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Writer 한소범 lilisusu707@naver.com 한국일보 기자. 글밥의 책임감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Illustrator 키미앤일이
Illustrator 키미앤일이
#대학내일#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