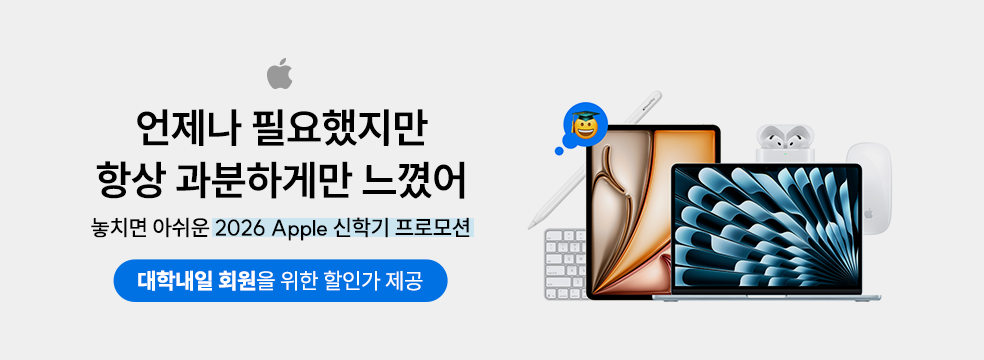대학내일
오늘도 참고 넘어가셨나요?
언제까지고 적당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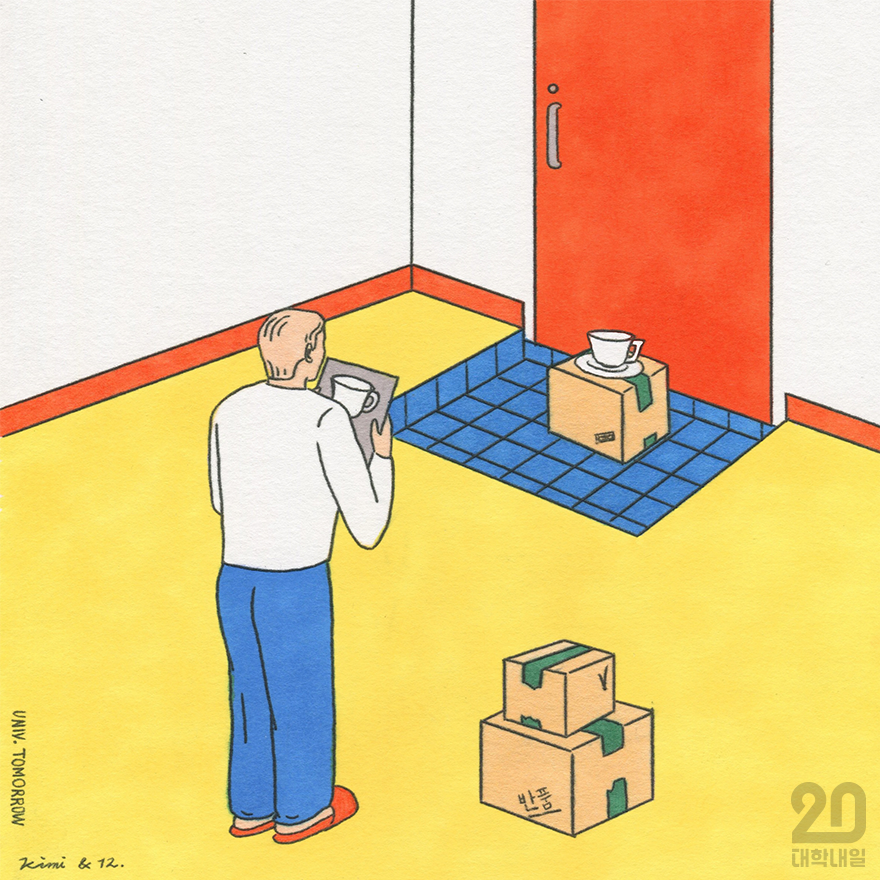
새로 인쇄한 명함을 찾으러 가니 주문한 사이즈보다 오른쪽으로 0.5밀리미터 더 넓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묻자, 글자가 잘려서 여유 있게 재단했다더군요. 글자가 살짝 잘리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는 제가 실수했다고 여겨 나름 신경 쓴 조치였겠지만, 자신의 경험치로 타인의 의도를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넓어진 0.5밀리미터를 잘라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었지만요.
책상을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공산품 책상의 높이는 대개 75~76센티미터쯤이더군요. 신체와 비율의 차이에 따르는 불편함은 의자 높낮이를 조절해 대충 해결하라는 뜻인가 봅니다.
하지만 책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높이입니다. 너무 높으면 자판을 칠 때 팔뚝의 피가 역류하고, 너무 낮으면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는 잔뜩 움츠려야 합니다. 의자를 높이면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요. 제 의자 높이를 감안해 71센티미터 높이의 책상을 구할 작정으로 반맞춤 가구점을 찾았습니다. 디자인을 고르면 원하는 치수대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지요.
일주일 뒤에 배달되어 온 책상에 앉아 보니 이상했습니다. 높이가 74센티미터였습니다. 제 직업은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 작업을 할 때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가 좋을지 10.1포인트가 좋을지 10.2포인트가 좋을지를 놓고 한참 고민하기도 합니다. 책상 높이의 오차인 3센티미터를 포인트로 환산하면 85.039입니다. 그 정도 오차면 눈을 감고 작업한 게 분명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안 될까요?” 예상 밖의 전개. 다시 물었습니다. “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엔 다리를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평이 맞지 않아 덜그럭거립니다. 참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니! 새로 만드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찻잔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 특징 없는 평범한 모양의 찻잔을 사려고 그릇 상가를 샅샅이 뒤져 그나마 적당히 평범한 찻잔을 골랐지만 재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받은 찻잔은 손잡이에 묘하게 각을 넣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가 싫어서 몇 시간을 돌았건만. 어째서 자기가 파는 물건조차 제대로 배송하지 못한단 말인가요. 어쩌다 생긴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번번이 비슷한 일을 당하면 우연 또는 실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선글라스를 살 때도 비슷했거든요. 렌즈를 초록색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받아 보니 회색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물었더니 가게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기에 반신반의하며 나왔는데, 며칠 간 각기 다른 조건에서 확인해보니 역시 회색이었습니다. 이제 속임수까지!
정교하지 않은 일 처리 방식이 이 사회에 ‘업무 스타일’로 두루 자리 잡은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저처럼 참고 마는 사람이 대다수라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관대함이 쌓여 무신경을 낳은 걸까요? 실수를 용납하지 말고 가혹하게 응대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게 돌아온 부정확의 결과들은 저를 늘 낙심시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앞서 언급한 일들을 당하면 물론 화가 납니다. 대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약속한 물건은 오지 않고 참고 쓰라는 소리나 들으니까요.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 하면 저한테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럼 혹시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피고용인이라면 경우에 따라 시말서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애초에 본인의 불찰로 생긴 일이니 마땅한 일이라 여겨도 타당하겠지만 상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 역시 인지상정입니다(어느 쪽이 더 딱한지 헷갈리지만요).
참고 쓰라는 말에 기가 차 상종하기 싫어 그 이상 타진하지 않은 당시의 제 반응을 돌이켜 보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방치한 듯해 씁쓸합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작더라도 일단은 소리를 낸 쪽이 ‘큰’ 소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제 쪽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이에 반응해 상대가 더 큰 목소리를, 그에 반응해 이번에는 이쪽에서 더욱 큰 소리를…… 이렇게 떡 하나 더 얻자고 우는 소리가 이어지면 소리가 점점 커져 세상은 고함 지옥으로 변하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태를 막으려다 눈 뜨고 코 베이고 맙니다. 그 사태 역시 막아야지요. 무협영화의 주인공이 주장하는 것처럼, 싸움을 피하려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폭력이 되고, 못 미치면 약자가 되겠지요.
너무 작아 파묻히지도, 너무 커 도드라지지도 않는 ‘적당한’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나직이, 강요하지 않고, 누가 듣든 말든, 듣지 않는다고 언성 높이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들리는 위치에 가더라도,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면 더더욱, 언제 까지고, ‘적당한(혹시나 싶어 덧붙이자면요, 제가 쓴 ‘적당하다’라는 단어는 “야,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할 때의 ‘적당’이 아니라 ‘꼭 알맞게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하는 일은 제대로 해내면서 타인의 영역을 존중해야겠지요.
‘적당한’ 목소리를 찾아내는 일은 오래 걸리고 그동안 감수해야 할 일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끝내 얻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저는 ‘적당한’ 소리를 찾아 갈팡질팡하기를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Writer 이기준 kijooooon@gmail.com 그래픽 디자이너, 산문집 『저 죄송한데요』 저자
Illustrator 키미앤일이
Illustrator 키미앤일이
#민감함#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