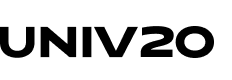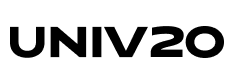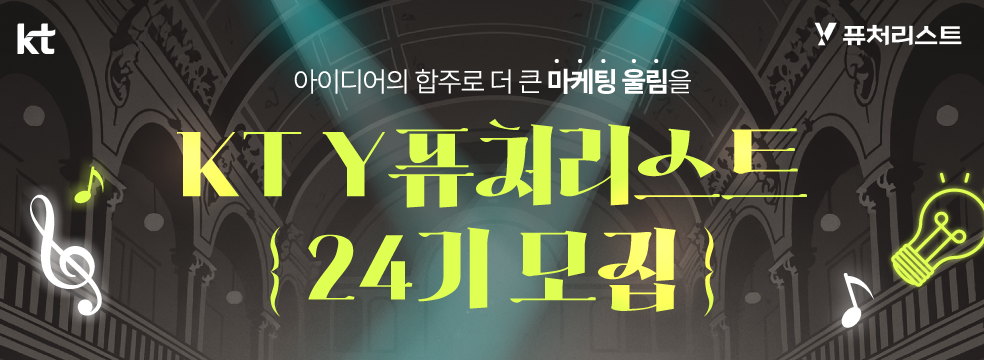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자존감은 몰빵금지
내적 특성에 바탕을 둔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자존감은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는 20대 독자를 위해 심리학이 전하는 자존감 관리법 5가지.

자존감이란 단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나를(자), 존중하는(존), 느낌(감). 자존감은 남이 아닌 내가 정하는 느낌이다.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이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가 괜찮은 인간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난 내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상위 1%에 속해 있더라도 똑같은 상위 1%들만 보며 그 안 에서 나보다 더 잘난 누군가를 찾아내, 다시금 좌절감에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에 취약하지 않은 당신만의 특성을 찾아라
‘비교’에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어렵다[1]. 내가 아무리 잘한들 내 옆의 누가 나보다 잘나가는 순간 자존감이 추락한다. 따라서 자존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비교에 취약하지 않은 것일 수록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주로 남과 비교하기 어려운 나의 ‘내적 특성’에 비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미식가인 나, 재치 넘치는 나, 호기심 많고 모험을 즐기는 나. 이런 내적 특성에 바탕을 둔 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 자존감을 하나의 특성에 몰빵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내적 특성이 풍부해질수록 좌절에 강해질 수 있다[2]. 예컨대 ‘성적’ 하나에 나의 가치를 전부 걸고 있는 경우 성적이 떨어지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양한 자존감 지지대를 가지고 있으면 ‘성적은 나의 한 부분일 뿐 나는 여전히 호기심 많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라며 큰 좌절을 피할 수 있다.
가지가 딱 하나인 나무라면 그 가지가 죽는 순간 나무도 말라 죽겠지만, 가지가 여러 개인 나무는 그중 하나가 병들어도 나머지를 통해 울창한 잎을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높은 자존감보다 덜 흔들리는 자존감이 좋다
자존감의 ‘높낮이’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3]. 예컨대 자존감은 높지만(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 현실이 이를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든가 + 거기에 비교가 심하고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 등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실제로 폭력성을 보이는 많은 사람의 경우 스스로가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라며 침울해하기보다는 ‘나의 대단함을 알아주지 않는 XXX들이 문제’라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욕구가 대단하지만, 현실이 그 기대를 받쳐주지 않아 괴리가 크다. 그 스트레스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든다. 자존감에 어울리는 조건이 필요한 탓이다. 심리학자들은 현실에 기반을 두되 살짝 긍정적이면서 내적 지지대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자존감은 급조되는 게 아니다. 일상을 행복하게
한편, ‘오늘부터 나를 좋아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멋져”라고 되뇌어도 자존감은 쉽사리 올라가지 않는다.
Leary등의 학자들은 자존감은 결국 내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어떤 성적표(결과) 같은 거라고 보았다. 자존감은 급조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다. 하루하루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며 살다 보면 저절로 “이 삶이, 이런 내가 정말 좋아!”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5. 자신에 대해 너그러워져라
아무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따금 닥쳐오는 좌절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심리학자 Neff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넌 이제 망했어. 안 될 거야”같이 자기파괴적인 말을 쏟아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Neff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자기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좌절도 덜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4].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친절을 보이듯 ‘나에게도’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자.
각주[1], [2] Crocker, J., &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Maintenance, enhancement, and protection of self-worth.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91-313. New York: Guilford Press./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3]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90-1204.[4] Neff, K. D., Kirkpatrick, K., & Rude, S. S. (2007). Self-compassion and its link to adaptive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139-154.
Writer 박진영 imaum0217@naver.com 연세대 심리학 석사.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블로그(jinpark.egloos.com)’를 운영하며, 책『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를 썼다.
#자존감#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