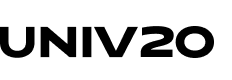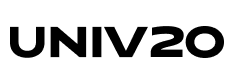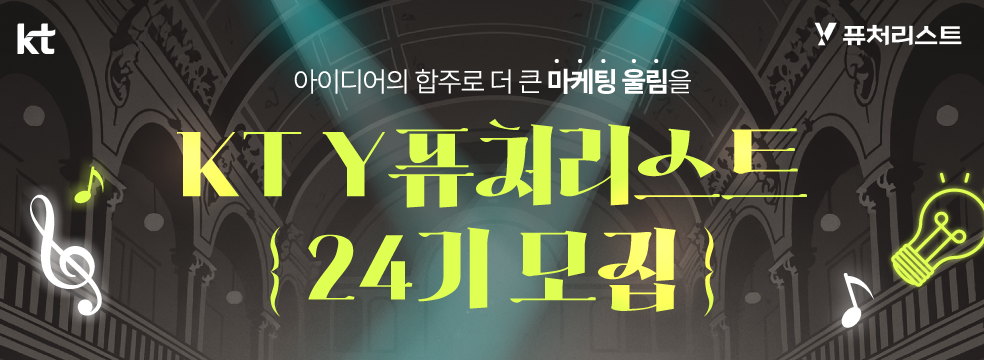대학내일
인간관계, 절실함이 심해지면 독이 된다
오직 '내‘가 채워지는 것만 중요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절실하면 왜 관계는 도리어 멀어지는 걸까? 잘 해주려 하는데도 상 대가 이상스레 냉담한 이유는? 타인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엔 서로 다른 2종류가 있다.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 인간관계는 망가지거나 혹은 탄탄해진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전학 다니다 보니 친한 친구가 없었다. 적응할 듯하면 이사하고, 겨우 친구 만들면 또 이사하고. 어릴 때 친해지는 기준은 단순하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야 한다. 이미 서로 친해진 아이들 사이에서 홀로 낯선 사람으로 존재했다. 그 소외감이 힘들어 어떻게든 빨리 친구를 사귀려고 발버둥 쳤다.
초등학생 때 기억 탓인지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든 함께 다닐 친구를 만들고자 무던히 애썼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소풍 버스에서 친구가 없어 쓸쓸히 혼자 앉아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여 준다면’ 내가 친구 사귀는 기준이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었기에 누구든 관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다가갔다.
그 친구가 혹시라도 나를 싫어할까 봐 열심히 맞춰주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에게 바라는 것 역시 많았다. ‘내가 이 관계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정작 상대는 바란 적도 없는데 나로서는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원했다.

지금 이거 거절하는 신호 맞지?
나의 높은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보면 멋대로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처 받는 일이 반복됐다. 때론 아예 거절을 염두에 두고 '언제 날 밀쳐낼지 잘 봐야지'라며 거절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민감한 ‘거절 포착 레이다’를 돌리며 이것도 거절, 저것도 거절 과대 해석 하고 다녔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절이 두려운 나머지 앞장서 거절을 수거하고 다닌 셈이다. 깊은 관계를 갈구했음에도 정작 상대방에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사랑 받는 것, 나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등 오직 내가 채워지는 것만 중요했다. 오직 나만 있었고 상대의 자리는 없었던 셈이다.
심리학에 ‘다음 차례 효과(next-in-line effect)’란 말이 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에서 나 바로 전 사람 이름이 제일 잘 기억 안 나는 현상을 뜻한다. 바로 다음이 내 순서이기에 무슨 얘길 할지 고민하다가 전 사람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신경 쓰는 정도가 심할수록 ‘다음 차례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나 역시 그랬다.
성장 지향 VS 결핍감소 지향
"퀘백대학교 Denevieve Lavigne 연구진은 총 네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세 개의 설문 연구와 두 달에 걸친 추적 연구 끝에 남들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 즉 소속욕구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이 두 가지 욕구는 서로 다른 감정과 태도, 행동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나는 ‘성장 지향(growth orientation)’이다. 상대방 자체에 관심이 가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핍감소 지향(deficit-reduction orientation)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맺는 경우다. 공허함을 메우려는 욕구라고 봐도 된다. 실험은 이 둘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성장지향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 인간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속마음을 쉽게 오픈하는 경향도 보였다. 반면 결핍감소지향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걸 중요시하며, 남들과 비교하는 성향을 보였다.
사람들 앞에 서 긴장하는 정도를 일컫는 ‘사회적 불안’의 경우 성장지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반면, 결핍감소지향이 높은 사람은 높았다. 남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편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역시 성장지향과 결핍감 소지향의 차이였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에게 조별과제 전후 약 두 달에 걸쳐 각 특성의 사람들이 주변 팀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지향이 높았던 사람들은 두 달 후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다’ 같은 평가를 많이 받은 반면 결핍감소지향이 높았던 사람들은 스스로도 팀원들과 일할 때 어색하고 쑥스러웠다고 평가했으며 팀원들 역시 이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은 의향이 낮다고 보도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연구자들은 결핍감소 지향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은 친밀함을 절실히 원하지만, 되려 이 절실함 때문에 사람들에 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오히려 어색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계를 통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너무 절실한 마음이 되려 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흔히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친구 관계가 유독 힘든 분들은 혹시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을 채우기 위한 블랙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결핍을 채우겠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기를 권한다.
초등학생 때 기억 탓인지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든 함께 다닐 친구를 만들고자 무던히 애썼다.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소풍 버스에서 친구가 없어 쓸쓸히 혼자 앉아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여 준다면’ 내가 친구 사귀는 기준이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었기에 누구든 관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다가갔다.
그 친구가 혹시라도 나를 싫어할까 봐 열심히 맞춰주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에게 바라는 것 역시 많았다. ‘내가 이 관계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정작 상대는 바란 적도 없는데 나로서는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원했다.

지금 이거 거절하는 신호 맞지?
나의 높은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보면 멋대로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처 받는 일이 반복됐다. 때론 아예 거절을 염두에 두고 '언제 날 밀쳐낼지 잘 봐야지'라며 거절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민감한 ‘거절 포착 레이다’를 돌리며 이것도 거절, 저것도 거절 과대 해석 하고 다녔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절이 두려운 나머지 앞장서 거절을 수거하고 다닌 셈이다. 깊은 관계를 갈구했음에도 정작 상대방에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사랑 받는 것, 나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등 오직 내가 채워지는 것만 중요했다. 오직 나만 있었고 상대의 자리는 없었던 셈이다.
심리학에 ‘다음 차례 효과(next-in-line effect)’란 말이 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에서 나 바로 전 사람 이름이 제일 잘 기억 안 나는 현상을 뜻한다. 바로 다음이 내 순서이기에 무슨 얘길 할지 고민하다가 전 사람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신경 쓰는 정도가 심할수록 ‘다음 차례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나 역시 그랬다.
성장 지향 VS 결핍감소 지향
"퀘백대학교 Denevieve Lavigne 연구진은 총 네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세 개의 설문 연구와 두 달에 걸친 추적 연구 끝에 남들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 즉 소속욕구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이 두 가지 욕구는 서로 다른 감정과 태도, 행동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나는 ‘성장 지향(growth orientation)’이다. 상대방 자체에 관심이 가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핍감소 지향(deficit-reduction orientation)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싫어서 관계를 맺는 경우다. 공허함을 메우려는 욕구라고 봐도 된다. 실험은 이 둘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성장지향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 인간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속마음을 쉽게 오픈하는 경향도 보였다. 반면 결핍감소지향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걸 중요시하며, 남들과 비교하는 성향을 보였다.
사람들 앞에 서 긴장하는 정도를 일컫는 ‘사회적 불안’의 경우 성장지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반면, 결핍감소지향이 높은 사람은 높았다. 남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편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역시 성장지향과 결핍감 소지향의 차이였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에게 조별과제 전후 약 두 달에 걸쳐 각 특성의 사람들이 주변 팀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지향이 높았던 사람들은 두 달 후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다’ 같은 평가를 많이 받은 반면 결핍감소지향이 높았던 사람들은 스스로도 팀원들과 일할 때 어색하고 쑥스러웠다고 평가했으며 팀원들 역시 이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은 의향이 낮다고 보도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연구자들은 결핍감소 지향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은 친밀함을 절실히 원하지만, 되려 이 절실함 때문에 사람들에 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오히려 어색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계를 통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너무 절실한 마음이 되려 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흔히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친구 관계가 유독 힘든 분들은 혹시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을 채우기 위한 블랙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결핍을 채우겠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기를 권한다.
각주Lavigne, G. L., Vallerand, R. J., & Crevier-Braud, L. (2011). The fundamental need to belo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growth and deficit-reduction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1185-1201.
Illustrator 김호
Writer 박진영 imaum0217@naver.com 연세대 심리학 석사.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블로그(jinpark.egloos.com)’를 운영하며, 책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를 썼다.
Writer 박진영 imaum0217@naver.com 연세대 심리학 석사. ‘지뇽뇽의 사회심리학 블로그(jinpark.egloos.com)’를 운영하며, 책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를 썼다.
#공돌이#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