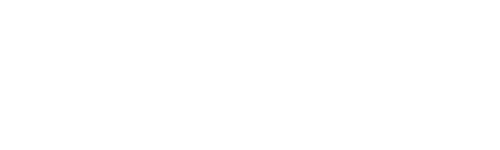글 쓰는 20대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4학년 대학생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흔히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득,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했다. 꿈도, 좋아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온 것 같은데... 과연 나는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갱스터 래퍼를 꿈 꾼 것은 아니다.
갱스터 래퍼를 꿈 꾼 것은 아니다.-어렸을 적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 꿈은 지금도 남아 있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 했다. 늘 주변 어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런 칭찬이 좋았다. 유치원에서 놀이 시간마다 친구들과 그림을 그렸고 집에 와서도 또 그림을 그리며 스케치북을 꽉꽉 채웠다. 기억나는 건 할머니가 자주 종이 별 접기 색종이를 사다주셨다. 길다란 색종이를 차곡차곡 접어서 통통한 별을 만들어, 유리병에 모으는 걸 좋아했다.
초등학생이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꿈과 장래희망을 물음 당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답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좋아하는 걸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전히 나는 만들고, 쓰고, 그리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닌 6년 내내 장래희망 칸엔 ‘화가’, ‘미술선생님’, ‘패션 디자이너’가 빠지지 않고 적혀 있었다.

가끔 뜬금없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단순히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예쁘게 노래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그리고 그 시절 소녀들의 국민 애니메이션 <꿈빛 파티시엘>을 보고, 한창 파티시엘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잘하는 일로 칭찬받는 내 모습이 좋았기 때문인 것 같다. 웃긴 건 지금까지도 잘하는 일이 곧 좋아하는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장래희망] 빈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매 학기마다 적으라고 했고, 발표도 시켰다. 나는 무난하다고 생각해 ‘교사’를 골랐다. 그렇게 그 시절의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모범생 타입으로 지냈고, 그림과는 점점 멀어졌다. 그래도 미술 수업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매번 좋은 성적을 받아 내 실력을 증명받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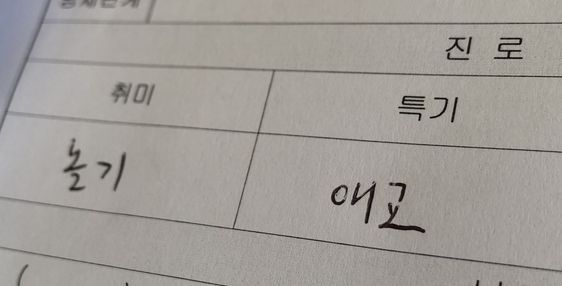
아,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라는 탄식에는 졸업 후 어른이 된다는 설렘과 막막함이 공존했었다. 내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명확한 진로 방향을 지니고 진학할 대학과 과를 정해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채우는 친구들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나는 그림에 대한 좋은 기억을 놓지 못해 1학년 생기부에 ‘시각 디자이너’를 다시 적었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찾다 2학년 땐 ‘편집자’를 적어 냈다.

디자인을 공부하려면 미대에 가야 했고,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시 미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2학년이 끝날 때까지 갈팡질팡하다 끝내 미대 진학은 포기했다. 그때 당시 나는 이걸 해야겠다는 확신도, 냅다 해버리는 깡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선 그나마 생기부에 끼워 맞춰 1지망에 ‘사회학과’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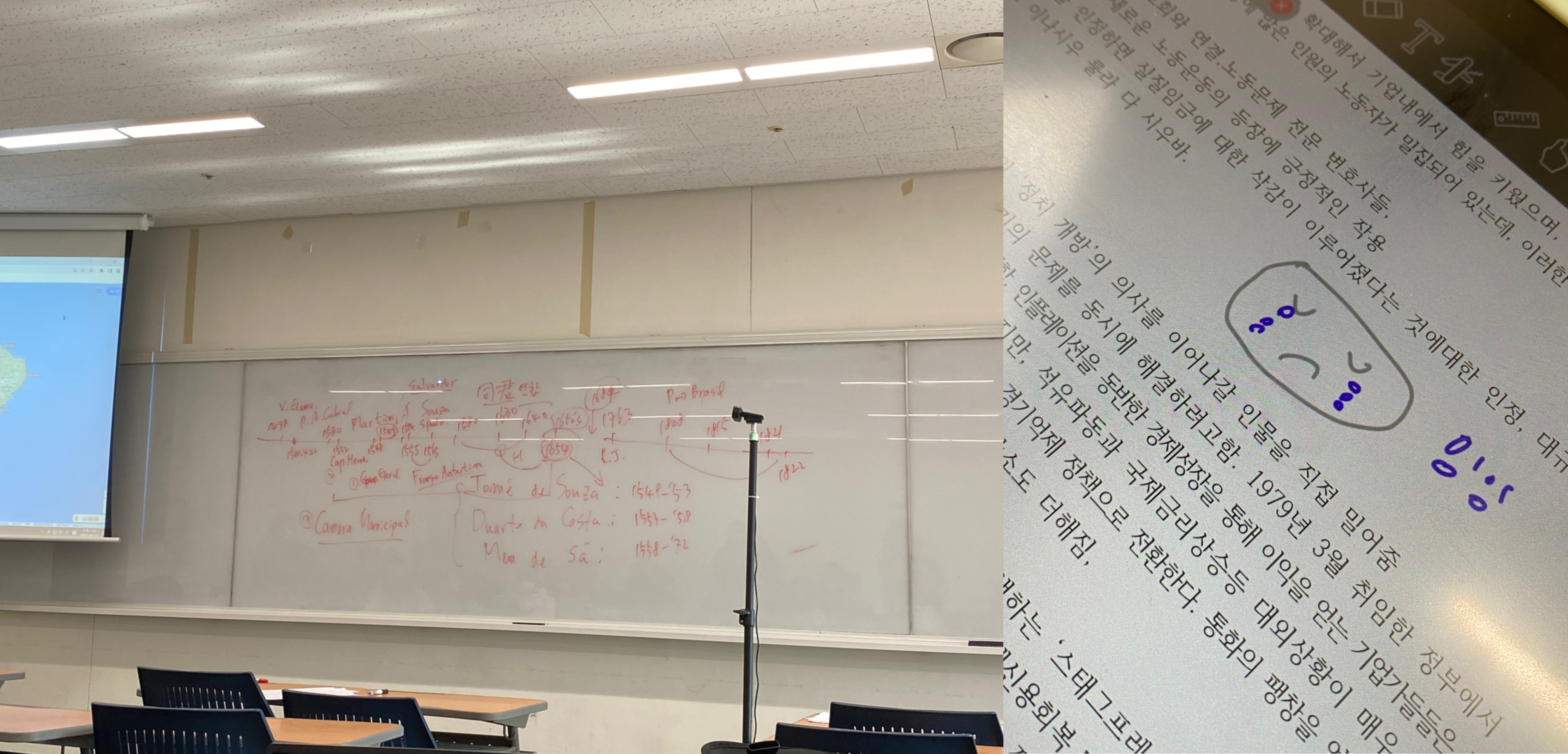
예상대로 사회학과에 합격하진 못했다. 그 대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마이너한 어문학과에 입학하며, 내 20대가 시작되었다. 외고 출신도 아닌 내가 언어 전공자라니. 그런데 막상 새로운 분야를 접하니 재밌었고, 운 좋게도 잘 맞았다.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 장학금도 따라왔다.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든 그냥 해보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 삶의 배경,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내 생각과 시야가 좁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만들고, 쓰고, 그리고, 꾸미는 것을 사랑하며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칭찬받는 게 좋다.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1학년 때 성적을 잘 챙겨둔 덕분에, 다음 해 제 2전공을 고를 선택지의 폭이 넓었다. 나는 브랜드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에 관심이 생겼고, 좋은 카피라이팅이나 감각적인 캠페인들을 보면 내가 기획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그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이 되어 있었다. 수많은 과제와 팀플에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결과물을 보면 그 과정이 소중해졌다.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내 취향이 담긴 콘텐츠를 발행했는데, 1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내가 사람들의 반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기뻐서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자랑하는 글도 올렸었다. 그리고 점차 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적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 취향을 담아 소재를 기획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져와 편집하며 글도 쓰는 게 좋았다.

얼마 전 방 정리를 하다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 <Jobs 에디터: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골라내는 사람>을 발견했다. 지금 나는 콘텐츠 에디터를 꿈꾸고 있다. 결국 나는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에 당연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신기한 건 오래전부터 바뀌지 않고 내가 좋아했던 것, 꿈꾸던 모습엔 어딘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꿈꿨던 모습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모순적인 말이지만, 사람은 변함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은 형태를 바꾸며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자. 꿈이 딱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발견할지도 모르니까! 💫
##대학생 #에세이 #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