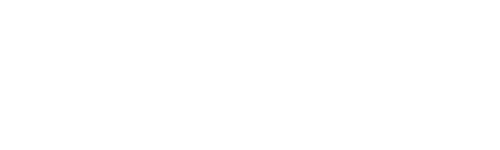글 쓰는 20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마케팅 취준생으로 산다는 것.
사회복지학과생이고요. 마케팅 인턴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인데 마케팅 인턴에 왜 지원하셨나요?"
나의 면접 준비 파일에는 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혀있었다.
나의 면접 예상질문 no.1 이랄까?
나는 이 질문을 꽤 자주 듣는다.
처음엔 이상했다. "요즘 전공 살리는 시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나는
'매출' , '홍보전략'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회복지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드는 학문이다.
그리고 마케팅은 무언가를 잘 팔게 하는 분야이다.
대상이 다를 뿐, 어떠한 것의 강점을 찾아야 하는 데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았다.
사람의 강점을 먼저 찾는 습관은 사회복지가 내게 준 훈련이었다.
약점보단 강점을 찾는 시선,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닌 내 앞에 놓인 제품에 그 시선과 능력을 쓰기 시작했다.
사회복지는 결국 나의 언어가 되었다.
 휴학전, 나름 실습도 했다.
휴학전, 나름 실습도 했다.
이게 잘 한 선택일까?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같은 전공인 동기들과도 속마음을 나누기 어려웠다.
서로가 겪는 고민이 달라서일까, 나만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다.
조금이라도 폐를 끼칠까 봐 망설였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날들이 많았다.
그 외로움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덩그러니 떠있는 느낌이었다.
사회복지에도, 경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쌓여갔다.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마케팅 서포터즈였다.
기획안을 짜야한다며, 팀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렸다.
"저희 IMC 전략은 뭐로 할까요?"
티 안나게 눈알을 굴렸다. 그게 뭘까?
일단 알아 듣는 척 하고 집에 와 노트북을 열었다.
IMC : 통합적마케팅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이 제품을 팔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수단을 통해 기업 또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치원생으로 돌아간 듯, 새로 듣는 단어를 하나하나 노트북에 적어갔다.
그렇게 공부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 했을 정인서 교수의 "마케팅학개론"이었다.

모든 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공모전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장표를 짜는 것도 매 순간이 도전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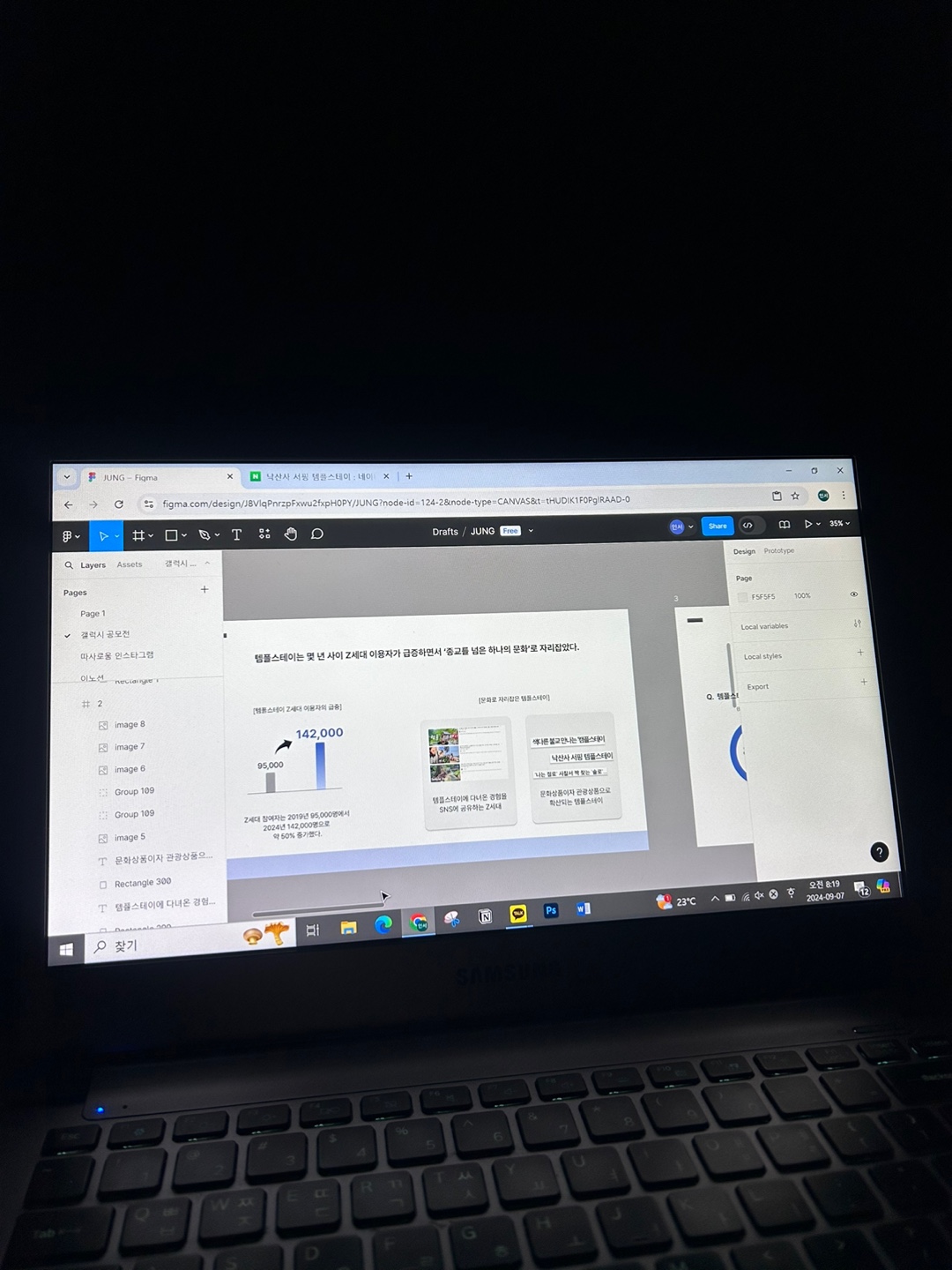 남들보다 수백시간을 더 써야했던 새벽 날들.
남들보다 수백시간을 더 써야했던 새벽 날들.
하지만 부딪히고 깨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결국, 실패는 공모전 수상과 마케팅 인턴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나의 첫 마케팅 공모전 수상
나의 첫 마케팅 공모전 수상
날 알아가는 과정
내가 꿈꾸는 마케팅은 있잖아요..
수많은 공모전에 나갔다. 맥주 판매 마케팅 전략, 웹사이트 활성화 기획, CSR 캠페인 기획..
사실 너무 많아 다 세지도 못 하겠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이 딱 맞는지..
마케팅이 뭔지도 몰라 네이버에 '마케팅'을 검색해보던 내가 점점 기계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주제가 눈길을 끈다.
"사회를 이롭게 만들 수 있는 CSR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세요"
그 어떤 공모전보다 수상 욕심이 불 타올랐다. (물론 수상은 못 했다)
하지만 이때 깨달았다. 나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싶나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단순히 ‘팔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마케팅에 마음이 끌렸다.
00네컷 회사가 호국보훈영웅 분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처럼, 선한 마음이 담긴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맨땅에 헤딩을 할 수록 나의 꿈은 뚜렷해져갔다.
이제야 나를 조금 알겠다.
사회복지학과, 마케팅.
마치 케이크와 매운탕처럼 요상한 조합이다.
그리고 그 요상한 조합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아나갔다.
내가 무얼 좋아하는 지, 어떤 곳에서 가슴이 뛰는 지처럼 말이다.
전공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늘 설명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도 가끔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는다.
전공을 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길이 아니고, 전공과 달라도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걸.
사회복지에서 배운 ‘강점에 집중하는 눈’이, 지금 내 마케팅 일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사람이든 제품이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걸 더 빛나게 하는 건 결국 같은 일이라는 걸.
혹시 지금 당신도 나처럼 전공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이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꼭 쓰일 거니까.
그때는 “왜?”라는 질문이,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멋진 문장이 되어 있을 거다.
 휴학전, 나름 실습도 했다.
휴학전, 나름 실습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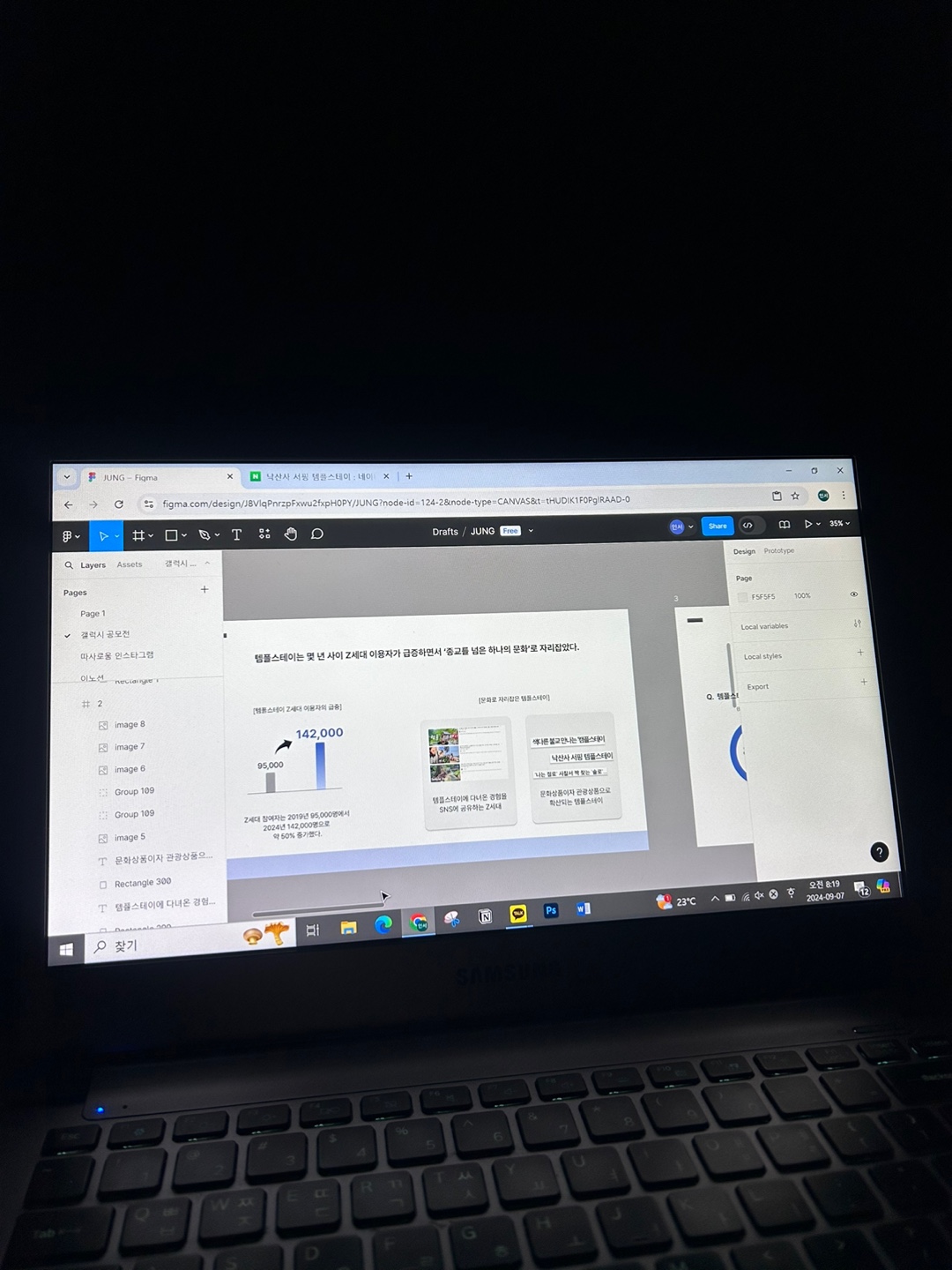 남들보다 수백시간을 더 써야했던 새벽 날들.
남들보다 수백시간을 더 써야했던 새벽 날들. 나의 첫 마케팅 공모전 수상
나의 첫 마케팅 공모전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