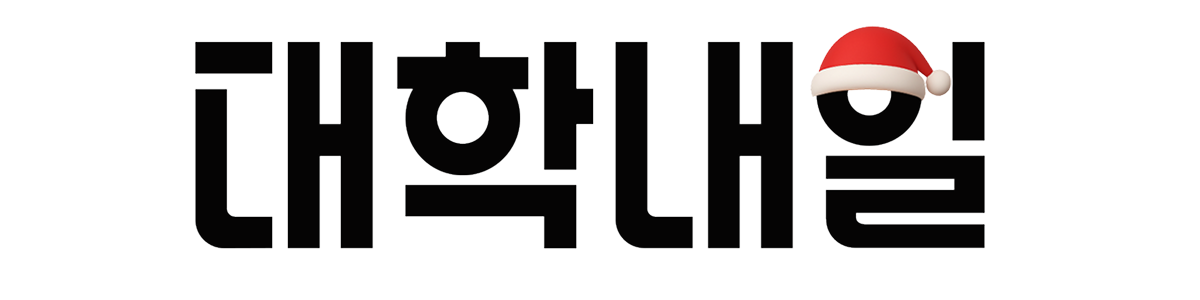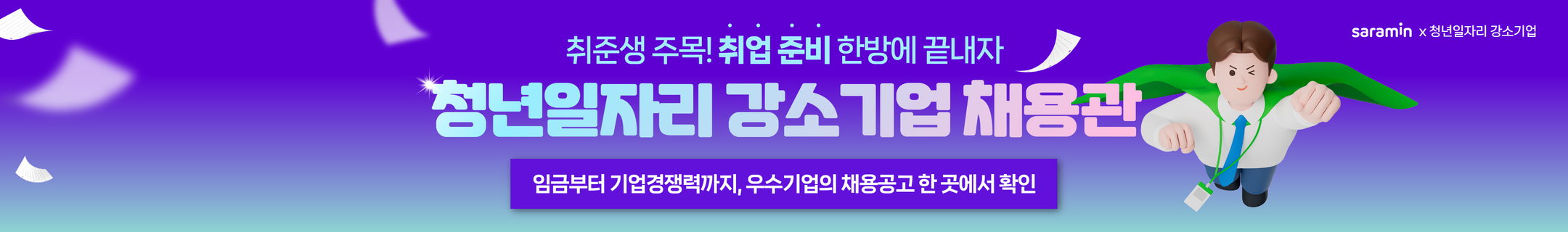레포트 쓰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대학생 글쓰기를 지치게 만드는 ‘형식의 함정’
대학생의 글쓰기는 이상하게도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 부담으로 다가온다. 레포트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참고문헌 작성법을 찾아보고, 인용 규칙을 다시 확인하고, 서식을 손보는 일부터 시작된다. 사고의 방향을 잡기도 전에 “출처 표기가 틀렸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먼저 받는 경험도 흔하다. 문제는 규칙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규칙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고치는 ‘형식 노동’이 사고의 흐름을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APA, MLA, Chicago처럼 교수마다 다른 스타일을 맞추는 일은 학습의 본질과는 무관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여러 창을 띄워놓고 탭을 오갈수록 집중력은 초기화되고, 글쓰기는 ‘생각하기’보다 ‘틀 맞추기’에 가까워진다. 이는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대학생의 학습 과정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비효율이다.
연결되지 않은 도구들 사이에서 흩어지는 집중력
현실의 대학 글쓰기는 맞춤법 검사기, 인용 생성기, PDF 리더, 문서 에디터, 연구 검색 탭을 오가며 조립하듯 완성된다. 기능은 많지만 그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 끊긴다. 탭을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사고가 끊기고,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Cognity는 이 문제를 ‘능력 부족’이나 ‘도구 부족’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학생의 실제 작업 흐름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했다. 생각·분석·주장 같은 핵심 작업과, 형식을 맞추고 규칙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주변 작업을 분리하고, 후자를 기술이 떠안는 구조를 상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서비스가 비개발자 대학생들의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어떤 흐름이 끊기는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Cognity는 그 단절을 메우는 UX를 만들고자 했다.
‘근거 중심 글쓰기’와 흐름을 지키는 자동화
Cognity가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많은 대학생이 매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질문이었다. “이 문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이지?” 우리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건의 학술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 글쓰기 경험을 설계했다. 학생이 문장을 쓰는 순간 모델이 논점과 필요한 근거의 형태를 분석해 적합한 논문과 핵심 내용을 바로 옆에서 제시한다. 별도의 검색 탭을 열지 않아도, 사고의 흐름 안에서 필요한 증거가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구조다. 이 경험은 기존의 인용 생성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동시에 Cognity는 인용·포맷팅 영역을 자동화해 학생의 주의가 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참고한 자료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 4,000개 학술지 포맷 변환도 클릭 한 번이면 되고, 규칙 검증을 위해 문서를 다시 열어 세부를 고치는 과정도 사라진다. 자동화의 목적은 단순히 편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끊기지 않는 글쓰기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형식에서 내용으로—대학생 글쓰기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모든 기능이 하나의 환경에 정리되자 글쓰기는 조각난 브라우징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 된다. 학생들은 더 이상 탭을 넘나들며 집중력을 소모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내용·논리·근거의 질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 이 변화는 편의 수준을 넘어 대학 글쓰기의 본질을 옮겨놓는 일이다. 실제로 대학도 AI 금지에서 활용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며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Cognity 같은 시스템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 형식적 정합성을 따지는 데서 벗어나, 누구나 더 깊은 논증과 더 탄탄한 근거를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는 대학생의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학술 글쓰기를 특정 학생만의 능숙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습 경험으로 확장한다. 결국 Cognity는 글쓰기의 본질—생각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경험—을 되찾기 위한 시도다. 대학생의 글쓰기 주변에 존재하던 오래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학습자에게 다시 사고의 공간을 돌려주는 하나의 재설계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