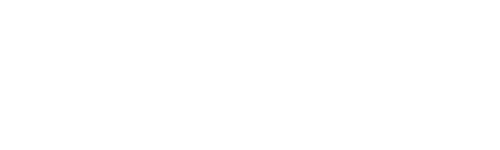무계획으로 프랑스에서 개강한 썰
새학기의 캠퍼스는 늘 활기찹니다.
과잠을 입고 무리지어 걷는 사람들, 묘하게 들뜬 분위기, 낯선 선배들과의 밥약…
그렇지만 야속한 시간 탓인지 어느덧 고학년을 맞이해버린 저에게,
새학기의 캠퍼스가 주는 느낌은 새내기이던 시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해진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분주함과 남들보다 늦어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들 속에 뒤쳐지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익숙하기만 한 일상에 전 자주 권태를 느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학기 저의 개강은 사뭇 달랐습니다. 가본적도 없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덩그러니 저 혼자 새학기를 맞이했거든요!
어떻게 생활할 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었냐고요?
아는 사람은 있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오. 그냥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무계획으로 떠난 프랑스.
과연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교환학생은 일련의 도피,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호기심이 뒤섞인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한가지로 바쁜 일정을 쪼개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교환학생에 합격한 뒤, 복잡한 비자까지 일사천리로 해치웠는데요.
어쩌면 몇몇 친구들은 인턴을 하고, 공모전에 나가 수상을 하고, 착실히 커리어를 쌓는 3학년 2학기.
중요하다면 중요할 시기에 저는 가본적도 없고,
아는 프랑스어라고는 ‘bonjour’, ‘merci’인 상태로 무작정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 무모했다는 말밖엔 설명할 길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살아남기란 당연하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돌아다니면 아는 얼굴들이 보였고,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동기들과 익숙한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엔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이 주던 안정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환경에 온전히 홀로 적응해야 했어요.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메뉴 하나 주문하는 것조차 수십 번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야 했고,
한국에선 금방 끝났을 행정 처리는 프랑스 특유의 느린 행정 속도와 언어 장벽에 막혀 몇 주씩 기다려야만 했어요.
특히 프랑스는 건물 안에서 데이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트 안에서 번역 앱 조차 열리지 않는 바람에 프랑스어 왕초보인 저는 주방세제를 두 번이나 잘못 사는 슬픈 일을 겪기도 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낼지,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조차 정해두지 않은 채 프랑스에 도착했거든요.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말 그대로 무계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완벽한 이방인이 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오히려 주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옭아매던 학번이나 학점, 취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제가 무슨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저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휴식조차 다음 할 일을 위한 '충전'이라는 명목하에 끼워 넣었고, 아무런 결과물 없는 시간은 곧 낙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느린 시간은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밀어두었던 사소한 행동들이 저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2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멍 때리며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스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소한 순간들은 저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는데요.
무언가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도, 나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단이 정해놓은 효율의 잣대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 학기의 교환학생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한국의 3월, 캠퍼스는 여전히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속도전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 것만 같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금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모든 수식어가 사라졌던 낯선 도시에서도 기어이 내 자리를 찾아냈던 기억이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작년 2학기의 이방인이었던 시간이 올해의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혹은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개강은 안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