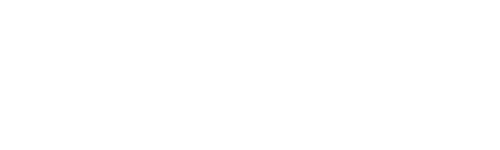새 학기 우리는 왜 멈추기로 했을까
휴학은 언제나 ‘중간’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진다. 재학도 아니고, 졸업도 아니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휴학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인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그냥 쉬고 싶은 건지. 마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선택인 것처럼.
하지만 요즘의 휴학은 조금 다르다. 많은 대학생들이 더 이상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 이 속도로 살아도 괜찮은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어느 순간 너무 커져서, 결국 수업 대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는 것이다.
휴학 중인 친구들은 종종 자신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다들 학점을 채우고, 졸업을 준비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 제자리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학교를 다닐 때는 늘 ‘해야 할 일’이 먼저였다. 과제, 시험, 팀플, 스펙. 휴학을 하면 그 목록이 사라진다. 대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다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된다.
물론 이 시간은 늘 평온하지 않다.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SNS 속에서는 또래들이 인턴이 되고, 합격을 하고, 어딘가로 나아간다. 휴학 중인 우리는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쩌면 휴학은 뒤로 가는 일이 아니라, 옆으로 비켜 서는 일에 가깝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잠시 멈춰서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확실함을 감당해야 하고, 남들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휴학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멈출 수 있는 용기.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자신과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이 다시금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주게 될지는 우리 모두 모른다.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지금 나에게 있다. 그 용기로 살아간다.